선이정2025-06-16 22:39:19
우리는 음표처럼 날아가
영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멜로디 소동> 리뷰
DIRECTOR. 장-클리스토페 로저, 줄리엔 청
CAST. 랑베르 윌슨, 폴린 브뤼너 외
SYNOPSIS.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은 절친, 음악가 곰 ‘어네스트’와 꼬마 생쥐 ‘셀레스틴’! 둘은 ‘어네스트’의 망가진 바이올린을 고치러 그의 고향 ‘샤라비’로 향한다. 오랜만에 찾은 거리에는 음악이 금지되어 침묵만이 흐르고 ‘어네스트’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는데… 사라진 멜로디를 되찾기 위한 ‘곰’과 ‘생쥐’의 특별한 우정이 다시 시작된다!
POINT.
✔️ 벨기에 삽화가 가브리엘 뱅상의 동화책을 원작으로 한 2012년 영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의 후속작이지만, 원작도 영화도 아무 것도 모르고 봐도 즐겁게 이해하기 충분합니다.
✔️ 귀여운 걸 보고 싶은 사람,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을 환기할 수 있는 산뜻한 영화 보고 싶은 사람에게 딱!
✔️...인 동시에, 묵직하고 유의미한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에게도 딱!
✔️ 부드러운 색감의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 학계 정설...
✔️ 그림체만큼이나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기분을 수직 상승 시켜줍니다. 이 글은 OST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썼어요.
✔️ 이 모든 것을 80분이라는 산뜻한 러닝타임 안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영화관을 나설 수밖에 없는 영화!
✔️ 6월 11일 롯데시네마에서 개봉했어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멜로디 소동>은 둥글둥글 부드러운 그림체로 관객을 끌어안으며 시작한다. 음악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장면은, 처음 보는 사이에도 전차 하나에 다 같이 올라타고 같은 방향으로 즐거이 나아가게 만드는 음악의 힘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단죄의 손가락에 괴로워하다 어네스트가 잠에서 깨면, 초입부터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한 영화가 비로소 시작된다.
망가진 바이올린을 고치려면 어네스트의 고향 샤라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면한 셀레스틴과, 그런 셀레스틴을 따라갈 수밖에 없던 어네스트. 두 사람을 담은 부드러운 색감의 그림도, 캐릭터의 관계성도 귀엽기만 한데 보고 있으면 그 귀여운 세계 안에 현실의 묵직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원래 그런 거...는 없지
어네스트로서도 딱히 가고 싶어한 곳은 아니었지만, 샤라비는 어네스트의 기억 속 과거에서 더 착잡한 변화를 겪고 있다. 샤라비에 도착한 두 사람 앞에는 계속해서 "원래 그런 거야, 다른 식은 없어!(C'est comme ça et pas autrement!)"이라는 말이 떨어진다. 이 도시에서 음악은 계이름 '도' 외의 어떤 음정도 연주할 수 없는, 새 소리조차도 물대포를 쏴서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샤라비에서는 "원래 그런" 것들이, "다른 식은 없"는 것들이 가득하다.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기에, 가스라이팅이다.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누군가가 언젠가 정한 거지. 권위주의의 모순은 여기서 발생한다. 원래 그런 것이어야 하는, 이해가 아니라 복종을 요하는 명제들 또한 한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원래 그런 건 없다는 사실. 다시 말해, 지금 그 권위 또한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
샤라비에서조차 그렇다. 한때는 샤라비에서 "원래 그런" 것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음악이 존재했다. '원래 그런' 것이 변하기도 한다. 이혼한 부부의 집이 문자 그대로 갈라서듯이. 처음부터 그랬을 리 없는 것들에 어설프게 권위를 덧씌우기 위해 존재하는 문장 앞에, 셀레스틴은 순수하게 의문을 표하고 어네스트는 분노한다.

금지는 반사판밖에 되지 못한다
그런 세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는 것만으로 저항이 된다고 생각했다. <미생>에 나온 말처럼, 상대가 역류를 일으킬 때 순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역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킬 때 나는 비로소 순류가 되는구나.
다시 말해 금지만큼 정체성을 공고히 해주는 것은 없다. 음악을 금지한다는 건 음악가들의 정체성이 음악임을 그 누구보다 굳건히 인정하는 일이다. 마치 자유 없는 나라에서 자유의 의미가 더욱 선명히 아로새겨지듯이. 민주주의를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는 곳은 독재와 권위주의에 짓눌린 사회이듯이.
음악가들을 가두는 경찰의 열쇠는 높은음자리표 모양이고, 쫓고 쫓기는 경찰과 '음악 레지스탕스'들의 모양은 멀리서 보면 음표가 된다. 음악만이 돋보이고 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권위주의의 '금지'라도, 멀리서 보면 결국 자신이 금지하는 것을 선명히 강조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반사판이 되어 더 밝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뿐이다.

권위주의의 허약함에 대하여
"원래 그런 거야, 다른 식은 없어!"라는 문장의 또 다른 특징, 자기 실현적인 특성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이고 살려면 절대 사유해서는 안된다. 사유하는 순간 다른 방법이 발견되고, 정해지지 않은 길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유하지 않는 이들만이 이 문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때 비로소 이 문장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된다. 그리고 그 굴레에 빠진 순간 이 문장은 갈수록 허약해진다. 검고 커다랗게 사람을 덮쳐 오지만,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되찾기 위해 싸우는 힘은 강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도저히 안되어서, 치열한 사유 끝에 불거져 나오는 힘이니까.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그리고 음악을 구하는 저항 세력은 이미 자신 안에서 휘몰아치는 그림자와 싸워 본 이들이다.
이 영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찾아본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에서 둘은 이미 자기 사회의 아웃사이더로서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경험이 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꿈 속의 괴물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보고 공명할 수 있는, 나아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이가 된다. 이때도 그들은 스스로의 편견이 만든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 사이에서 빠져나와 함께이길 택한다. 이들은 또 한 번 그 자리에 선다.
우리는 음표처럼 날아가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처럼 공통의 언어를 찾아 다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이도 있지만, 미파솔로 대변되는 '레지스탕스'의 얼굴을 하고 순류를 꼿꼿하게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소시민적 날들이 부지기수다. 손끝에 높은음자리표를 들고서도 음악가를 가둘 수 있는 것이 삶이다. 일상을 맨밥처럼 꾸역꾸역 먹고 사는 날들이 너무 손쉽게 우리를 찾아온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런 우리를 음악으로 부드럽게 감싸안는다. 이 영화의 오프닝과 수미상관을 이루는 듯한 엔딩은 모두를 주인공으로 보이게 만든다. 음악으로 어우러진 무리 안에는 차별이 없다. 모두가 다르고, 그래서 모두가 풍성하다.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이나 미파솔이 아니어도 우리는 함께 음악을 즐기며 걸어갈 수 있다. 그거면 되지.
그 날을 위해, 지팡이를 짚고 덜덜 떨리는 다리로 걷는 날이 온대도 지팡이 안에 악기 하나쯤은 감춰 두고 살아야지. 그걸 나는 인생의 기세라고 부른다. 나의 기세와 타인의 기세가, 전혀 다른 악기들이 어우러져 음표처럼 날아가는 꿈을 꾼다.

*온라인 무비 매거진 씨네랩을 통해 시사회에 참석하여 감상 후 작성하였습니다.
- 1
- 200
- 13.1K
- 123
-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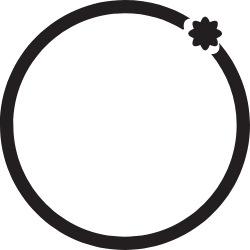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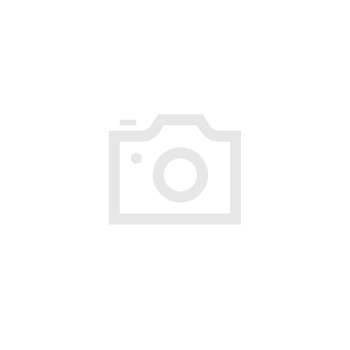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