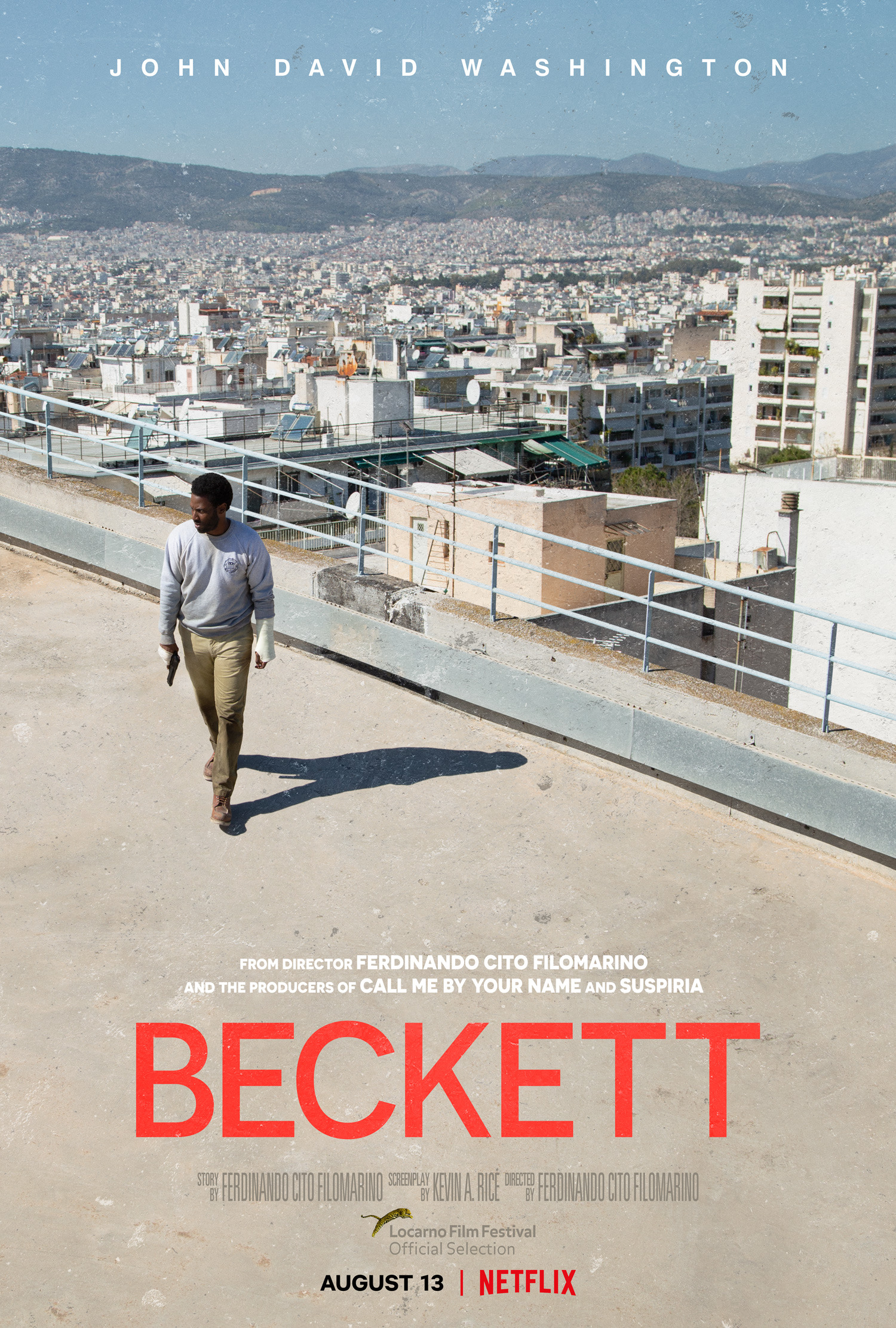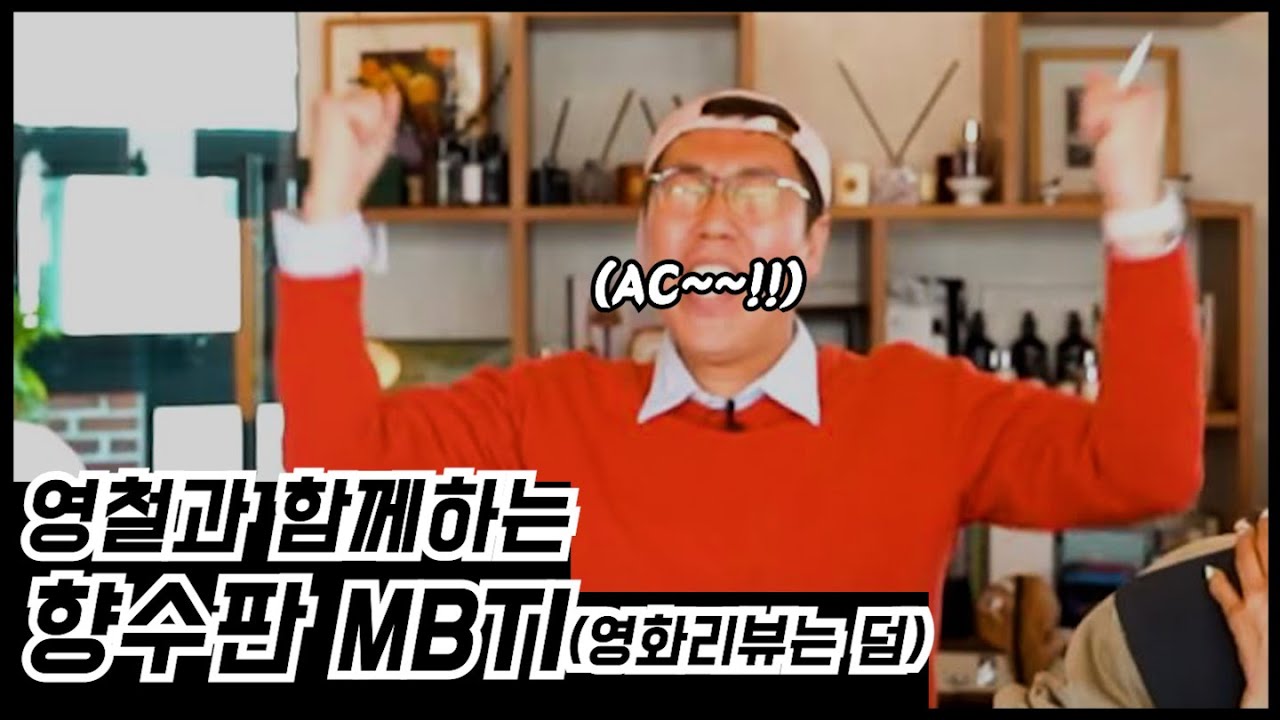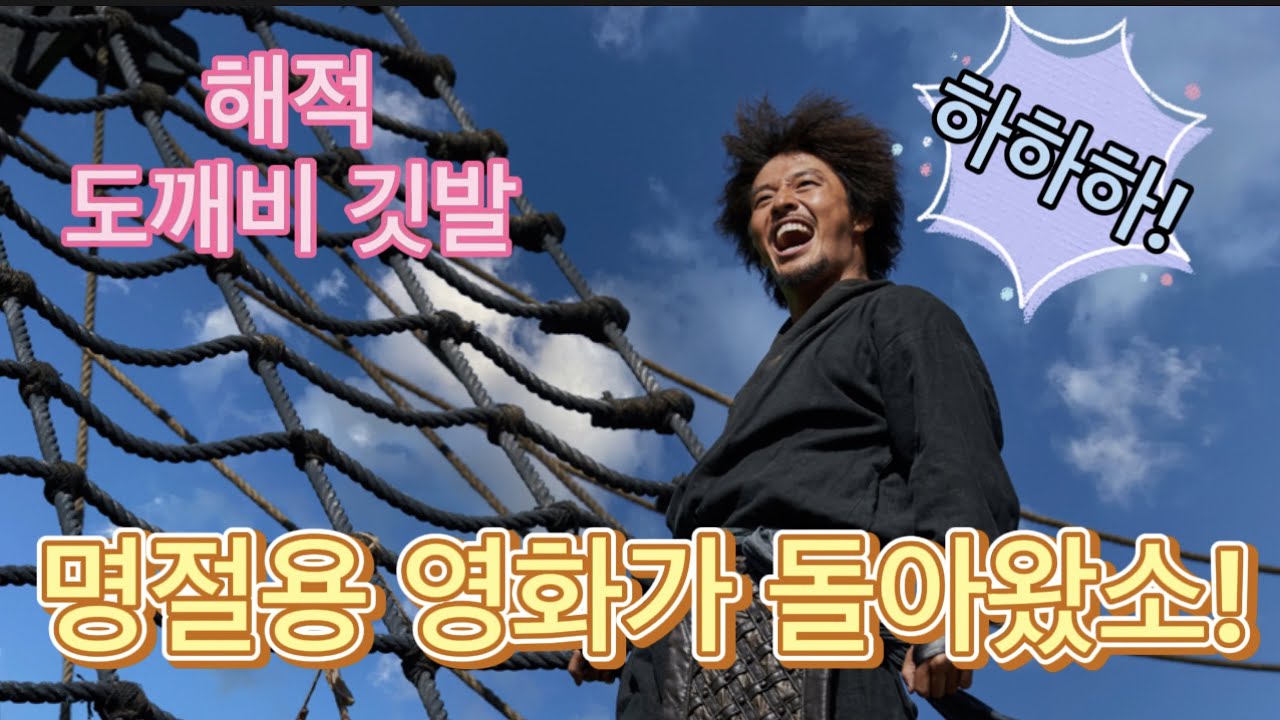영화 리뷰2025-04-30 11:32:26
<사랑에 빠진 것처럼>, 단순한 화면 공유를 넘어 공간과 감각의 공유로
영화 <사랑에 빠진 것처럼>은 출처 없는 목소리를 제시하며 해당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은 채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화면으로 시작한다. 키아로스타미는 공백을 통해 관객이 영화에 개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고 싶었던 것일까? 화면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 중 정작 목소리의 주인공은 없는 듯 하고, 과연 발화자는 누구인지 관객의 궁금증은 증폭된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단발머리 여자가 카메라 앞으로 자리를 옮겨 앉음으로써 비로소 화면은 채워진 듯한 느낌이 들고, 곧이어 화면이 전환되며 드디어 출처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드러난다. 그녀는 아키코라는 대학생으로 콜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어느 날 히로시는 아키코에게 홀로 살고 있는 타카시의 집에 방문하라고 제안하고, 할머니가 올라오시는 날이라며 몇 차례 거절을 반복하던 아키코는 결국 할머니와의 만남을 외면한 채 타카시의 집으로 향한다. 타카시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 아키코는 할머니가 남긴 음성메시지를 듣는다. 그런 아키코를 따라 이어폰으로 타고 들어오는 할머니의 음성메시지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외면했다는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그 다정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감정은 영화가 창조한 아키코와의 동일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V.F. 퍼킨스의 주장에 따르면, 인물과 관객을 동등한 조건에 두는 것은 동일시를 창조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사랑에 빠진 것처럼>에서 아키코는 마지막 음성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 음성메시지를 듣는데 이는 아키코라는 인물을 시각적, 청각적 수행만 가능한 관객과 동등한 조건에 두는 것이며, 이로써 영화 속 인물과 관객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다. 즉, 영화는 인물과 관객을 동등한 처지에 위치시킴으로써 아키코와 관객의 동일시를 창조하고, 관객은 그러한 동일시를 통해 아키코의 감정에 이입하며 영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등장인물과 관객을 동등한 조건에 둠으로써 동일시를 창조하는 예는 히치콕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창>에서 부상으로 인해 휠체어에 가만히 앉아 이웃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제프리와 <마니>에서 화장실 벽에 기대어 바깥소리를 엿듣고 있는 마니가 그 예시다. 앞서 발생한 아키코와 관객의 동일시는 그녀가 탄 택시가 역 근처에 다다랐을 때 관객 또한 아키코와 같이 고개를 쭉 내밀고 창가에 바싹 붙어 할머니가 정말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 장면에서 택시는 역에 안정적으로 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의 도로를 따라 계속 주행하는데, 이때 중간에 정차한 차와 뛰어가는 행인으로 인해 아키코의 시야에서 할머니가 기다리는 동상의 아랫부분이 일시적으로 가려지기도 하며 창밖에 나무들과 차 창틀, 가로등들은 아키코가 할머니에게 근접하는 동안 계속해서 할머니의 모습을 드러내고 감추기를 반복함으로써 영화는 할머니가 그곳에 서 있다는 걸 대놓고 보여주지 않는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영화는 관객이 보고 싶은 것을 한번에 드러내주지 않음으로써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관객이 영화에 참여하게 만들고, 원형의 도로는 할머니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주위를 뱅뱅 맴돌기만 하는 아키코의 심정을 부각한다.

아키코가 타카시의 집에 들어설 때, 그의 집에서는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키코가 도착하자 타카시는 들고 있던 수화기를 내려놓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는데, 이를 통해 관객은 아키코와 함께 수화기 너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며, 초조하고 난처한 타카시의 감정에도 이입하게 된다. 타카시는 걸려온 전화에 응답하기 바빠 아키코를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그녀가 집 안을 활보하는 동안에도 전화를 붙들고 안절부절못한다. 타카시는 애써 통화를 마무리 지으려 해보지만, 발신자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화제로 새거나 본론을 잊기도 하는데, 타카시와 마찬가지로 관객 역시 그러한 상대의 전화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으며 타카시의 초조하고 답답함에 공감하게 된다. 아키코는 타카시가 준비한 음식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려 한다. 타카시는 그녀를 방 밖으로 유도하려 하지만 아키코는 도통 말을 듣지 않고, 카메라도 그녀처럼 고집스럽게 방 안을 떠나지 않는다. 이때 거실에 있는 전화가 울리고, 화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들려오는 소리는 관객이 얼른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가서 전화를 끊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한다. 한편으로 이것은 고집스럽게 방 안을 지키고 있던 카메라를 타카시를 따라 방 밖으로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타카시가 전화를 끊기 위해 방을 나서자 카메라도 그제서야 방 안을 벗어난다. 마찬가지로 잠시 후, 거실로 나온 타카시와 관객을 다시 아키코가 있는 방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역시 방 안에서 울리는 전화벨이다. 화면 밖에서 들려오는 전화벨은 반복적으로 들리는 소리를 중단시키고 싶다는 관객의 욕구를 자극하고, 타카시가 전화선을 뽑아둠으로써 전화벨이 또 울려 잠들어 있는 아키코를 깨울 것 같다는 걱정과 긴장감은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사랑에 빠진 것처럼>은 다양한 시각, 청각 장치를 활용하며 관객이 영화 속 인물과 사건이 실제로 그러하다고 믿고 개입하도록 한다. 어쩌면 <사랑에 빠진 것처럼>은 영화가 가진 그 제목에서부터 관객의 참여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목 끝에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 ‘처럼’ 을 더함으로써 그것의 의미는 어딘가 모호해지고, 관객은 등장인물 중 누가 사랑에 빠진 것인지, 그 인물이 정말 사랑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척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랑에 빠진 것처럼>은 제목을 비롯해 작품 속에서 전화와 음성메시지, 창문과 같은 다양한 시청각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객에게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영화를 “감각하고 참여할 것”을 제시하며 퍼킨스가 ‘순수한 반응’이라고 했던 어떤 것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한다. 관객은 단순히 감상하는 것에서 나아가 영화를 경험하며, 그것과 ‘공간과 감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 1
- 200
- 13.1K
- 123
- 10M
-
2020.10.13. 19:14쿠니

반전포인트와 소소한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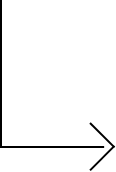 2020.10.13. 19:14쿠니
2020.10.13. 19:14쿠니
11.01 에 본영화 .배우들의 다양한 배역과 입체적인 캐릭터, 90년대 후반의 시대를 엿보는 맛은 쏠쏠하지만,다른 성별이 판단한 여자의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때, 참으로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몇 가지 있는건 어쩔 수 없는 한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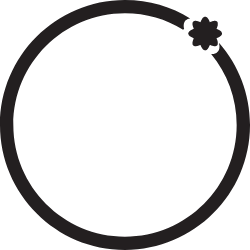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