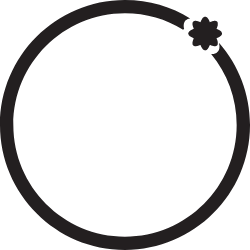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기획기사2025-05-03 12:30:10
[JEONJU IFF 데일리] 개인의 기억에서 사회의 구조로

시놉시스
<증거>는 미국 정치 및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검은돈의 영향, 그리고 기업 투자에 대한 분석이면서 동시에 가족과 돌봄이라는 개념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이다.
영화 정보
감독: 리 앤 슈미트 (Lee Anne SCHMITT)
제작국가: 미국
제작연도: 2025년
상영시간: 76분
장르: 다큐멘터리
상영 형식: DCP, 컬러/흑백
상영 섹션: 영화보다 낯선
아시아 프리미어
리뷰
이 다큐멘터리는 감독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된다. 감독은 자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며 영화의 첫 페이지를 펼친다. 무역회사에 다녔던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다양한 인종의 인형들을 선물해주었고, 그녀는 그 인형들을 통해 세계를 처음 마주했다. 평범한 듯 보이는 이 회상은 곧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에 놓인 미국의 거대기업, ‘올린’이라는 실체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감독의 아버지가 일했던 무역회사의 주요 거래처는 바로 올린이었다. 세계 곳곳으로 제품을 수출하며 부를 축적한 이 기업은, 화려한 외관과 달리 내면에는 수많은 폐해를 숨기고 있었다. 올린은 수많은 공장을 개발도상국과 미국 내 저소득 지역에 설립했는데, 이들 중 다섯 곳 중 세 곳이 흑인과 히스페닉 인구가 밀집해 사는 지역이었다.
공장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즉 인구 분포다. 왜냐하면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그 피해가 누구에게 닿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철저한 계급과 인종적 계산이 깔린 결과다. 올린은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오염된 곳에 모여 산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오염된 곳으로 가난한 이들을 몰아넣는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결국 그 지역의 사람들, 주로 흑인과 히스페닉계 주민들은 오염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건강을 잃고, 부를 축적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이 구조 속에서 가난은 세습된다. 올린은 한편으로 대학 재단과 연구소에 거액을 기부하면서 ‘보수주의의 새싹’을 키워낸다. 이 기부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확산시키고, 인종차별과 성차별, 동성애 혐오 등 극단적인 가치관을 세력화하는 데 사용된다.
이들이 펴내는 책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은 순결해야 한다’, ‘남성은 동성애를 기피해야 한다’, ‘복지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은 신성하다’. 이러한 주장들은 단지 의견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교육, 법제도의 재구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논리로 발전된다.
보수집단은 복지제도를 공격한다. 왜냐하면 복지제도가 확대될수록,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는 곧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고, 이는 강자들의 체계를 위협한다. 따라서 그들은 가족, 사유재산, 전통적 가치의 신성화를 통해 이 시스템을 방어하고자 한다.
‘가족’은 이 서사의 또 다른 축이다. 감독은 가족이 신격화되는 구조를 비판한다. 부의 세습을 위해 가족이 필요하고, 자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은 혼자 살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에 보수집단은 불안을 느끼며, 가족이라는 형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려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폭력, 성폭력은 가족 내부, 혹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성역으로 간주되고, 문제를 숨긴다.
이 다큐멘터리는 ‘나의 가족’에서 출발하여, 미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자본의 논리를 하나하나 따라간다. 그리고 이는 결국 다시 ‘나의 가족’으로 되돌아온다. 이 순환의 구조는 단지 개인의 회고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의 재생산을 목격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다큐 속 내레이션은 차분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대신 각 장면마다 문헌과 기록, 논문과 기사, 인터뷰와 영상 자료 등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시청자의 사고를 이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 작품이 상영될 수 있었던 의미는 크다. 그것은 이 영화가 단지 미국 사회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한국 사회에도 깊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가족이 부의 재생산 단위로 기능하고 있다. ‘비혼’과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는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중심의 제도와 문화는 견고하다. 동시에 복지에 대한 혐오,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성소수자 혐오 역시 한국 사회에서 점점 목소리를 얻고 있다. 미국의 문제는 한국의 문제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다큐는 말한다. “나는 다양한 인종의 인형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인형들은 귀엽고, 색이 다르고, 머리 모양이 달랐다. 나는 그것이 세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인형들의 고향은, 올린이 만든 공장이 있는 곳이었다.”
이 말은 이 작품의 본질을 드러낸다. 세계는 연결되어 있으며, 한 개인의 과거는 자본과 권력, 구조와 역사 속에 깊이 묻혀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를 낱낱이 파헤치며, ‘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 작품은 단지 고발의 다큐가 아니다. 그것은 연결의 다큐이며, 성장의 다큐이고, 기억의 다큐이며, 결국에는 질문의 다큐다. 감독은 가족을 통해 세계를 보고, 세계를 통해 가족을 다시 본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다큐가 존재하는 이유다.
상영 일정
2025년 5월 2일 10:00
메가박스 전주객사 5관
2025년 5월 5일 10:30
메가박스 전주객사 4관
2025년 5월 9일 10:00
CGV 전주고사 8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 2025.04.30 ~ 05.09
작성자 . null
- 1
- 200
- 13.1K
- 123
- 10M
-
2020.10.13. 19:14쿠니

반전포인트와 소소한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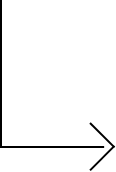 2020.10.13. 19:14쿠니
2020.10.13. 19:14쿠니
11.01 에 본영화 .배우들의 다양한 배역과 입체적인 캐릭터, 90년대 후반의 시대를 엿보는 맛은 쏠쏠하지만,다른 성별이 판단한 여자의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때, 참으로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몇 가지 있는건 어쩔 수 없는 한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