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8 16:50:05
이토록 끔찍한 연애
이토록 끔찍한 연애
넷플릭스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정서가 불안정한 여자의 연애를 소재로 한 로맨틱 코메디다. 하지만 다른 많은 할리퀸 로맨스처럼 상처가 많고 정서불안인 여주인공이 진정한 사랑을 만나 행복해 지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주인공이자 ‘미친 전여친’ 장본인인 레베카는 다른 로맨틱 코메디의 여주인공들처럼 사랑스럽거나 공감이 가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 드라마를 보다가 '레베카가 내 친구면?'이란 질문을 받는다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것이다.
이 시리즈의 핵심은 레베카가 정말 문자 그대로 미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첫 사랑을 우연히 만나 그것이 운명이라 믿고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버리고, 자신이 짝사랑하는 남자의 여자친구와 친해지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갖은 노력을 다 한다.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들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에도 평화롭고 일상적인 연애는 불가능 하다. 자기파괴적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미 혼자 머릿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백년해로까지 한 상태다.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행동할 순 없는거냐는 의문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함께 떠오른다. '정상이 뭔데?'
인간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사실은 어느 정도 미쳐 있다. 거기다 좋든 싫든 서로 섞여 살면서 매일 남의 못 볼꼴을 봐야 인간 사회에 나오면 다들 증세가 더 심해 진다. 매일 남들의 미친 짓을 코앞에서 강제로 구경해야 하고, 나도 남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은연 중 매일이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일상의 연속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연애 관계는, 이미 각자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이 1:1로 만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관계다. 자연히 더럽고 치사한 꼴을 다른 관계보다 몇 배로 더 많이 볼 수 밖에 없다. 더 인간적이고 솔직해야 유지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사람들은 모두 좀 더 미친 사람이 된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인간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들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부 미쳤다고 해서 우리가 맺는 관계가 다 가짜인 건 아니란 점이다.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상처를 주고 받는지,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각자의 상처는 이미 받은 것이고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인간들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의 생채기를 멈추겠다고 모든 문을 닫고 그 어떤 인간과도 교류하지 않을 순 없다. 그것은 또다른 방식의 미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일 뿐이다.
인간은 애석하게도 사회적 동물이라 어떤 형식으로든 타인과 상호 작용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누군가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각자 결정해야만 한다.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인간에게 관계란 생존의 문제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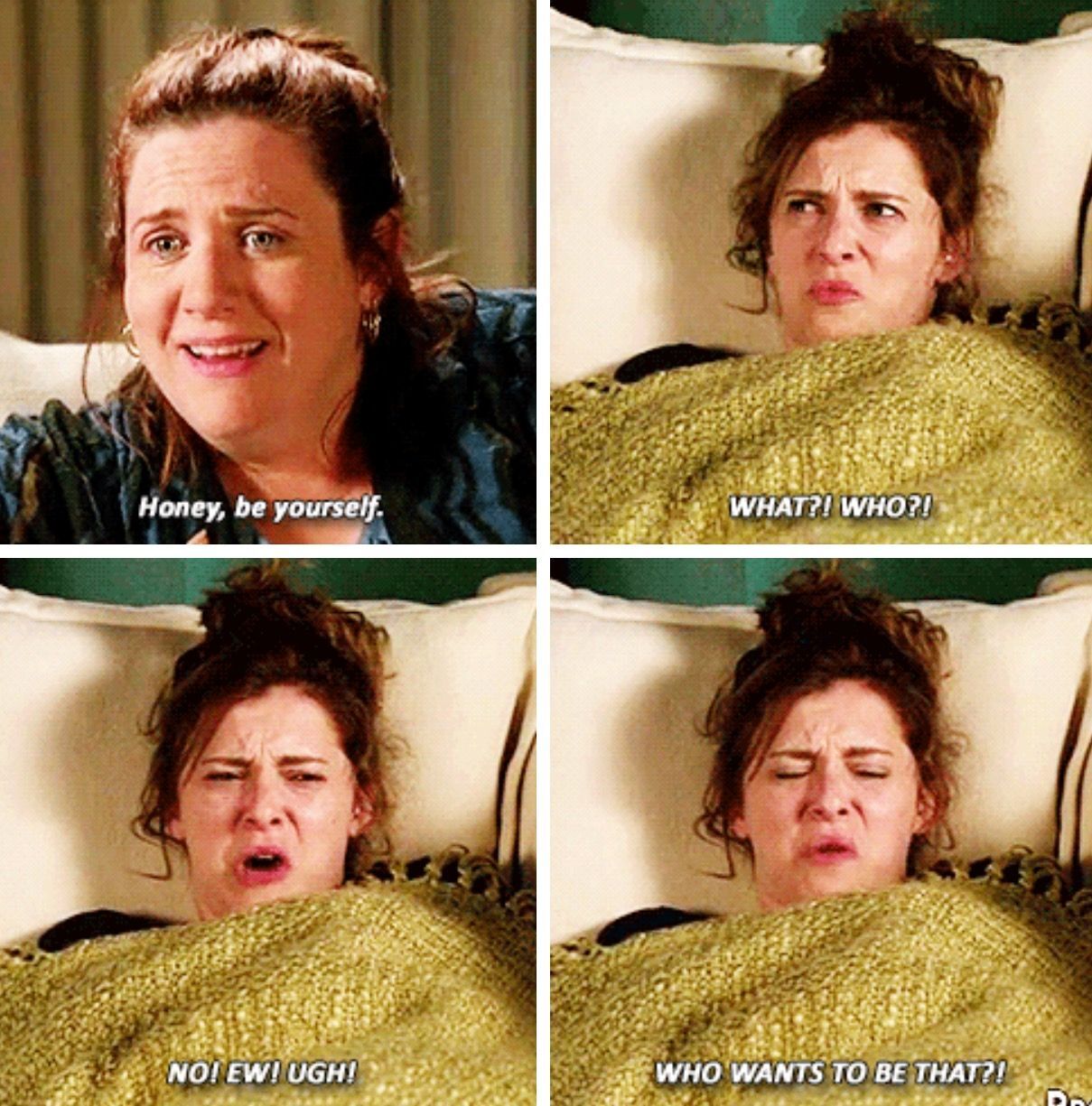
이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레베카에게 진절머리가 나게 되는 이유는, 그녀가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모습을 스크린 속에서 여과없이 재연하는 캐릭터기 때문이다. 평소에 내가 정상적인 척, 감정 기복이 없는 척, 이성적인 것처럼 간신히 연기하며 살아 가다가 내가 애써 감춰 놓은 그 모습을 누군가 격렬하게 표출하는 걸 지켜보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레베카를 욕하고 그녀를 향해 탄식하면서도 계속 그녀를 지켜 보게 되는 건 그녀의 대처와 반응이 궁금해서다. 우리도 그렇게 애정을 구걸하고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자기중심적 태도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주). 레베카도 딱히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례 연구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 본 콘텐츠는 브런치 Good night and 님의 자료를 받아 씨네랩 팀이 업로드 한 글입니다.
원 게시글은 아래 출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랩에 저장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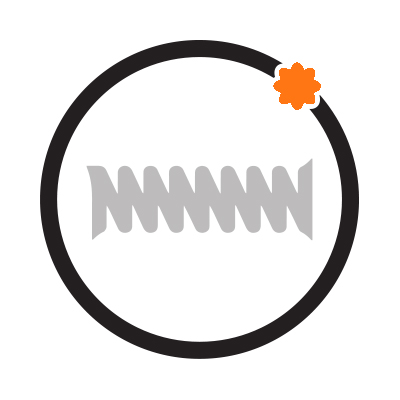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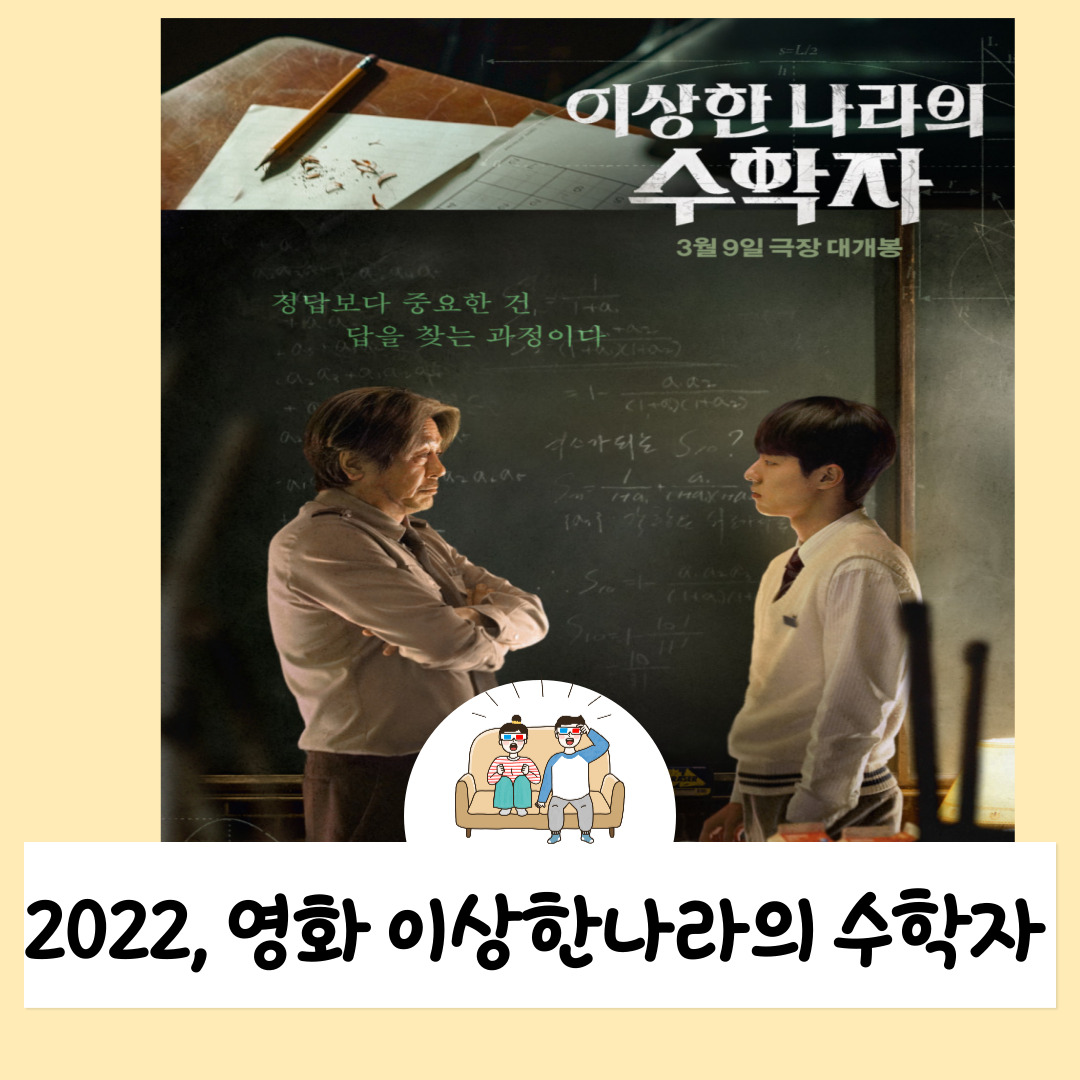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