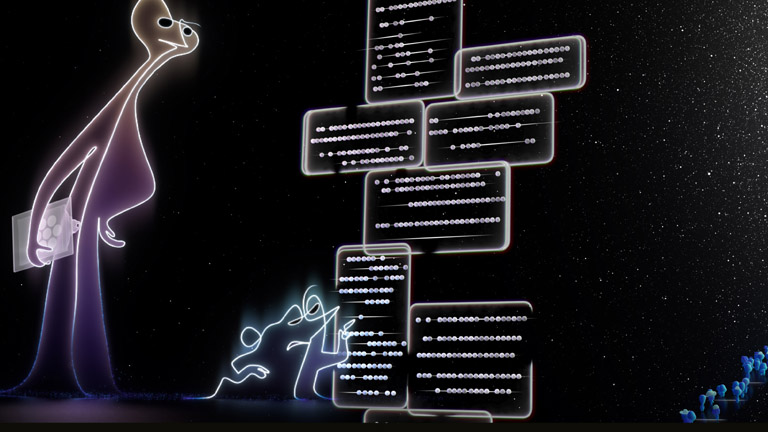김로진2021-11-05 16:04:17
4K로 담아낸 거대한 무의미
<행복의 속도> 리뷰
다큐멘터리에 스포일러랄 게 있겠으나, 그래도 스포일러를 포함한다고 미리 명시합니다.
*
행복이라는 말은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라 함은 현실이 아닌 것일진대, 현실은 참으로 지난하고 지리멸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현실적인' 고민들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현실적으로 먹고 살 만한지, 현실적으로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은 누구인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게 옳은지. 나아가 '현실적인 조언 구합니다'라는 게시판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현실적인'이라는 말이 앞에 붙는다는 것은, 극대의 행복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만고만한, 내 능력 한에서 최대로 가능한 정도를 말하는 게 대부분이다. 턱걸이 같다. 턱걸이를 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고군분투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의미는 턱걸이를 할 철봉 위에 있다. 그것을 넘어야만 의미를 갖는다.
요즘은 주식에, 부동산에, 코인에, 그러니까 돈이 곧 의미다. 자산을 증식하지 못하는 일은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므로 행하지 않는다. 자기계발이라는 아름다운 착취 속에서 삶의 의미를 부지런히 찾아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무의미한 건 무엇인가. 모이지 않는 월급, 오르지 않는 노동가치, 그러므로 살 수 없는 부동산, 애프터 없는 소개팅에서 지불한 돈, 건설적이지 않은 잡담, 뭐 그런 것들일까.

의미와 기호로 가득한 세상 너머, 해발 1,500미터 고지에 '오제'라는 습지가 있다. 그 습지는 인간으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지 않고, 인간 역시 그 무엇도 앗아가지 않는다. 박혁지 감독은 <행복의 속도>라는 제목으로 카메라에 풍경을 담았다. 아니, 그 속에 살고있는 사람을 담았다는 게 더 정확하겠다.
카메라가 집요하게 쫓는 대상은 대략 80kg의 짐을 지게에 싣고 걸어서 산장까지 가는 '봇카' 이가라시, 이시타카이다. 박혁지 감독은 광활한 습지를 4K의 해상도로 보여주고, 봇카들의 걸음을 뒤쫓는다.

나는 자본주의와 얼마간의 거리를 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영화 초반 그들이 80kg를 지고 산을 오르고 걷는 걸 보면서 '모노레일을 깔면 안 되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우리나라는 산 곳곳에 모노레일이 깔려 있어 필요한 짐이며 도구들을 실어 올린다. 모노레일을 깔면 무거운 짐들을 금방 보낼 텐데. 게다가 '몸빵을 하면 돈은 많이 벌겠지?' 라는 생각까지.
그러다 후반부에 가서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자본주의적이며 포드주의 비슷한지를 생각했다. 히말라야도 아닌 산을 걸어서 짐을 옮기는 행위를 경제적이지 않다, 즉 무의미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노동의 가치를 그만 자본과 연결시키며,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나도 역시 이 체제 속의 인간일 뿐이었다.

영화는 이가라시와 이시타카의 차별점을 조명한다. 둘 다 봇카이지만 둘은 꽤 다르다. 우선 이시타카는 '일본청년봇카대' 회장으로서 봇카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활동가이다. 겨울이 되어 오제의 산장도 문을 닫고, 봇카도 할일이 없어졌을 때 도시로 나가 봇카를 홍보한다.

이시타카가 걷는 도시의 거리는 오제의 속도와는 정반대다. 다급하게 점멸하는 신호등, 그에 맞추어 발걸음을 재촉하는 행인들, 다급한 발걸음 사이에 이시타카가 서 있다. 사람들은 봇카 일에서 어떤 보람을 얻는지 묻는다. 이시타카는 말한다. 산장이 있음으로써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산장이 있음이 좋다고.
행위에 보람이든, 의미든,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걸까?
반면 이가라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도 모자라 목에 카메라까지 걸고 걷는다. 오제의 풍경을 카메라에 섬세하게 담는다. 두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는, 여름방학을 맞아 큰아들을 데리고 짐을 가져다 주던 산장에 가기도 한다. 잠자리를 잡고, 뛰어놀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이가라시의 아내는 농장에서 일한다.
때는 설이다.
이시타카와 이가라시 가족 모두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시타카의 부모는 몸으로 하는 일인데 몸이 상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때 되면 어떻게 먹고 살건지를 묻는다. 물론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지만 이시타카의 표정은 어둡다.
이가라시는 노모에게 봇카를 하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 노모는 마치 아이처럼 그 풍경을 반긴다. 이제 가기 힘들어진 그곳, 그 나무, 그 꽃들. 계절과 햇빛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한다.

힘들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가라시는 대답한다. 누가 기다리고 있고, 시간이 정해져있다면 힘들었겠지만 자기 속도로 걷다 보면 도착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고.
생각해 보면, 등산을 할 때 나 혼자 느릿느릿 걸어가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다. 그런데 여럿이 갔을 때 무리의 제일 끝에 산을 올라가면 그보다 힘들 수가 없다. 그때부터는 산의 풍경이고 뭐고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다. 우리는 왜 힘든가.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남들보다 빨리 걷기 위하여, 남들보다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바삐 움직여야만 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인들이 등에 지고 있는 짐과 봇카의 짐 중 무엇이 더 무겁다고 말하기 쉽지 않을 거다.
카메라는 봇카들의 가쁜 숨, 무거운 발걸음을 집요하게 담다가, 그들의 가정으로 이동했다가, 또 오제의 광활한 자연을 비추기도 한다. 새로운 풍경이 아니다. MSG를 치지 않은, 그래서 맹맹하고 심심한 그들의 일상이다.

초반부에는 영화가 지루하다고 생각했고, 계속 이렇게 걷기만 할 것인가 생각했다. 기승전결도 없고 문제도 없으며, 변화라고는 오제에 찾아오는 계절 뿐인데. 114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나.
봇카들이 걸음을 거듭하고, 나는 봇카들의 걸음을 눈으로 좇으면서 나는 어디로 걸어가고 있고,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 의미는 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왜 내 눈에 아름다운 오제에 모노레일을 깔지 않는 저들이 이상했는가.
저들의 행위가 무의미하고 현실적이지 않게 보인 거지. 저렇게 힘든 일을 할 거면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좋지 않을까, 같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생각.
그래서 행복의 속도는 무엇일까.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다. 속도는 방향을 포함한 벡터값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복의 속도란 행복의 속력과 방향을 내포한 제목일 것이다.
느림이 마냥 행복할 수는 없다. 속력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가는지가 더 중요하겠다. 사물에서, 사람에게 덕지덕지 붙은 의미와 상징과 기호들을 걷어내야만 비로소 그것 자체가 보인다.
봇카들은 오제에 거대한 의미를 두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일에서도 역시 내일은 더 빨리 가야지, 내일은 더 무거운 짐을 들어야지 하고 포부를 갖지도 않는다. 그저 하루하루 자기 속도로 걸어갈 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어쩌면 너무 뻔하게도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이 떠올랐다.
우리들이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어쩌면 지난하고 외로울 길을 각자의 속도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 씨네랩으로부터 초청받아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 1
- 200
- 13.1K
- 123
- 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