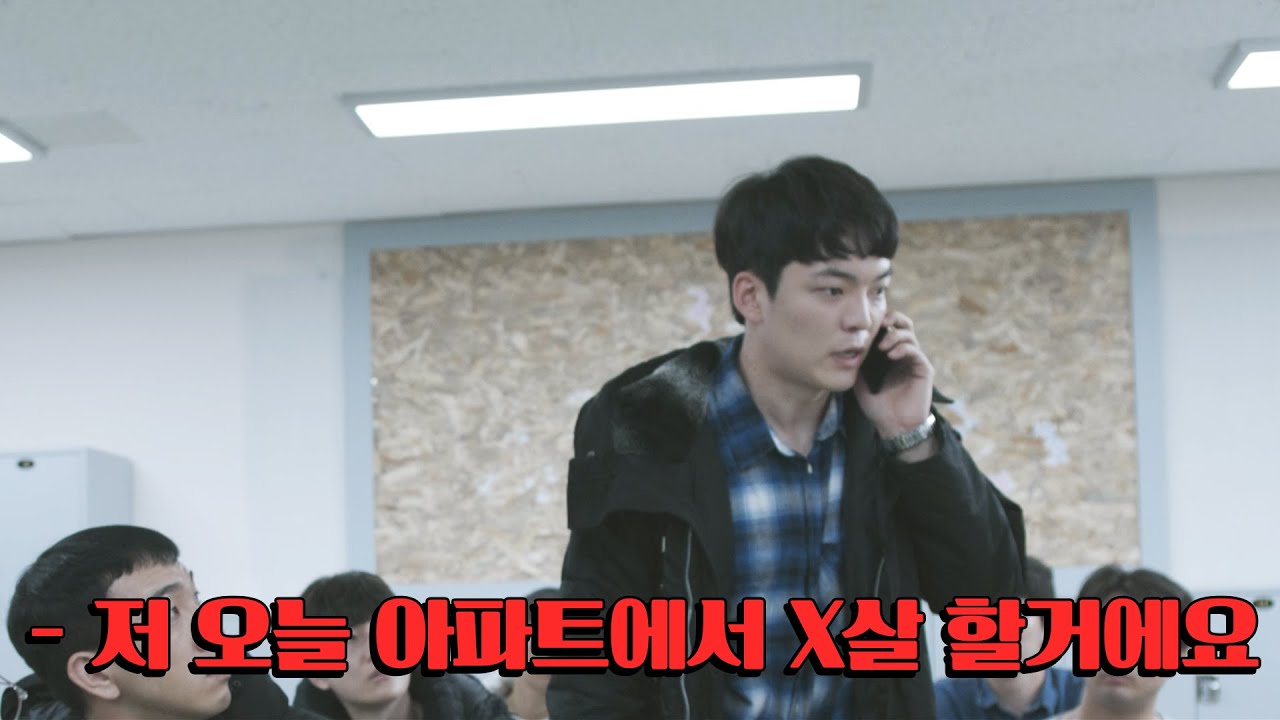rewr2024-05-12 18:41:22
하필 한 여자를 사랑하다니, 그것도 이토록 격렬하게!
영화 〈챌린저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친밀성‧사랑의 미묘한 감정을 포착해 극적으로 만드는 데 가장 탁월한 재능을 가진 감독 중 하나다. 상류층 중년 여인의 마음에 불어닥친 고요한 폭풍을 펼쳐내는 〈아이 엠 러브〉(2011),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싶은 〈콜 미 바이 유어 네임〉(2018), 사회가 금지하는 사랑을 ‘식인’에 빗댄 충격적이고도 강렬한 러브 스토리 〈본즈 앤 올〉(2022) 등등. 그가 야심 차게 도전한 공포영화 〈서스페리아〉(2019)가 영 호불호가 갈렸다는 점을 복기해보면, 아무래도 감독의 재능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정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극대화되는 듯하다. 〈챌린저스〉는 이를 또다시 입증한다. 〈챌린저스〉를 본 관객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감독님, 제발 앞으로는 다른 데 한눈팔지 말고 이런 영화만 만들어주세요!”
여기 테니스 선수 아트가 있다. 아트는 ‘위대한 선수’는 아니지만 ‘훌륭한 선수’ 축에는 든다. US 오픈 우승을 노리고 있고, 의류 브랜드에서 테니스복을 협찬받으며, 자동차 광고를 찍을 정도의 선수 말이다. 아트는 US 오픈 도전 직전, 최근 좋지 않은 성적으로 하락한 자존감 회복을 위해 하부 리그에 참석한 상태다. 만약 이 대회에서 우승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다면 US 오픈 우승이라는 목표에 더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데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한 대회에서 뜻밖의 상대를 만난다. 패트릭이다. 모텔비를 결제할 돈도 없어 폐차 직전의 허름한 차에서 쪽잠 잔 후 대회에 참가한 그는 US 오픈은 고사하고 선수 랭킹도 처참한 별 볼 일 없는 선수다.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반전의 기회도 거의 없다. 그런데 경기가 묘하게 흐른다. 아트는 내내 예민한 채 긴장한 표정인데 되레 패트릭은 여유롭다. 심지어는 아트를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 이 둘에게는 테니스에 한정되지 않는 오랜 인연이 있다. 어쩌면 아련한 우정이고 어쩌면 지독한 악연이다. 둘은 필생의 라이벌이다. 테니스에서도, 사랑에서도.
태초에 타시가 있었다. 유망한 테니스 선수이자 퀸카인 타시는 청소년 시절 같은 대회에 참석한 아트와 패트릭을 단번에 매혹한다. 타시 앞에서 아트와 패트릭은 퀸카와 뭐라도 해보고 싶은 얼빠진 십 대 소년일 뿐이다. 문제는 타시가 폴리아모리가 아니라면, 두 사람 중 한 명은 쓴웃음을 삼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얼빠진 두 소년과 달리 타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정반대다. 훗날 부상으로 프로 데뷔 직전 선수 생활을 끝내고 코치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전까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실력과 멘탈을 갖춰 아트와 패트릭이 넘보지도 못할 레벨의 테니스 유망주였다. 테니스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타시는 침을 꼴깍 삼키며 자신들 중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묻는 애타는 두 남자에게 답한다. 내일 시합에서 이기는 남자를 고르겠다고. 테니스 랠리가 사랑의 랠리로 확장된다. 스포츠가 사랑이 되고, 사랑이 스포츠가 된다.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게임의 시작이었다.
그 후 10여 년간 많은 일이 있었다. 아트는 타시의 남편이자 그녀가 코칭하는 선수가 되었다. 타시는 패트릭에 비해 잠재력과 실력 모두 떨어지던 아트를 ‘훌륭한 선수’로 키워냈다. 10여 년 전의 시합에서 패트릭이 승리했다는 점을 덧붙여야겠다. 그렇다. 과거의 타시는 연인으로 패트릭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지금 아트가 타시의 남편이고, 그저 ‘구남친’일 뿐인 패트릭이 타시에게 능글맞게 굴며 아트를 조롱할 수 있는 이유는? 영화를 직접 봐야만 한다. 구구절절 줄거리 설명으로 10년간 불꽃 튀었던 세 사람의 관계 역동을 요약하기는 불가능할 테니까.
영화는 연애에서의 친밀성과 남성성 문제, 여성의 주체성을 넘나들며 아찔한 랠리를 이어간다. 그것도 격렬한 시합에서 통통 튀며 코트를 오가는 테니스공의 속도로. 현재 펼쳐지는 시합과 십수 년간 세 사람이 겪어온 과거를 교차하며 펼쳐내는 숨 막히는 랠리는 도파민을 폭발시킨다. 테니스, 사랑의 승자가 누구일지를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두 남자는 타시가 벌여놓은 사랑/테니스의 판 안에서 질투심과 열등감을 동력 삼아 움직이지만 종종 판을 뒤집어 게임의 주인이 되고, 한 여자는 능숙하게 두 남자를 주무르며 사랑/테니스에서 목표한 바를 이루지만 예측을 불허하는 욕망의 방향성에 종종 무릎 꿇는다.
이 최종 승부에서 아트와 패트릭은 이제 타시와 테니스를 두고 벌이는 싸움의 결판을 내야만 한다. 지금까지는 줄곧 타시가 이들 관계를 주도해왔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두 남자는 지금껏 타시의 장기말이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생애 단 한 번 ‘남자’가 되어 타시에게 스스로를 증명해내야만 한다. 겉보기에는 번드르르하지만 속으로는 늘 타시가 떠날까 전전긍긍하는 아트와 유망주 시절 이후 모든 면에서 실패의 연속인 삶이었지만 성장하지 못한 채 소년 상태에 머무른다는 바로 그 이유로 종종 매력을 뿜어내는 패트릭. 누가 진짜 타시에게 어울리는 남자이고, 코칭받을 만한 테니스 선수인지 이 한 게임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
테니스 게임의 박진감을 돋보이게 하는 독특한 카메라 앵글과 아드레날린 솟구치게 하는 음악, 질척거리는 치정의 감정이 이렇게 다이내믹했던가 탄복하게 만드는 연출이 삼박자를 이루는 이 영화는 두고두고 반복해서 보고 싶을 만큼의 재미와 매력을 갖췄다. 어디 그뿐인가. 그의 수작을 볼 때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감정의 역학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푹 빠지곤 했다. 이번에도 그랬다. 그래서 나는 〈챌린저스〉를 계기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재능을 추앙하기로 했다. 그는 이전부터 뛰어난 감독이었지만 보통 자기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주제에 진지하고 느린 속도로 접근했다.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나는 그가 〈챌린저스〉에서 지금껏 다뤄온 주제를 스포츠 영화의 박진감을 더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데에도 의심의 여지 없이 성공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자기 주제를 눈에 띄는 새로운 스타일로 그려내는 일, 결코 쉽지 않다. 그의 재능을 추앙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감독이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심지어 〈서스페리아〉 같은 ‘외도’도 눈감아줄 수 있을 것만 같다.
- 1
- 200
- 13.1K
- 123
- 10M


























.jpg)
.jpg)

















.jpg)
.jpg)


.jpg)
.jp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