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2025-08-27 13:13:35
믿음에 가려진 어떤 것들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 시사회 리뷰
* 씨네랩으로부터 초청받아 참석한 시사회 관람 후기입니다.

조희영 | 2024 | Fiction | Color | DCP | 146min (E)
SYNOPSIS
자신을 둘러싼 이들을 뒤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춰 버린 정호와 그의 주변에서 각기 다른 인연으로 얽히게 되는 수진과 인주, 유정, 세 명의 여자가 있다. 정호의 애인 수진은 정호 모르게 훈성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정호를 몰래 짝사랑하고 있는 인주는 시한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정호에게 품은 마음을 고백하기로 한다. 유정은 옛 애인 정호의 자살 시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지금의 애인인 우석과의 관계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채로 위태롭기만 하다. (시놉시스 출처: 서울독립영화제)
1. 우리가 보는 것과 본다고 믿는 것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본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본다고 믿는다. 우리를 지나치는 수많은 풍경들과 사람들, 경험들은 때때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삶 자체를 규정하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과연 절대적인가? 우리의 눈에는 저마다의 프리즘이 있고, 우리가 관찰한 모든 것은 그러한 프리즘에 투영된 결과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동일한 경험과 기억으로 남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 기인할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독창적인 세계를 설계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 사실과 현실을 왜곡하는 눈가리개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결코 본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할 수 없다.
영화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는 이러한 보이는 것과 믿는 것의 사이를 파고 들고, 믿음 너머에 가려진 무언가를 추적하게 한다. 선형적인 시간을 깨트리고, 파편화한다. 과거의 어느 부분을 들추었다가, 또 그보다 한참 뒤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뒤죽박죽 뒤섞인 퍼즐처럼 어지럽다는 인상마저 든다. 영화가 진행되면 될 수록, 과거와 현재는 무너져 내린다. '이게 대체 뭔 내용이지?'하는 마음으로 정신 없이 주인공들의 파편화된 기억들을 하나둘 주워 담다보면 어느 순간, 내가 놓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보인다고 믿는' 무언가들을 나는 보았다고 믿는다.
2. 믿음에 가리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내가 이 영화에서 발견한 것은 자신이 '본다고 믿는 것'에 대한 어떤 견고한 믿음들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믿음이 견고할수록 관심 바깥에 있는 것들은 쉽게 가리워진다. 수진은 바람 상대인 훈성이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특별한 상대라고 믿는다. 인주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묘한 기대를 품고, 유정은 옛 연인인 정호가 자살 시도한 것이 자신의 영향이라 믿고 지난한 부채감에 시달린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쉽사리 배반 당한다. 낭만의 이면엔 값싼 유희가 도사리고, 끝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끝이 아니었으며, 그토록 확고하리라 믿었던 정호에 대한 추억은 흐릿하기만 하다. 하나의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 입으로 말미암아 저마다의 방식으로 왜곡되거나 변형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모르던 것도 안다고 생각하게 되거나, 이미 알던 것도 모르게 되기도 한다. 믿음은 이토록 얄팍하다. 그리고 이 얄팍한 믿음들 사이에는 어떤 공허가 있다. 사람이 믿는 바에 차마 담기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본질들이.

영화 전반에 나오는 검은 개는 이러한 믿음 너머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비유 같았다. 누군가는 그 개를 보고, 누군가는 보지 못한다. 누군가는 그 개의 삶에 대해 생각한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개는 위협적인 불청객이다. 사람들은 쉽게 검은 개의 이야기를 입에 담지만, 누구도 그 개를 정말로 알지는 못한다. 수진, 인주, 유정을 하나로 묶는 정호라는 인물 역시 그렇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숱하게 보고 듣지만, 정작 그가 누구인지, 왜 사라졌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주인공들이 기억하는 그를 관찰할 뿐이다.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내 안에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곤 해.'
사람들의 쉽게 짐작하고 가정한다. 타인의 이야기는 쉬이 입에 담긴다. 누군가의 불행은 걱정으로 포장된 가십거리로 소비된다. 죽음처럼 무거운 것조차 그렇다. 그러한 얄팍한 믿음들 사이에서, 개인은 차마 밝히지 못할 고독에 잠겨들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은 인주의 파편화된 작품과도 같다. 인주는 파도를 그렸고, 그것이 깨지기 전이든, 깨진 후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르다고 믿을 뿐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너머를 바로 볼 수 있을까? 그게 가능은 할까? 글쎄, 시도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우리의 수많은 믿음 너머에, 그것을 있게 한 어떤 사실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어쩌면 우리가 믿음에 눈 가리워 차마 보지 못한 것들을 엿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쩌면, 보인다고 믿는 것을 맹신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놓친 것들을 관찰하게 될 수도 있다. 너무 복잡하다고? 어쩌겠는가, 우리 삶이 이런 것을. 너무 복잡하다가도 단순하고, 짜다가도 싱겁고, 알다가도 모를 게 인생이라지 않나.
- 1
- 200
- 13.1K
- 123
-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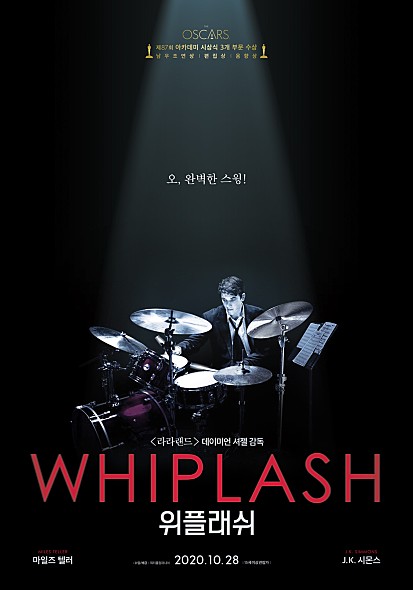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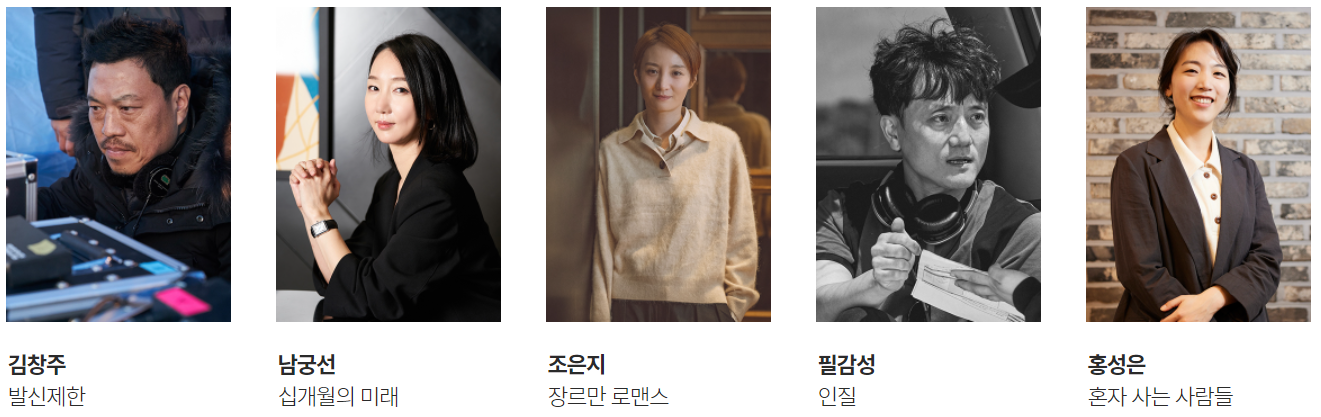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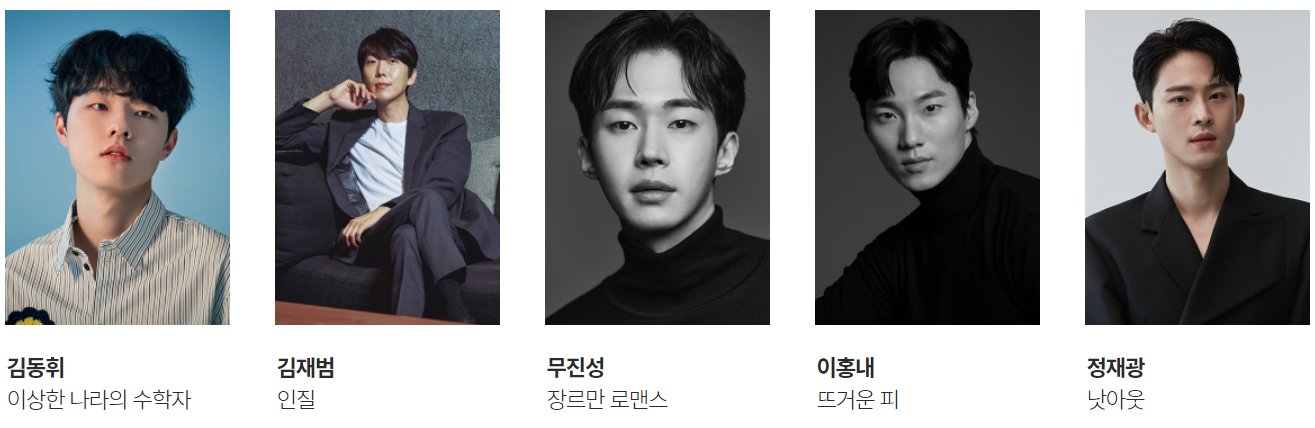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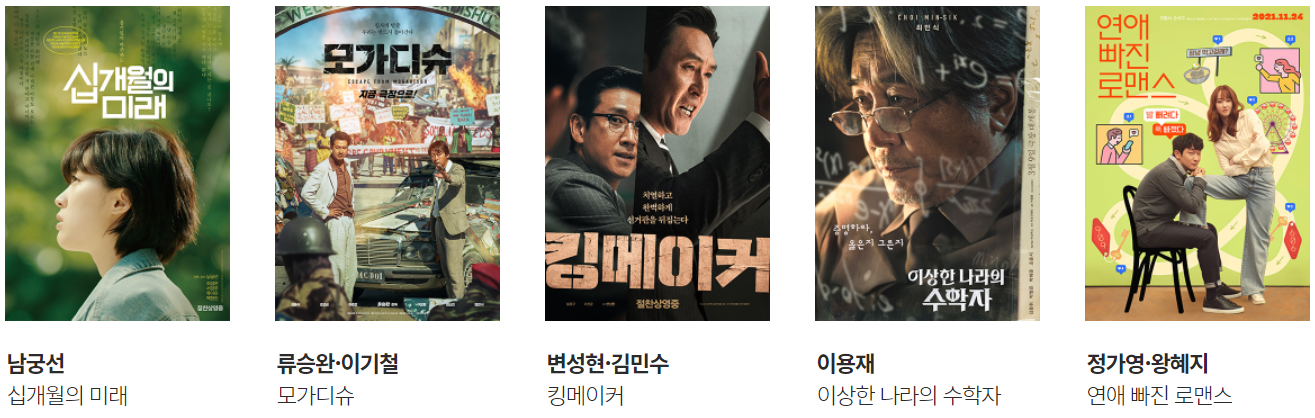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