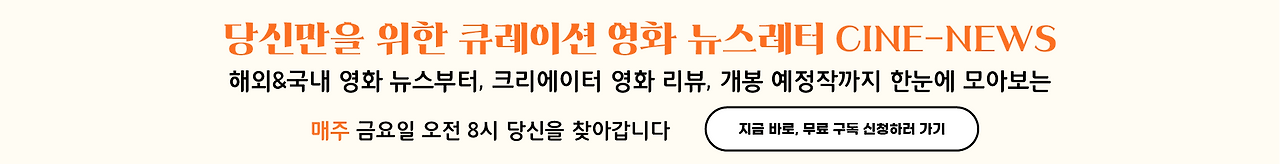udong2023-07-02 22:22:59
운석이 떨어졌던 그곳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애스터로이드 시티> 스포일러 없는 리뷰

Asteroid
영화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애스터로이드는 영화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도시다. 주민이라곤 87명밖에 없는 작은 마을 애스터로이드. 미국 남서부의 한가운데 자그맣게 위치해 있다. 이 동네 가운데에는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음식점이 있다. 차를 정비하는 정비소가 근처엔 주유소까지 있다. 이 외에는 다른 숙박시설이 몇 군데 있다. 하지만 이 도시의 명물은 행성이 충돌한 흔적이다. 우주과학이 발달한 도시 애스터로이드. 이 도시에는 이 크레이터를 연구하는 몇 과학자들이 함께 살고 있기도 했다.
애스터로이드는 한적하다면 한적하다고 볼 수 있는 도시다. 이 도시에 방문객이 왔다. 아이들이 내린다. 이 아이들이 온 이유는 도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있는 영재들을 모아 장학금을 여는 일정이 있었던 것이다. 어느 음식점에 두 가정이 도착했다. 한 가정은 어머니와 딸이 함께 온 밋지와 디아나 모녀, 또 다른 사람들은 오기와 우드로 부자다. 난데없이 아버지 오기가 밋지와 디아나 모녀를 향해 사진을 찍는다. "왜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거죠?" 밋지가 묻는다. 오기의 답은 간단했다. "전 사진작가거든요." 대신 일반적인 사진작가는 아니고, 주로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찍는 사람이었다. "좋아요. 사진을 인쇄한 결과를 보고 싶군요. 그 대신 사진이 예쁘게 나오면 다 괜찮아요." 밋지는 유명 배우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찍히는 사진이 많이 피곤했다. 이 만남을 시작으로 밋지와 오기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또 동시에 디아나와 우드로의 이야기 역시 펼쳐진다.
액자 안에 액자
영화는 전체적으로 극 중 극형식을 취하고 있다. 감독의 전작 중 하나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 공통점을 취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다만 전작과 갖는 차이점은 배경으로 어떤 것을 기저에 깔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우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다. 카메라는 1985년으로 향한다. 한 소녀가 공동묘지 안으로 들어간다. 어떤 동상 앞에 선다. 주섬주섬 책을 꺼내는 소녀. 책을 쓴 작가는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슈'라는 호텔 컨시어저다. 그러니까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구성은 '들었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쪽이 되는 셈이다. 다른 작품인 <프렌치 디스패치>는 기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기자는 어떤 이야기를 무슨 관점에서 담는가가 핵심인 직업이다. 심지어 이야기의 전제조건 자체가 한 언론사의 발행인이 죽어가며 남긴 유언이다. 그러니까 들었던 이야기를 관점에 따라 풀어냈다는 것이 작품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본작인 <애스터로이드 시티> 역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영화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전제조건은 영화의 이야기 배경에 연극이 깔려있다는 점이다. <프랜치 디스패치>가 언론을 소재로 했다는 점과 공통점, 차이점을 동시에 갖는다. 직업인으로서의 특성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 된 것이다. 우선 <프렌치 디스패치>에서는 언론인으로서의 특성인 ‘어떤 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영화에서 핵심으로 작동한다. 이번에는 <애스터로이드 시티>에 나오는 영화와 예술의 관계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극후반부에 반복돼서 나오는 어떤 문장이다. 이 문장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영화는 한 이미지를 반복하고 있다. 초반부에 제시되는 특정한 사건, 영화에서 인물들이 대화하는 방식, 웨스 앤더슨 특유의 강박적인 미장센, 이상한 유머감각이 그 근거다. 이는 예술과 현실의 관계라는 영화의 핵심 키워드와도 관련이 있다. 다시 영화의 구조로 돌아온다. 창작자가 어떻게 연극을 만들었는가? 가 영화의 핵심으로 들어갔다는 점은 역시 직업인으로서의 특징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차이점이다. 사실 1차적으로 드러나는 차이점은 ‘구체적인 시기를 설정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역시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본작 <애스터로이드 시티>는 1955년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프렌치 디스패치>는 가상의 도시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물론 <애스터로이드 시티>도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애스터로이드 시티>에서 구체적인 시점이 들어갔다는 점은 분명한 특이점처럼 느껴진다. 무슨 말이냐? 당시 브로드웨이, 미국의 연극판은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고 한다. 또 있다. 또 흔히 1950년대 중반의 할리우드라고 하면 걸작이 쏟아지던 때였다. 흔히 고전 할리우드라고도 한다. <현기증>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등 여러분들도 흔히 한 번 들어봤을 법한 작품들이 나왔다. 이런 영화들이 개봉하던 때에 이 작품들을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시기의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관점을 영화에서 다루고 싶어서였겠지? 즉 1950년대의 미국을 영화가 그리워한다는 점이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는 <프렌치 디스패치>에서도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다. ‘무언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정적으로 깔려 있는 대전제가 뭘까? 바로 과거의 사건은 기억 속에서 마모되지 않다면 가만히 있다는 점이다. 이를 왜 그리워할까?를 스스로에게 반문한다면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 그 핵심이 저널리스트와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 공통점은 결국 예술가의 이면에 깔려있다는 점, 현실에서 벗어나 예술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와도 닿아있는 셈이다.
흑백과 컬러
이 영화는 전작 <프렌치 디스패치>와 유사하게 흑백/컬러 두 설정을 이어가고 있다. 본작 <애스터로이드 시티>에서 흑백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부분은 극에서 현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반대로 컬러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극 중 극에 관한 부분이다. 이 컬러와 흑백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도 영화의 소소한 재미거리가 된다. 그러나 단순히 소소한 것으로 영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큰 줄기로서 연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이 흑백으로 표현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 흑백 시퀀스 전부가 컬러 시퀀스를 이해하는 거의 모든 가이드라인이다. 대표적으로 초반부에 연극 작가와 배우가 대화하는 신이 있다. 이 부분이 대표적인데, 예술이 현실로 끌고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이 반복은 영화 중 연극에서, 다시 후반부의 흑백 시퀀스에서, 초반-후반의 수미상관 구조에서 반복된다고도 할 수 있다. 현실과 가상의 대비? 당연히 경계선을 흐려서 영화의 하이라이트 신까지 끌고 가기 위함이다. 전체적으로 난해한 작품이지만 이 색채대비를 서사로 끌고 온 방식을 주의 깊게 본다면 여러분도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도를 기다리며>
영화에서 사용되는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엄청 중요하게 밑줄 쳐져 있다'라는 점이다. 작품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두 사람이다. 바로 레오 까락스와 스티븐 스필버그다. 후자는 <파벨만스> 때문이다. 현실이 어떻게 영화화되는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펼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 전체적으로 레오 까락스의 <홀리 모터스>와 <아네트>가 갖고 있는 아이러니가 생각이 났다. 전자 <홀리 모터스>는 얼굴을 바꾸는 영화라고 볼 수 있다. 왜 역할을 바꿀까? 바로 영화와 현실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함이다. 역할을 바꾼다는 점을 반복함으로써 영화를 만들고 보는 일이 현실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대로 <아네트>에서 쓰인 아이러니는 주인공 부부의 딸과 관련한 부분이다. 딸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각인형으로 묘사가 됐었다. 뭐 이외에도 영화 대사가 매번 노래인 거나 바다를 묘사하는 방식이 누가 봐도 연극적인 것도 작품 자체의 아이러니를 품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는 초반부에 제시되는 한 에피소드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 사건이 품고 있는 거대한 아이러니가 있고, 또 이 일이 갖고 있는 세팅이 있다. 후자의 성격 상 이 일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영화의 제목이 왜 '애스터로이드'인가 와도 관련이 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인물들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공간 설명에서 이미 다 깔려있다.
하지만 영화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볼 수 있는 아이러니는 대사에서 나온다. 영화는 <고도를 기다리며>와 비슷한 지점이 있다. 영화에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독은 상실이다. 캐릭터들은 각자의 사정에 의해 무언가를 잃어버려 외로워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반부의 한 사건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연극을 만들기도 하며 연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또한 극 중 극에서 이상한 행동을 벌이는 경우도 몇 있다. 이 상실에 대한 리액션은 인물들이 어떻게 대화하는가? 와 관련이 있다. 영화의 난이도를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올리는 요소가 된다. 어느 장면에서는 이게 코미디로 작동한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초반부의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글쓴이는 이것이 <고도를 기다리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이런 장면들로 가득 차있다. 시간이 약은 아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아이러니는 이런 것들이다. 과연 뭐가 현실이고 뭐가 예술일까? 하지만 무엇이든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현실을 위해 예술이 있다. 반대로 예술 덕에 현실이 있다.
- 1
- 200
- 13.1K
- 123
- 10M















.jpg)
.jpg)
.jpg)
.jp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