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CIA에서 데이터 분석관 겸 해커로 근무하는 '찰리'(라미 말레). 어느 날, 그에게 정보원 '인퀴린'(카이트리오나 발페)가 보낸 첩보 하나가 도착한다. CIA의 '무어'(홀트 맬컬러니) 본부장이 잘못된 작전의 경우 투입된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인명피해도 축소하는 식으로 작전 보고서를 조작해 오고 있었다는 것. 이에 더해 일부 테러리스트들과 손잡고 있었다는 의심까지도. 찰리는 이 첩보를 상부에 보고할지 말 지 고민에 빠진다.
하지만 다음 날 찰리는 마음을 굳힌다. 런던 출장 중이던 아내 '사라'(레이첼 브로스나한)가 4명의 테러범에 의해 살해당한 가운데, 정작 CIA는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거나 사살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 이에 찰리는 기밀 정보를 무기 삼아 무어 본부장을 협박하고, 아내의 복수를 직접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다. 설령 컴퓨터나 두들기고 사람 한 번 죽여 본 적 없는 ‘아마추어’라고 무시당하더라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아마추어와 프로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 돈이다. 프로는 돈을 받고 일한다. 아마추어는 업이 아니라 좋아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아마추어(amateur)'라는 단어의 어원만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어휘 'amator'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추어는 실력을 평가하는 어휘로도 활용된다. 프로 축구 선수에게 아마추어 선수보다 능력이 없다는 혹평은 돈값을 하지 못한다는 모욕이다.
그런데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는 어떤 일을 하는 태도에 따라 갈리기도 한다. 프로 같다는 표현은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에게 붙는 경우가 많다. 냉철하게, 능률적으로 과업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것. 반면에 일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자주 동요하는 사람에게는 아마추어 같다는 표현이 활용된다. 돈이라는 대가와 목적보다 사랑과 열정이라는 동기에 충실한 사람이 아마추어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세 번째 기준은 흥미롭게도 첩보 영화에서 클리셰로 자주 활용된다. 처음 임무에 나서거나, 임무를 받는 요원에게는 꼭 사람이나 동물 등 생명을 죽이는 과제가 주어진다. 살인이라는 행위가 유발하는 혼란, 두려움, 망설임 같은 온갖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지, 즉 프로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 셈이다. 이는 <제이슨 본> 시리즈에서도, <킹스맨> 시리즈에서도 스파이가 되는 마지막 단계였다.
<아마추어>도 마찬가지다. 보다 정확하게는 그 어떤 첩보 영화보다도 아마추어 첩보원과 프로 스파이를 가르는 심리적 경계선에 주목한다. CIA 사무직인 찰리가 아내를 죽인 테러범에게 복수할 때 직접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지, 그의 심경 변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달리 말해 그가 아마추어로 남을지, 프로가 될지를 지켜보는 재미가 <아마추어>를 차별화한다. 아마추어스러운 완성도가 그 묘미를 묻어 버리는 게 문제일 뿐이다.

복수에 성공한 아마추어 첩보원
<아마추어>는 본격적인 찰리의 복수극을 시작하기에 앞서 프로 스파이와 아마추어 첩보원의 차이를 명확히 짚는다. 무어 본부장을 협박해서 현장 요원 훈련을 받게 된 찰리. 그의 훈련이 끝날 때쯤 '헨더슨'(로렌스 피시번) 대령은 그에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선을 알려준다. 밤중에 찰리를 깨운 그는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라고 윽박지르고, 끝내 방아쇠를 못 당긴 찰리에게 결코 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한다.
프로 첩보원은 사람을 죽여야 하는 순간에 아무 고뇌 없이, 기계처럼, 그저 훈련받은 대로 방아쇠를 당길 수 있어야 임무도 완수하고,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의 평가는 틀리지 않았다. 현장에서도, 현실에서도 그는 여전히 아마추어다. 테러범 4인 중 처음으로 찾아낸 여성 테러리스트가 무방비로 등 뒤를 내주었는데도 찰리는 그녀에게 총을 쏘지 못한다.
하지만 찰리는 아마추어라는 한계를 깨지 못하면서도 목적을 착실히 달성한다. 상대방에게 직접 총알을 박아 넣지는 못하더라도 아마추어스럽게 아내의 복수를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이용해서 질식시키거나, 옥상 수영장을 붕괴시켜서 사고사로 가장하는 식이다. 테러범들을 하나씩 찾아 죽이면서 찰리는 아내를 직접 죽인 네 번째 테러범의 은신처에 대한 정보도 직접 찾아내는 데 성공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찰리의 복수는 아마추어스럽다. 그는 마지막 테러범을 직접 죽이지 않는다. 경찰의 포위망을 뚫기 위한 불가피한 살인이었다고 프로답게 자신을 변호하는 그를 해커다운 방식으로 인터폴과 경찰에게 넘겨 버린다. 이처럼 아마추어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찰리의 복수극은 특히 순정적으로 느껴진다. 아마추어 첩보원이기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내의 복수를 하겠다는 진심이 유달리 강조되기 때문이다.

찰리의 내면을 열어볼 두 열쇠
<아마추어>는 찰리의 진심과 순정에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을 두 가지 열쇠로써 열어준다. 우선 찰리의 내적 서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한다. 일례로 초반부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찰리를 묘사하는 데 주력한다. 런던 출장 겸 여행을 같이 가자는 사라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일하느라 바쁘다면서 마지막 통화도 그냥 끊어버리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찰리의 소극성은 그의 죄책감을 극대화한다. 사라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말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회한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강조하기 때문. 이는 아마추어 첩보원으로서 찰리의 정체성을 부각한다. 테러범 체포, 사살에 적극적이지 않은 조직에 환멸을 느낀 그의 첩보 활동은 누구보다도 아마추어적이다. 복수심도 열정의 일종이라면, 아내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열정만이 그의 원동력이 되어주니까.
또 다른 열쇠는 찰리의 주변 인물이다. 이스탄불에서 찰리에게 기밀 첩보를 제공하던 정보원 인퀴린 그가 아마추어라서 돕기로 결심한다. 그녀 역시 아마추어이기 때문이다. 프로 스파이였던 남편과 사별한 후에 그를 잊지 못한 나머지 그의 코드네임을 이어받아서 첩보원으로서 활동한 그녀는 찰리에게서 자신을 본다. 돈이나 업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첩보원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반대로 중요한 역할처럼 보이던 현장요원 '곰'(존 번설)은 끝내 맥거핀으로 활용된다. 일반적인 첩보물이라면 성공적인 작전 수행 후에 그가 찰리를 어떻게 비밀리에 지원했는지를 플래시백으로 보여줬을지도 모른다. 찰리가 그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으니 자연스러운 전개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마추어>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찰리의 아마추어스러운 복수극에 끼어들기에는 그는 너무나도 프로페셔널한 스파이이기 때문이다.

구시대적 배경에 의존하다
문제는 이처럼 '아마추어'의 미덕에 충실한 첩보물을 너무나도 아마추어스럽게 구성했다는 것. 주인공이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로 남은 이유를 보여주겠다는 의도와는 별개로 영화의 완성도는 프로다워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세 가지 부재가 문제다. 바로 신선함, 역경, 짜임새의 부재다. 우선 <아마추어>는 구시대적인 소재를 답습한 나머지 찰리의 서사를 더 깊이 느끼거나 들여다볼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정보기관이 일반 시민 개개인을 모두 감시하고 있고, 그 정보를 독점한 뒤 국익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위법적인 작전과 활동을 벌이면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소재는 이미 여러 첩보 영화가 활용한 바 있다. 또 엇나가는 첩보 요원을 잡기 위해서 서로 다른 첩보 기관이 제각기 그를 쫓아 나서는 것. 그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과 암투. 이 부분 역시 뭐 새로운 것은 없다.
특히 <제이슨 본> 시리즈의 흥행과 스노든의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이후로는 위와 같은 소재를 반영하지 않은 첩보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애초에 로버트 리텔의 소설 <아마추어>가 원작인데, 원작부터가 1981년작이라는 점이 반영된 문제점이 아닐까 싶다. 더 이상 새롭거나 신선한 소재나 주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 극 중 활용되는 최첨단 감시 및 경비 장비들 덕분에 식상함이 더 두드러지기도 한다.

고난이 없는 아마추어
역경의 부재도 문제다. <아마추어>는 액션이 아닌 방식으로 서스펜스를 조성하려고 애쓴다. 천재적인 기술자라는 찰리의 두뇌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상술했듯이 다양한 작전으로 테러범들에게 복수를 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찰리가 어떤 작전을 활용할지 지켜보는 재미만으로는 120분을 끌어가지 못한다. 그가 작전을 너무 잘 짜고 복수를 너무 잘해버리는 나머지 긴장감이 없기 때문이다.
찰리는 두 적과 싸워야 한다. 그가 죽이려는 테러범은 물론 그를 쫓는 CIA와도 맞서야 한다. 그런데 처음으로 현장에서 작전을 직접 입안하고 실행하는 찰리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테러리스트와 CIA 요원들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움직인다. 자연히 영화가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전개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찰리의 기발한 아이디어보다는 영화의 허술함, 편의적인 전개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셈이다.
이는 '아마추어'라는 제목에 담긴 함의가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극 중 찰리는 총을 잘 못 쏜다는 것만 빼면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할 일을 잘 해낸다. 그러다 보니 아마추어라는 어휘에 내포된 사랑과 열정이라는 의미를 먼저 떠올리지 않는 이상 왜 이 영화의 제목이 '아마추어'인지는 물음표로 남을 수밖에 없다.

라미 말렉만 돋보인다
더 나아가 전체적인 구성과 서순도 적절하지는 않은 듯하다. 영화는 부패한 CIA를 먼저 제시하면서 찰리 대 CIA, 개인 대 조직의 대립을 보여주려고 한다. 하지만 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조직을 농락하다 보니 조직에게 배신당하고 쫓기는 압박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테러범과 CIA의 접점을 마지막까지 숨기면서 알 수 없는 적과 싸우는 서스펜스를 강화했다면 첩보 영화의 장르적 쾌감이 극대화되지 않았을까 싶다.
빌런 활용법도 아쉽다. 빌런과 찰리의 대립각이 날카로울수록 그의 복수가 남기는 쾌감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빌런을 제외하면 게임 미션처럼 한 번 밟고 넘어가야 할 대상처럼 몰개성 하게 묘사되다 보니 복수의 끝은 다소 싱거운 감이 있다. 초반부에 찰리가 느낀 고통과 자책감에 비하면 빌런을 제거했을 때의 시원함이 부족한 것. 결과적으로 영화가 잘 짜여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는다.
결국 <아마추어>는 평범한 할리우드 첩보물 클리셰를 벗어나지 못한다. 일정 수준의 재미는 갖췄지만, 그 이상의 특별함을 뽐내지는 못한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선을 활용한 스토리텔링도 온전히 꽃을 피우지는 못한 채로 흐지부지 끝난다. 구시대적인 주제의식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볼거리와 상충한다. 그저 아내를 잃은 남편이자 살인의 무게감을 견뎌내는 요원으로 변신한 라미 말렉의 연기력이 인상적일 따름이다.

Poor 형편없음
아무리 그래도 완성도는 프로페셔널해야지































 [ Fresh meat]
[ Fresh m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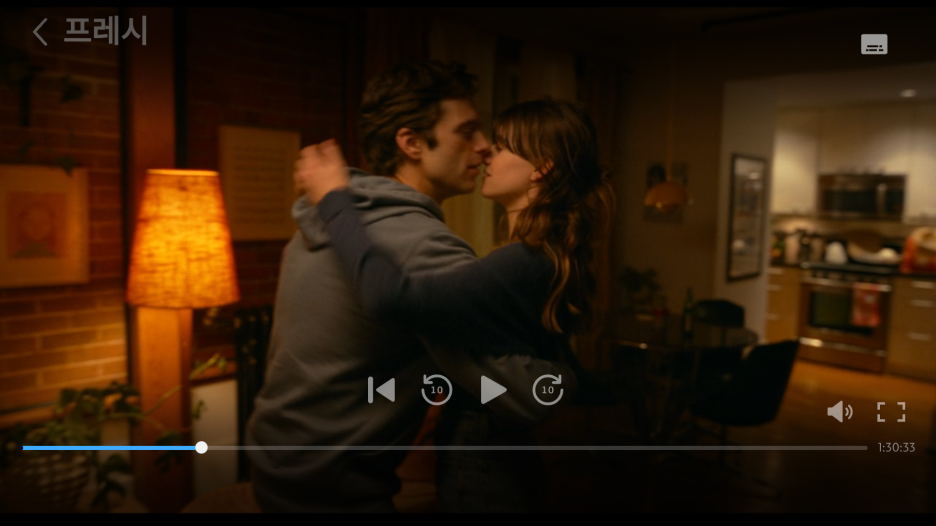 [케미, 미친다]
[케미, 미친다]

 [거울의 상을 이용한 로맨스 시퀀스]
[거울의 상을 이용한 로맨스 시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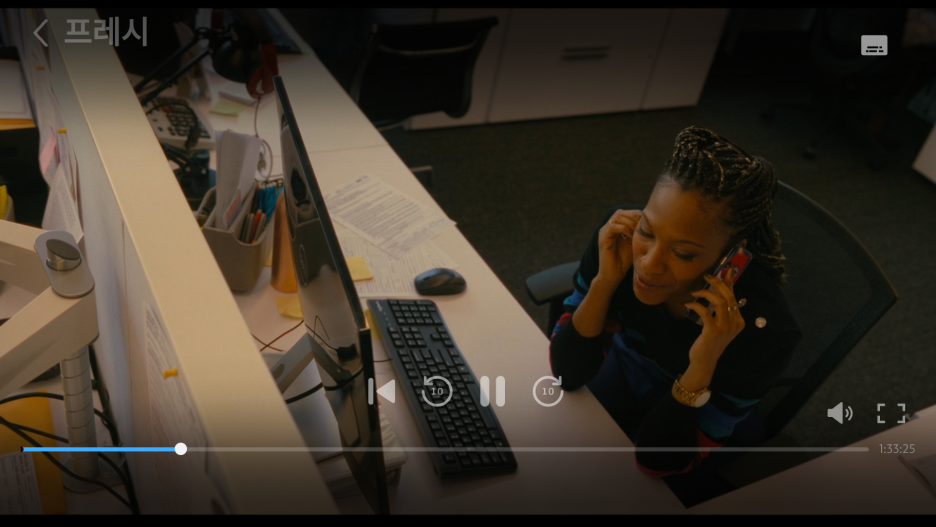
 [안정적 구도, 넓은 사이즈]
[안정적 구도, 넓은 사이즈]
 [ 망원으로...]
[ 망원으로...] [광각 MCU]
[광각 MCU]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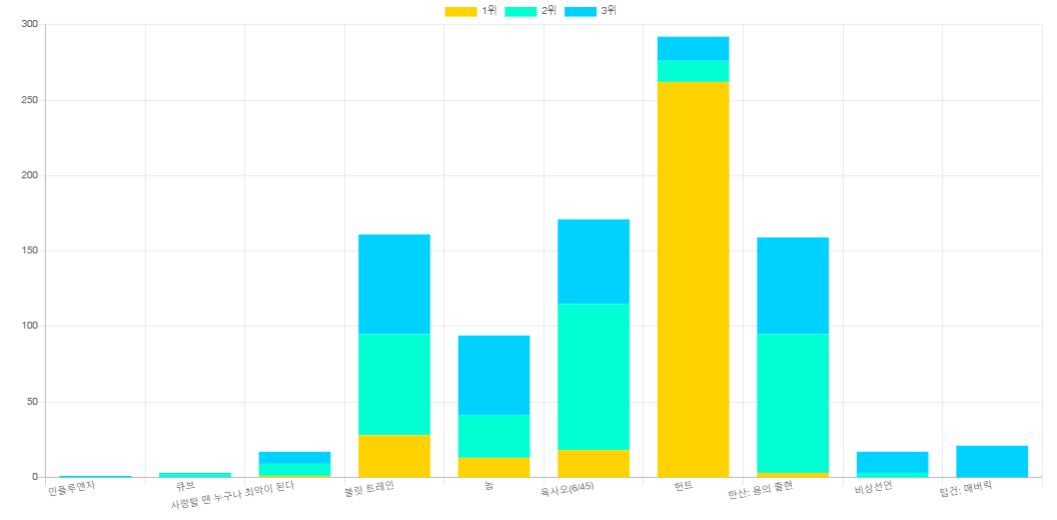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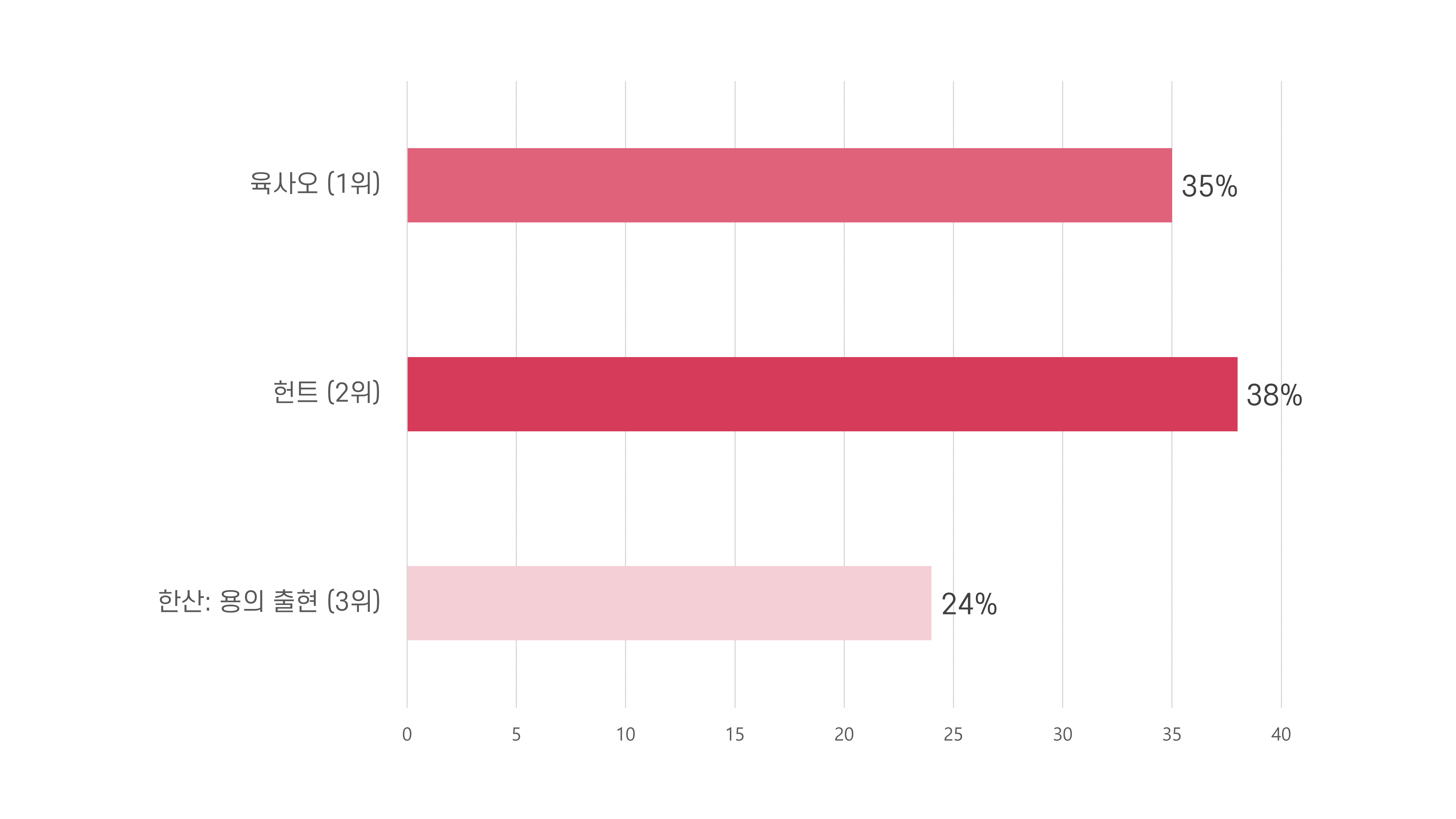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