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의 영화2025-03-05 11:30:58
웨스 앤더슨의 '빈 곳' 비추기
웨스 앤더슨, 로알드 달 시리즈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쥐가 출연하자 사람들은 설치류 전문가 '쥐잡이 사내'를 불러 쥐를 박멸하려고 한다. 쥐를 잡기 위해 쥐를 닮아버린 '쥐잡이 사내'는 나름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쥐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쥐는 나타나지 않는다(쥐잡이 사내). 맹독을 가진 우산뱀이 이불 안으로 기어들어와 옴짝달싹 못하고 누워있는 남자는 온몸이 땀으로 젖는다(독). 작은 시골 마을, 불량배들에게 쫓기는 약한 소년은 위협을 피해 높은 나무로 올라갔고(백조), 타짜가 되기 위해 초능력을 익히려는 남자는 하루 종일 카지노를 돈다(기상천외한 헨리슈가 이야기).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동화 작가 로알드 달의 인물들이 웨스 앤더슨의 카메라로 다시 태어났다. 넷플릭스의 [ 로알드 달 시리즈 ]를 통해서다. 넷플릭스는 2021년 '로알드 달 스토리 컴퍼니'를 9,200억 원을 들여 인수하고, 그 직후 웨스 앤더슨과 함께 4편의 단편소설을 영화화하는 '로알드 달 시리즈' 제작을 결정했다. 적잖은 자본이 투입된 프로젝트인 셈인데, [ 로알드 달 시리즈 ]는 그다지 대중향을 고려한 것 같진 않다. 4편의 단편영화로 구성된 [ 로알드 달 시리즈 ]의 애초 기획은 장편이었다고 하는데, 거의 실험극에 가까운 구성으로 봤을 때 러닝타임을 줄인 건 옳은 선택이었던 듯싶다.
웨스 앤더슨이 이 시리즈를 통해 보이고자 한 것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가 출연하는 조건-형식이다. 지금껏 필모그래피에서 다분히 연극적인 내레이션과 미장센을 구사해온 웨스 앤더슨은 '로알드 달 시리즈'를 통해 아예 연극 무대를 영화의 형식으로 통합하는 시도까지 나아간다. 시네마 카메라가 주는 화면의 깊이(Depth)를 배제하고, 평면적인 세트를 갈아끼우는(?) 방식으로 화면을 전환한다. 심지어 세트를 옮기는 스탭들이 공공연하게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배우들은 그들에게 눈짓을 보내거나 작은 목소리로 지시를 주고받는다. 웨스 앤더슨 특유의 수평/수직적인 카메라 이동(돌리)도 도드라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마임(mime)'이다. [ 로알드 달 시리즈 ]에서 배우들은 어떤 특정한 소품을 마임으로 대체하는데, 예를 들어 허공에 빈손으로 총을 쏜다던가(백조), 보이지 않는 자루에서 보이지 않는 쥐를 꺼내는(쥐잡이 사내) 식이다.

화면 구성뿐만 아니라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축도 남다른데, [ 로알드 달 시리즈 ] 속 캐릭터들은 저 자신의 육성으로 스토리를 읊어댄다. 내레이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캐릭터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상태 등을 진술하는 걸 넘어 제4의 벽을 부수고 영화 전체의 스토리를 직접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소설/대본의 지문을 직접 읽어주는 형식에 가깝다고 할까. 이런 구성이 주는 독특한 위화감은 「기상천외한 헨리슈가 이야기」에서 도드라진다. 「기상천외한 헨리슈가 이야기」는 '헨리슈가'씨가 우연히 발견한 한 기록을 읊으며 이야기가 진행되는 소위 '액자식 구성'을 취하는데, 영화의 중반부가 되면 아예 원작자 로알드 알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읊어주는 헨리슈가씨를 읊어'준다.
웨스 앤더슨이 어마 무시한 대자본이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이런 도전적인 시도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관자가 아니라면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아마도 아이디어의 시작에는 원작자 로알드 달의 작품 철학이 있을 수도 있겠다. 로알드 달은 자신의 작품이 수정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생전 출판사에 자신의 직접 쓴 원고에 문장 부호 하나 바꾸지 말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을 정도. 심지어 그는 자신의 작품 「마녀를 잡아라」를 영화화했던 '니콜라스 뢰그' 감독의 「마녀와 루크」를 보고 결말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청 금지 캠페인까지 추진했었다.
그런 원작자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작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근거는 없고, 그냥 개인적인 예상이다. 웨스 앤더슨은 이미 「판타스틱 Mr. 폭스」를 통해 로알드 달의 작품을 영화화한 적 있다). 아이디어의 태동이야 어쨌든, 웨스 앤더슨은 '텍스트의 영화화'라는 프로젝트에서 일종의 '메타 Meta - 형식' 적인 목표를 품었다. 앞서 언급했듯 그것은 이야기가 출연하는 형식 - 조건을 밝히는 것이다.
배우들로 하여금 지문을 그대로 읊게 하고, 드르륵거리며 세트를 옮기며, 인위적인 마임을 선보이는 건 영화/연극의 핵심인 '제4의 벽'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캐릭터의 의식이나 행동에 대한 묘사가 지극히 문어(文語) 적인 이유가 원작이 소설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흔히 '제4의 벽'을 철저히 숨기는 것은 '이야기'를 형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여겨지고, 피치 못해서든 실수이든 '제4의 벽'을 드러내는 것은 창작자의 역량 부족으로 비판받는다. 카메라/조명/음향 등의 기술적 한계는 물론, 연출/편집의 유려함이나 대본의 '개연성'문제 역시 '제4의 벽'개념의 연결선상이다. '그럴 듯' 해야 관객이 작품을 '현실'로 여기고(속고) 그 뒤에 비로소 '이야기'가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알드 달 시리즈]에 따르면, 과연 그런가?
일단 관객들은 [로알드 달 시리즈]를 현실의 반영으로서 몰입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웨스 앤더슨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배우들이 카메라 밖 스텝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독특한 연출뿐만이 아니다. 대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로알드 달 시리즈]는 딱히 기승전결이나 '개연성' 같은 걸 챙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관객들은 영화에 몰입하고, '이야기됨'을 감각한다. 즉, [로알드 달 시리즈]에서 '이야기'의 형성 조건이란 '제4의 벽을 숨기기/ 그럼으로써 관객들을 속이기'가 아닌 셈이다. 대신 웨스 앤더슨은 다른 걸 숨긴다. 마치 공백을 가리키는 손가락, 마임처럼.

이를테면 「쥐잡이 사내」의 '이야기'는 결말에서 비로소 형성된다. '쥐잡이 사내'에 따르면 건초더미 속에 숨어있는 쥐들은 무언가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미끼를 먹지 않았다. 그러나 쥐가 먹었을 '맛있는 것'의 정체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망부석같이 놓여있는 거대한 건초더미만 있을 뿐.
「독」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불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독뱀을 쫓기 위해 영화 내내 온갖 난리(?)를 쳤지만, 정작 이불을 걷어내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꿈을 꾸셨나 봐요"라는 인도인 의사의 말 한마디에 흥분해 뱀처럼 독을 쏘아대는 해리만 있을 뿐이다(결국 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기상천외한 헨리슈가 이야기」에서 결국 헨리슈가의 정체가 누구인지는 공백으로 남았고(작중에서 그는 누구나 알만한 유명인이며 '곧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백조」 속 괴롭힘당하는 어린 소년 '왓슨'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다. 명료하게 해석될 수 없는 내레이션만 남았을 뿐이다.
[로알드 달 시리즈]가 숨긴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무엇을 숨겼는지를 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이미 발각된 것이니까. 간략한 위치에 어떤 공백이 있다는 어렴풋한 사실 정도를 뉘앙스로 풍기는 것으로 이야기는 출연한다.
4편의 단편 중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장 온건하게 이야기 꼴(?)을 갖추고 있는 작품은 「기상천외한 헨리슈가 이야기」 이지만, 가장 '힘'이 느껴지는 건 그 대척점에 있는 「쥐잡이 사내」인 점은 의미심장하다(「쥐잡이 사내」의 로튼 토마토 지수는 만점이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TV는 달이라고 백남준이 말했던가. 최초의 이야기일 다양한 문명의 신화들이 대체적으로 '밝히기'보단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래 이야기란 행간과 자간이고, 씬과 씬, 컷과 컷 사이의 어둠이다. 그곳에 마법이 있다.
- 1
- 200
- 13.1K
- 123
-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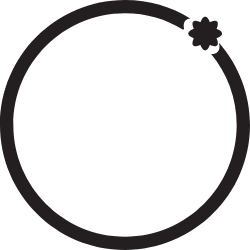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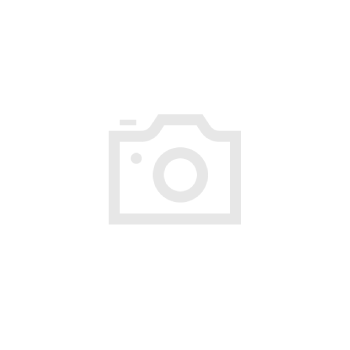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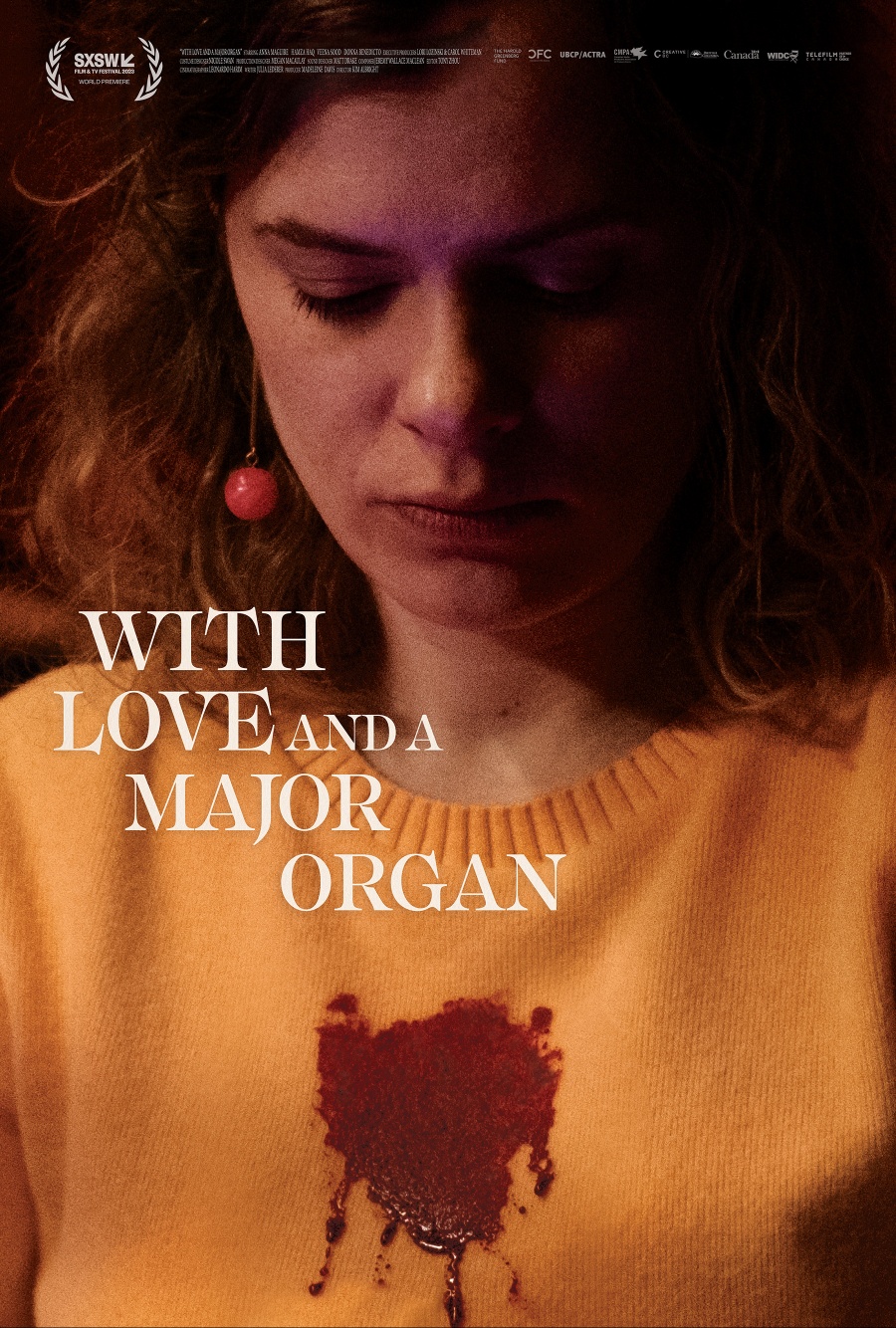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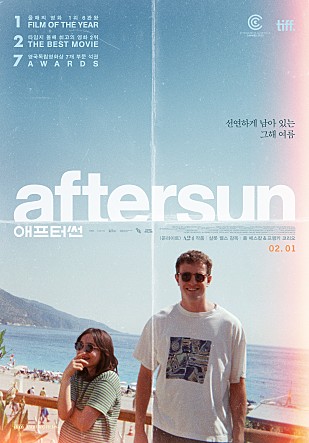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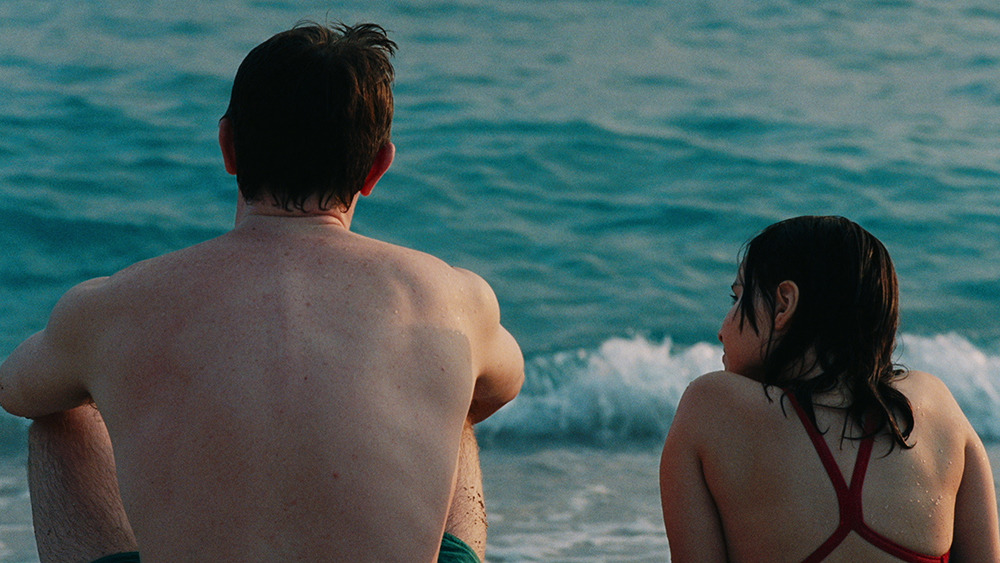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