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불법 복싱 경기를 뛰며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던 복싱 선수 ‘마르코’(강태주). 어느 날, 평생 본 적 없는 한국인 아버지가 보낸 변호사가 마르코의 앞에 나타나고,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찾는다는 말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마르코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목숨을 건 추격전에 휘말린다. 비행기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던 정체불명의 남자 ‘귀공자’(김선호)는 곧장 마르코의 숨통을 조여 온다. 마르코의 이복형인 재벌 2세 ‘한 이사’(김강우)도, 필리핀에서 우연히 마르코와 만났던 ‘윤주’(고아라)도 제각각의 이유로 마르코를 쫓기 시작한다. 이처럼 영문 모를 추격전의 끝에서 마르코는 자기 인생을 바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다.
또 한 번의 변주
한국형 누아르의 진수를 보여줬던 <신세계>. 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일까? 박훈정 감독의 작품은 언제나 <신세계>와 비교될 운명이었다. 실제로 몇몇은 <신세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박훈정 감독은 꾸준히 변화를 시도했다. 누아르라는 장르 밖으로 나가지는 않되, 그 안에서 변주를 줬다. 일례로 <마녀>는 <신세계>와 달리 여성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관객에게 어필했다.
<낙원의 밤>은 서사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꾀했다. 한국형 누아르의 관습적인 이야기를 거부했다. 의리와 정을 강조하는 사나이 대신 같은 트라우마를 지닌 두 남녀에게 주목했다. 우정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족처럼 보이기도 하며, 이성 간의 사랑 같기도 한 이야기를 보여줬다. 덕분에 <낙원의 밤>은 서정적인 누아르였다.
박훈정 감독의 신작 <귀공자>도 마찬가지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캐릭터다. 공들여 만든 '귀공자'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장르, 이야기, 메시지를 마음껏 가지고 논다. 귀공자가 한 인물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이기에 가능한 시도다. 다만 성공적인 변화인지는 의문이다. '귀공자'에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전반적인 균형까지는 챙기지 못했다.
귀공자의 영화
귀공자. 처음 보거나 들으면 꽤 어색한 제목이다. 근래에 잘 쓰이지 않는 말이라서 오글거리거나 과한 느낌도 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진다. 이보다 적확한 제목도 없는 듯하다. 따져 보면 이 영화는 어떤 맥락에서든 귀공자의 영화가 맞기 때문이다.
사전적으로 귀공자는 "귀한 집 아들. 또는 귀한 집 젊은 남자를 이르는 말"이다. 실제로 <귀공자>에는 눈에 보이는 귀한 집 아들과 숨겨진 귀한 집 아들이 있다. 한 이사는 눈에 보이는 귀공자다. 재벌 2세인 그는 이복여동생 '가영'(정라엘)과 치열한 경영권 다툼 중이다. 마르코는 숨겨진 귀공자다. 필리핀에서 병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 마르코는 한 이사의 또 다른 이복동생이자, 귀한 집 아들로 밝혀진다.
<귀공자>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추격전이다. 한 이사는 쫓고, 마르코는 쫓긴다. 한 이사는 급하다.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려 내서 유언 내용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마르코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의 건강한 심장을 이식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으니. 아버지를 만나는 줄 알았던 마르코는 이내 필사적으로 도주한다. 평생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살던 그가 이복형을 위해 순순히 죽을 이유는 없다.
귀공자에 의한 영화
두 귀공자의 갈등을 틈타 속셈을 알 수 없는 세 번째 '귀공자'가 등장한다. 그 역시 귀공자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한다. "생김새나 몸가짐이 의젓하고 고상한 남자"이기 때문이다. 오프닝 장면에서 그는 마치 제임스 본드 같다. 깔끔한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자랑한다. 일 하는 솜씨도 프로다. 신속 정확하게 목표를 처리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속물적이다. 명품 구두에 피가 튀면 크게 화내며, 빗방울이 떨어지자 양복이 젖을까 봐 추격을 멈추기까지 한다. 그 덕분에 귀공자가 본모습인지, 귀공자를 동경하는 경박함이 진짜 정체인지 알기 어렵다.
그의 행적은 이러한 양면성을 반영한다. 러닝 타임이 지나도 그의 속셈은 오리무중이다. 그는 마르코를 한 이사에게 데려가던 사람들을 습격한다. 마르코를 빼낸 후에는 몸값으로 천만 달러를 요구하며 한 이사를 협박한다. 그렇다고 마냥 마르코를 돕지도 않는다. 스스로를 친구라고 소개하지만 정작 마르코에게 총을 겨누기도 한다. 선과 악이 분명한 한 이사와 마르코 사이에서 '귀공자'는 물음표가 가득한 영역에 발을 딛고 있다.
영화의 전체적인 콘셉트도 그의 양면성과 맞닿아 있다. '귀공자'의 계획이 끝까지 베일에 싸여 있다 보니 영화 분위기도 그의 행보에 따라 달라진다. 마르코가 추격전에 휘말리는 전반부는 진지한 누아르에 가깝다. 그런데 '귀공자'가 난입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진다. 피 튀기는 액션과 만난 그의 유머와 기행이 무거움과 경박함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룬다. 박훈정 표 누아르가 블랙코미디로 넘어가는 전환점인 셈이다.
귀공자를 위한 영화
이들 세 귀공자가 모이면 영화는 마침내 본심을 털어놓는다. 그 중심에는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 혼혈 '코피노'가 있다. 전반부는 마르코의 일상을 자세히 비춘다. 그는 불법 복싱으로 어머니 치료비를 마련하다가 끝내 범죄를 저지른다. 아버지의 도움은 없다. 이 대목은 코피노에게 무관심한 한국 사회를 비판한다. 마르코와 한 이사의 만남도 문제를 고발한다. 한 이사는 마르코를 잡종이라 부르며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기 때문. 이는 서서히 이슈화되는 동남아 차별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화적 상상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귀공자>의 시도는 더 인상적이다. 후반부에 '귀공자'는 자기도 코피노라고, 피 튀기는 추격전도 인질극도 다 자기가 계획한 일이라고 고백한다. 그 순간 귀공자 3명의 관계가, 익숙한 재벌가 다툼은 다시 쓰인다. 차별하는 한국인과 차별받는 코피노, 그리고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뒤엎으려는 코피노가 새롭게 보인다. 마르코의 진짜 정체를 둘러싼 반전도 허를 찌른다. 귀공자라는 허상조차 막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온다.
일말의 아쉬움은 있다. 모든 코피노를 하나의 정체성 안에 가두는 섣부른 일반화가 눈에 띈다. 원색적인 언행을 걸러내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귀공자>의 시도는 여전히 인상적이다. <슬픈 열대>가 본래 제목인 이유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상업영화에서 코피노라는 소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귀공자만을 위한 결과
하지만 <귀공자>의 결과물은 기대 이하다. 과감한 시도는 좋았으나, 의도가 스크린 위에 온전히 구현되지는 않았다. 귀공자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려다 놓친 캐릭터가 많다.
고아라가 연기한 윤주가 대표적이다. 강렬한 첫인상과는 달리 그녀는 사건의 배경과 전개를 설명하는 기능적인 인물에 불과하다. 퇴장도 작위적이다. 추격전의 흐름을 한 번 더 꼬기 위해 갑자기 사라진다. <마녀>와 <낙원의 밤>에서 매력적인 여성 주인공을 만든 전력이 있다 보니 이러한 활용법은 의아하기까지 하다.
'귀공자'라는 캐릭터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파생된 문제도 있다. 반전의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에게 모든 역할을 몰아준 결과 다른 두 주인공은 그저 소모된다. 우선 매력적인 마스크를 지닌 신인 강태주를 찾아 놓고도 마르코를 제대로 써먹지 못했다. 그를 진중하고 수동적인 캐릭터로 설정하다 보니 친구가 되어야 할 '귀공자'와의 합이 잘 맞지 않는다. 복싱이라는 소재를 액션 영화가 살려내지 못한 것 역시 실망스럽다.
한 이사 역시 전반부와 후반부의 괴리가 두드러진다. 김강우의 광기 어린 연기는 인상적이지만, 그는 '귀공자' 주도로 장르가 전환될 때 일관성을 잃어버린다. 전반부에는 무게감 있는 사이코패스였지만, 후반부에는 무게 잡는 척만 하는 평범한 악역으로 전락한다.
이에 더해 액션 누아르를 표방하는 영화치고 액션씬의 임팩트가 약하다. 카 체이싱 장면의 경우 템포가 다소 느리다. 차 안에 있는 사람을 비추는 앵글이 고정되어 있고, 차체를 비추는 앵글은 자동차 광고를 보는 듯하다. 그 결과 역동감이나 박진감이 부족하다. 잔인하게 피 튀기는 액션도 인상적이지 않다. 계속해서 흔들리는 카메라 때문에 정확히 어떤 사건이 화면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박훈정 감독은 개봉 전 기자간담회에서 "차별받은 이들이 차별하는 이들에게 한 방 먹이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귀공자와 코피노, 두 키워드를 엮어낸 스토리에서 그 의도는 분명하게 읽혔다. 하지만 그 의도가 스크린에서 적절하게 펼쳐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결과 이번에도 박훈정 감독의 변주는 절반의 성공으로 보인다. <신세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날도 다음을 기약한다.
Poor 형편없음
달리 말하면 김선호의, 김선호에 의한, 김선호를 위한 영화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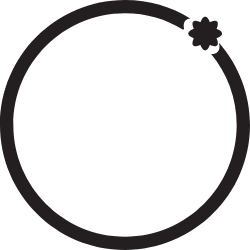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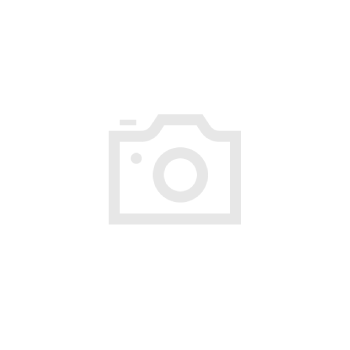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