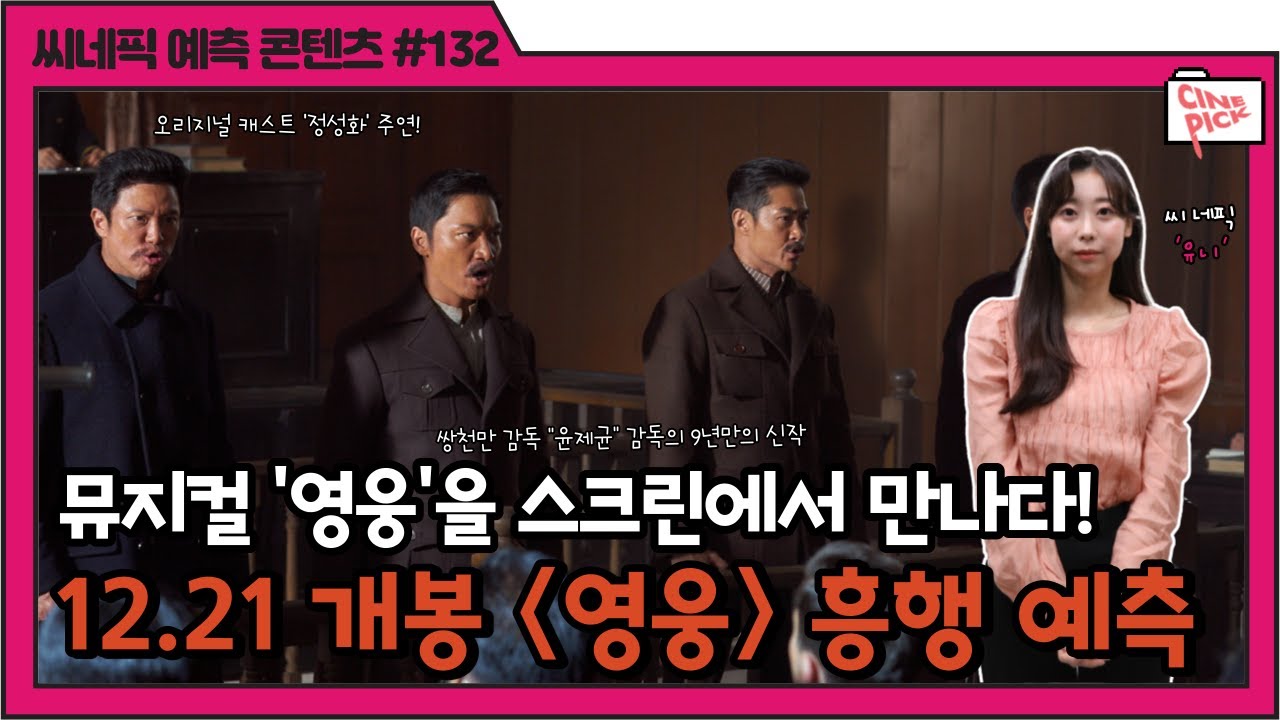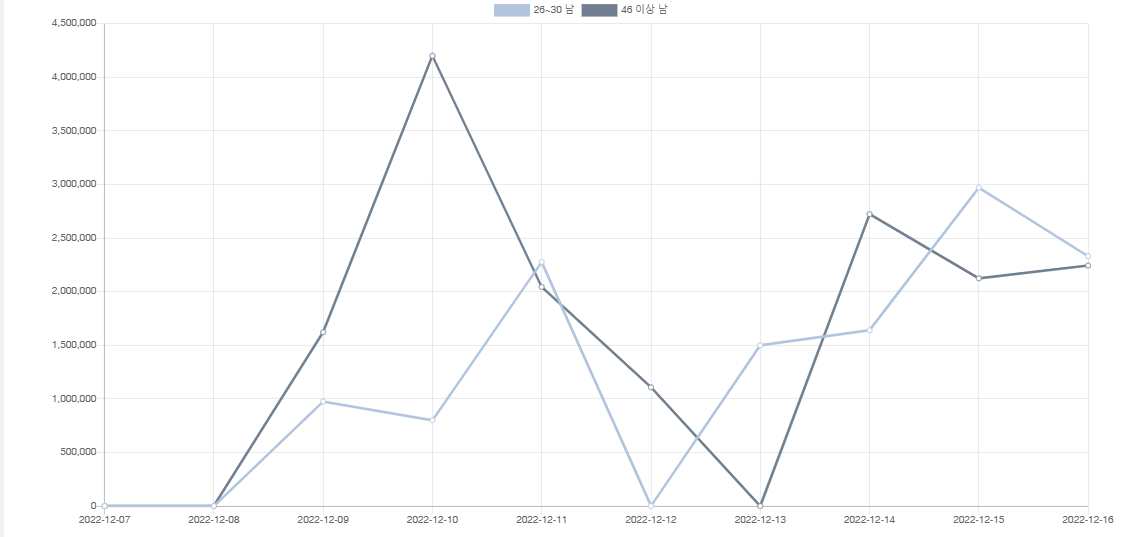세라별2021-10-07 11:37:38
기존 영화 문법에서 기출변형을 시도한 영화 <모가디슈>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천만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 <모가디슈>. 모가디슈가 처음에는 무슨 말일까 도대체 뭘까 했는데 소말리아 수도였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아마 이제 소말리아 수도는 모가디슈라는 것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강렬했던 작품이었고, 만족스러웠던 영화였다.
영화 <모가디슈> 시놉시스
내전으로 고립된 낯선 도시, 모가디슈.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생존이다!
대한민국이 UN가입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시기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는 일촉즉발의 내전이 일어난다. 통신마저 끊긴 그 곳에 고립된 대한민국 대사관의 직원과 가족들은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북한 대사관의 일행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문을 두드린다. 목표는 하나, 모가디슈에서 탈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네이버영화를 참고했습니다.
이 이후로는 영화 <모가디슈>에 대한 스포일러가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찝찝할까?
제목만 보면 뭐지 재미없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좋은 의미로 찝찝하다. 분명히 아주 시원하다 못해 추운 영화관에서 쾌적하게 영화 <모가디슈>를 보고 있는데 마치 내 몸이 땀으로 끈적끈적 한 것 같고, 정말 찝찝했다. 얼른 샤워를 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배경이 후덥지근한 소말리아다 보니 배우들이 땀을 흘리고 전기가 다 나간 상황에서 에어컨도 선풍기도 키질 못한 채로 여러 명이서 다닥다닥 붙어있으니 아주 깝깝하다. 영화 <모가디슈>는 이러한 분위기를 정말 잘 살렸다. 불이 나는 화마 속에서는 그 매케함이 한 여름밤 에어컨고 선풍기가 없는 곳에서는 훅훅 찌는 그 습함이. 장면장면 공간의 분위기를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들어서 굉장히 신기했다.

카체이싱이 대박인걸?
영화 <모가디슈>에서 명장면을 뽑자면 바로 ‘카체이싱’이다. 반란군의 공격을 피해서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피신을 가는 과정이었다. 이제까지 여타 다른 영화에서 봤던 카체이싱은 정말 성능이 좋은 차나 그래도 웬만큼 구동은 하는 차량으로 쫓고 쫓기는 장면들을 연출했다. 그런데 영화 <모가디슈>에서는 와,, 저 똥차를 가지고 카체이싱을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심장 쫄리는 장면이었다.
분명 차량 성능상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것은 아닌데 게다가 총알을 피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덕지덕지 책과 문짝들을 달아놔서 엄청 볼품이 없는데 세상 박진감이 넘친다. 4대의 차량들이 졸졸졸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향하는데 한 5-10분 되는 시간의 그 카체이싱을 아마 잊지 못할 장면이 될 듯 싶다.

액션영화의 흐름을 그래도 타지만 조금씩 변형을 주다
영화 <모가디슈>를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 액션 영화의 흐름을 그대로 타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기출 변형을 했기 때문이다. 분명 다 어디선가 본 장면들이다. 카체이싱이며 배우들 간의 액션이며 등장인물간의 반목과 화합. 그리고 동료의 죽음. 다 한번쯤 한국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다.
하지만 영화 <모가디슈>는 한번씩 본 장면들을 ‘내가 더 잘해’ 라는 식의 화려함으로 풀어내지 않았던 것이 조금 달랐던 것 같다. 대표적으로 허름한 차로 진행하는 카체이싱이라던지, 배우들 간의 액션신도 소박-하게 집안에서 끝난다. 이렇게 무언가 자! 우리가 이만큼이나 할 수 있어! 불여줄게! 잘 봐! 이런식으로 화려하게 힘을 주는 형식이 아니라 와,, 저걸로 액션을 한다고? 저걸로 카체이싱을 해서,,, 박진감이 만들어진다고? 가다 다 죽는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허술하고 빈구석을 보여주면서 결국 성공으로 이끄는 스토리라인이 기존 액션 문법을 지키면서도 허술한 빈틈이라는 변형을 주어서 재밌고, 긴장감 넘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영화 <모가디슈>는 정말 보는 내내 모든 사람에게 추천해 주고 싶었던 작품이었다.
- 1
- 200
- 13.1K
- 123
- 10M



.jpg)
.jpg)
.jpg)
.jpg)

.jpg)

.jpg)
.jpg)
.jpg)
.jpg)
.jpg)

.jp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