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주 개봉영화!

범죄도시2 the roundup , 2022
범죄영화의 레전드! 범죄도시의 컴백!
범죄 액션 영화의 레전드 흥행 신화의 주역인 범죄도시가 후속작으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대표 범죄 액션 시리즈 "범죄도시2"는
괴물형사 ‘마석도’와 금천서 강력반이 베트남 일대를 장악한 최강 빌런 ‘강해상’을 잡기 위해 펼치는 통쾌한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인데요
"범죄도시2"는 전편의 가리봉동 소탕작전 4년 뒤를 배경으로 베트남까지 세계관을 확장했습니다
화끈하고 살벌해진 금천서 강력반이 선보일 압도적 스케일의 범죄 소탕 작전은 전편과는 색다른 재미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특히 마석도 형사를 비롯한 금천서 강력반은 물론, 장첸을 이을 새로운 인물이자 최강의 빌런 ‘강해상’의 등장까지 예고해
전편을 뛰어넘는 강렬한 조합을 완성시켰습니다.
북미, 베트남, 대만, 싱가폴 등 전세계 132개국 극장 개봉확정한
첫번째 추천영화 "범죄도시2" 입니다.
예고편 보기
클릭
-------------------------------------------------------------------------------------------------------------------------------------------------

어부바 2021
유쾌한 웃음과 찡한 눈물을 책임질 코미디영화가 온다!
영화 "어부바"는 가족과 어부바호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부바호 선장 종범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어부바호 선장 종범 역에 코미디 연기의 대가 정준호, 철없는 동생 종훈 역에는 생활 연기의 달인 최대철,
종범의 늦둥이 아들 노마 역에는 천재 아역 배우 이엘빈이 맡아 관객들을 웃고 울릴 황금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최종학 감독은 “지극히 보편적이고 소소한 내용의 즐겁고 행복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젊은 세대만 보는 자극적이고 센 장르 영화가 아닌 전 세대가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며 "어바부"의 기획 의도를 밝혔는데요
'가문의 영광', '두사부일체'등 코미디로 스크린을 점령한 대한민국 대표 믿고 보는 배우 정준호가 주연을 맡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찡하고 유쾌한혈육 코미디!
두번째 추천영화 "어부바" 입니다.
예고편 보기
클릭
-------------------------------------------------------------------------------------------------------------------------------------------------

완벽한 축사를 준비하는 방법 Le discours , THE SPEECH , 2020
유쾌한 웃음과 찡한 눈물을 책임질 코미디영화가 온다!
영화 "완벽한 축사를 준비하는 방법"은 낭만적인 연애를 원하지만 인간관계에는 서툴어 실수가 많은 INFP 소심남 '아드리앵'이
피곤한 연애에 지친 자유로운 영혼의 ESTP 여자친구부터
눈치 빠르고 관찰력이 좋은 ISFP, ISTP 부모님과 타인에게 무신경한 INTJ 친누나, 그리고 토론과 잘난 척을 좋아하는 ENTP 예비 매형까지
다양한 MBTI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꼬마 니콜라'부터, '업 포 러브'까지 사랑스러운 프랑스 수작을 탄생시킨 감독 로랑 티라르가 연출과 각본을 맡은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원작을 각색하는 작업부터 연출까지 모든 제작 과정에 자신의 내공을 쏟아부은 감독 로랑 티라르는
가족, 연인 사이에서 시트콤 같은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혈액형과 별자리에 이어 MBTI 성향으로 연애 궁합을 맞춰보는 트렌드에 아주 딱맞는
세번째 추천영화 "완벽한 축사를 준비하는 방법" 입니다.
예고편 보기
클릭
-------------------------------------------------------------------------------------------------------------------------------------------------

매스 MASS , 2021
로튼토마토 신선도 95%! 메타스코어 MUST SEE! 베니티페어 올해의 TOP10!
영화 "매스"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아이를 잃은 두 부부의 슬픔, 분노, 절망, 후회가 폭발하는 111분의 명작인데요.
일찌감치 로튼토마토 신선도 95%, 메타스코어 MUST SEE, 2021년 베니티 페어 선정 최고의 영화 TOP10에 오르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화제작입니다.
프란 크랜즈 감독은 2018년 17명의 사망자를 낳은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 총기 사건 뉴스를 보고 난 후 운명적으로 영화를 구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를 잃은 부모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코 섞일 수 없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로 마주한 2쌍의 부부가
그 날 이후로 6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오후, 1개의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용기를 내어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마주한 이들이지만 결국 마음에 품고 살던 감정들이 터지며
슬픔, 분노, 절망, 후회 등 격렬한 감정들이 폭발하게 되죠
슬픔, 분노, 절망, 후회에서 나아가 용서, 화해까지! 인생을 꿰뚫는 영화
네번째 추천영화 "완벽한 축사를 준비하는 방법" 입니다.
예고편 보기
클릭
-------------------------------------------------------------------------------------------------------------------------------------------------

아치의 노래, 정태춘 Song of the Poet , 2021
한국 포크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뮤지션
영화 "아치의 노래, 정태춘"은 서정성과 사회성을 모두 아우르는 음악으로 한국적 포크의 전설이 된 정태춘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음악 다큐멘터리입니다.
1978년 ‘시인의 마을’, ‘촛불’로 데뷔한 정태춘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시적인 노랫말과 서정적인 음율로 ‘MBC 10대 가수상 신인상’을 받는 등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촉망받는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표현의 자유를 위해 가요 사전심의 철폐운동에 앞장서며 불의에 저항하는 등,
8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길목마다 시대정신이 깃든 노래들로 시대와 호흡했죠
서정성과 토속성으로 대표되는 특성으로 한국적 포크음악을 완성의 경지로 끌어올린
디스코그래피와 독보적 음색의 보컬리스트 박은옥과의 음악적 하모니가 입체적으로 담겨 있어
음악 팬들과 영화 팬들 모두에게 필람영화로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1978년 데뷔부터 지금까지 생생하게 전해지는 시대의 공기,
정태춘이 치열하게 통과했던 시대와 음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다섯번째 추천영화 "완벽한 축사를 준비하는 방법" 입니다.
예고편 보기
클릭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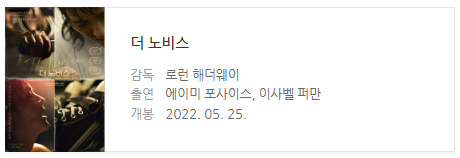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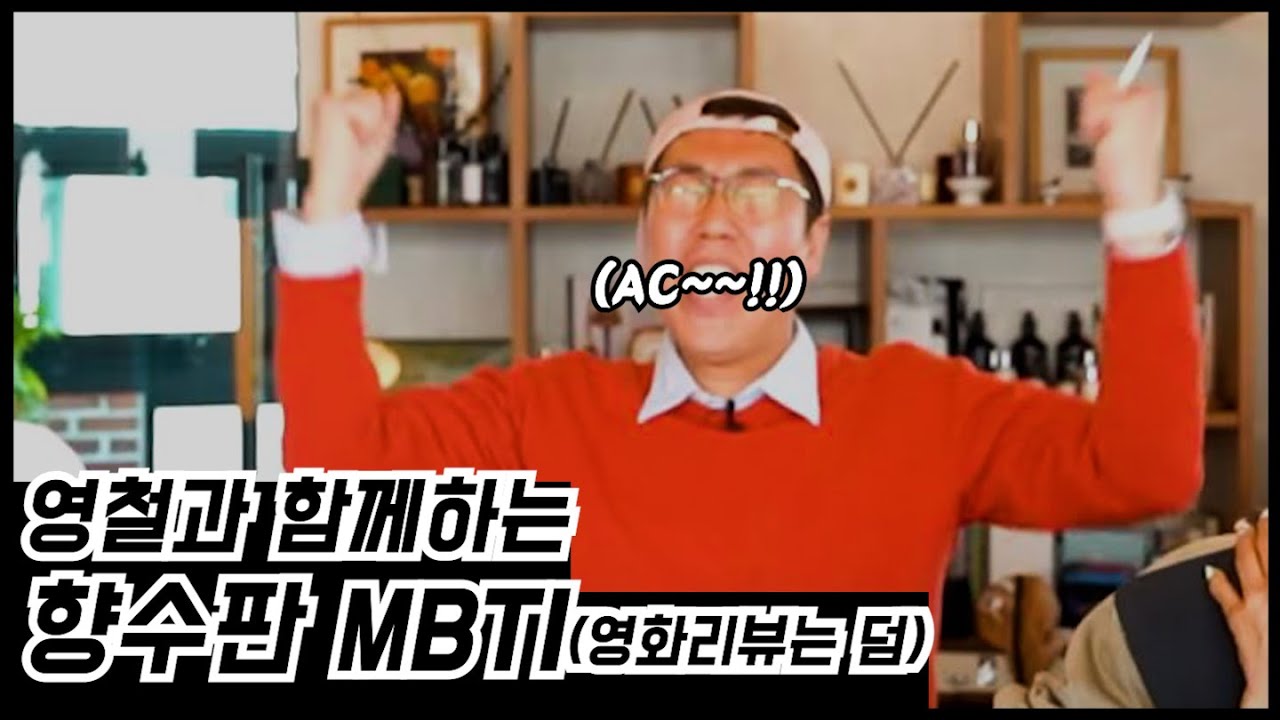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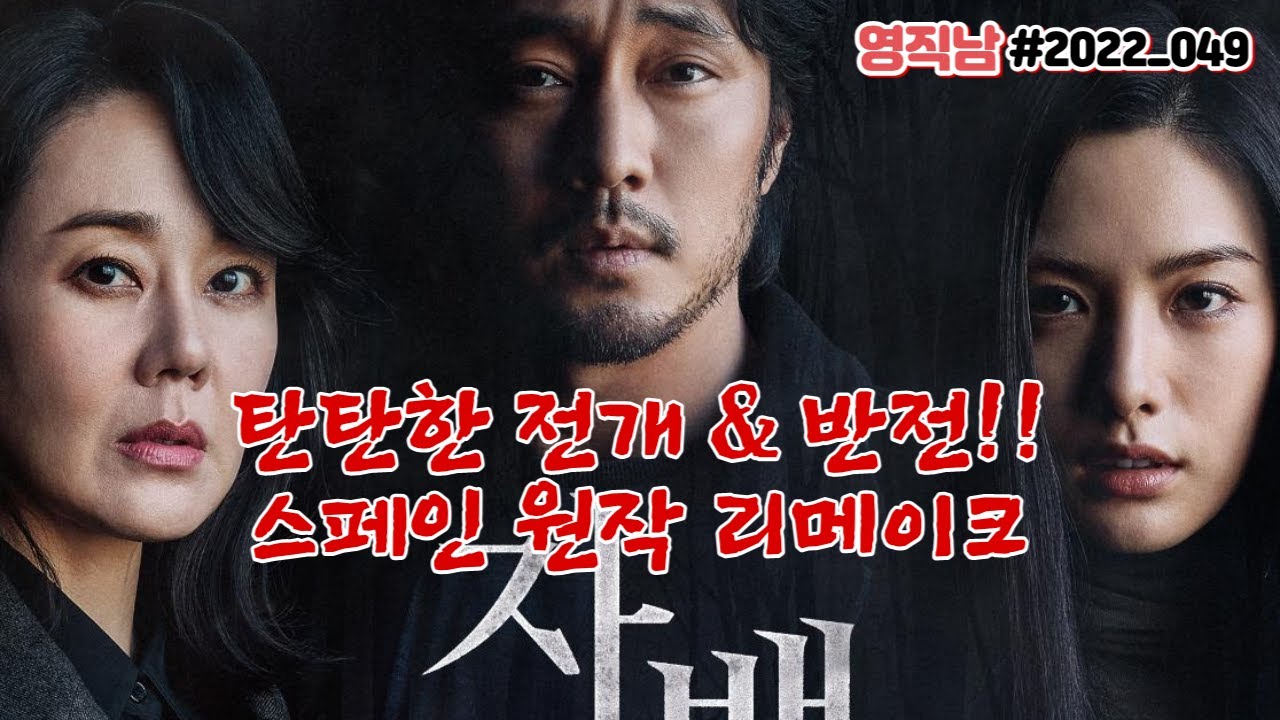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