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있을래2025-09-09 16:05:31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아녜스 바르다, 2000)에 관한 단상
아녜스 바르다, '줍기'로 결심하다

아녜스 바르다, '줍기'로 결심하다
꽤 오래된 기억이지만, 전에 이런 방송을 본 적이 있었다. '풍요롭다'고 할 수 있는 나라 미국에서 대형 마트가 마감을 하면 사람들이 폐기되는 식품들을 가져가는 모습을 담은 장면이었다.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의 몇몇 장면들처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 하루가 끝났단 이유로 마치 방출되는 듯한 수많은 식품들. 어린 나이에도 저 많은 음식물들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갔으면 어떨까싶었다.
영화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엔 계속 '줍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리고 감독 아녜스 바르다는 브루통의 그림처럼 이삭을 들었다가 과감히 내려놓고 바로 디지털 카메라를 든다. 아녜스 바르다는 '줍기'로 결심한다. 세상엔 이삭 줍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과 여전히 이삭을 줍는 사람들, 이삭이라 달리 말할 수 있는 버려진 것들을 줍는 사람들, 제도권 바깥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줍기는 각각 다른 맥락이지만, 누군가에겐 신념이기도 하다. 아녜스 바르다는 이들을 우연에 이끌리는대로, 마치 줍듯이 찍어나간다. 아녜스 바르다는 카메라로 무엇을 줍고있는가.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 속 '줍기'의 미학은 소탈하지만 아름답다. '줍기'란 버려지는 것들에서 생에 대한 열망을 찾는 일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버려진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줍는 행위로 식재료를 구하면서 어떤 재료도 버리지 않는 쉐프처럼 '줍기'란 '버리지 않음'이기도 하다. 이 영화 또한 그러하다. 아녜스 바르다가 얼마나 '버리지 않았는지'는 춤추는 렌즈 덮개의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모든 장면을 통틀어 가장 사랑스럽다. 마지막으로 '줍기'라는 행위는 어쩌면 '나눔'과 유의어인 듯 하다. 낮에는 줍고 저녁엔 문맹률이 높은 청년들에게 보수도 받지않고 어학을 가르치는 선생.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이 모습은 특별히 인상적이었다.
감독 아녜스 바르다는 우연을 따라가며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세상의 부분들을 줍는다. 그래서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는 마치 감독이 세상에서 길어올린 이삭같다. 이 영화에서의 줍기는 기본적으로 남은 것이나 버려진 것을 줍는 행위다. 폐기되는 수톤의 감자들에서, 쓰레기통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분명 자본주의 시스템 속 과잉의 산물들이다. 무절제하게 생산되는 잉여가치들은 기준에 미달하거나, 고작 몇시간 차이로 정상 품목이 아니라, 폐기품으로 변한다. 이 얼마나 차갑고 서늘한 소재인가? 영화사 속에서 최근의 <기생충>을 포함해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지적하는 수많은 걸작들의 리스트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의 위대한 점은 단 한 쇼트도 서늘하긴 커녕 오히려 따뜻하다는 점이다. 아녜스 바르다는 버려지는 것을 통해 사회를 비판하거나,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이 위대한 감독은, 카메라에 담긴 줍는 사람들처럼 그 모습들을 줍는다. 그리하여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는 주운 물건들로 만든 예술품처럼, 주운 장면들을 편집해만든 한 편의 영화임이 틀림없다.
감독 아녜스 바르다가 카메라를 통해 줍는 대상은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70대에 이이른 그녀는 곧 세상을 떠날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아녜스 바르다는 카메라 앞에 나서길, 그리고 손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육신을 들여다보길 망설이지 않는다. 노인은 점점 주류사회로부터 밀려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전히 달리는 트럭을 손가락으로 잡는 순수한 마음을 유지한 지금의 모습을 이 영화의 맥락대로 줍는 듯이 기록한다.

아녜스 바르다가 최신 디지털 카메라를 집어들때, 경량화된 카메라를 들고 세트장이 아닌 길거리로 나섰던 누벨바그 감독들을 상상했다. 인자한 웃음을 띈 할머니의 모습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젊은 것 같다. 50년 이상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70대의 여성감독이 자신의 다큐멘터리에 힙합 음악을 삽입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 것인가?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상보두앙의 이삭줍는 사람들>이다. 이 그림 속 사람들은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으나 여전히 이삭을 줍는다. 여전히 삶에 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사려깊게 담는 영화. 가끔 어떤 영화들은 이를 만든 사람이 보일때가 있다. <기생충>하나로는 봉준호가 이따금 GV나 인터뷰에서 보이는 것처럼 장난끼많고 짓궃은 소년같은 사람인지 알기 쉽지 않을 것이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보면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작품과 씨름하듯 고투하는 사람이란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는 감독의 태도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영화다. 아녜스 바르다는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같은 영화사의 걸작이나 <행복>이나 <방랑자>와 같이 서늘하기 그지없는 영화들을 만들어왔지만 인생의 후반기에도 여전히 작품 활동을 계속하며, 21세기엔 자애로운 어른의 면모를 보여준다. 나는 아녜스 바르다의 영화가 아니라 아녜스 바르다가 보고싶어질때 이 <이삭줍는 사람들과 나>를 꺼내볼 것 같다.
- 1
- 200
- 13.1K
- 123
- 10M
Comments










.jpg)
.jpg)

.jpg)
.jpg)
.jpg)
.jpg)
.jpg)

.jpg)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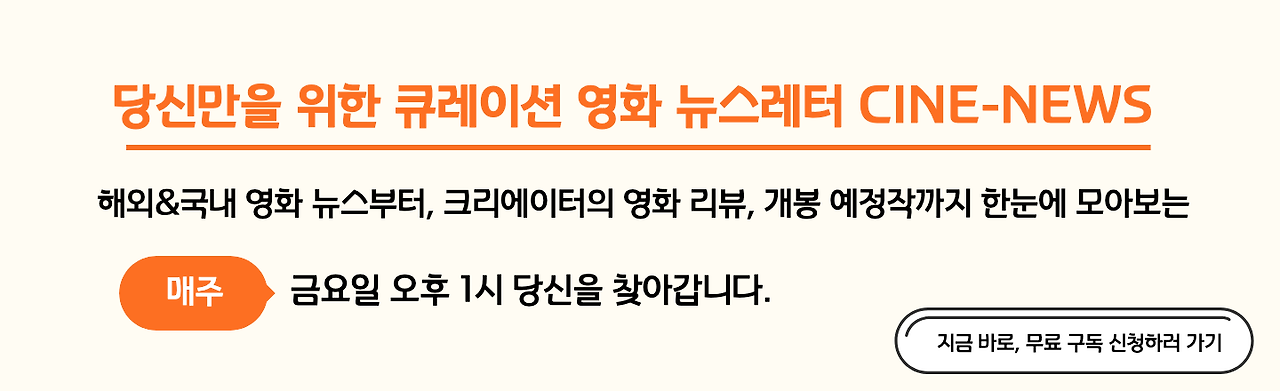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