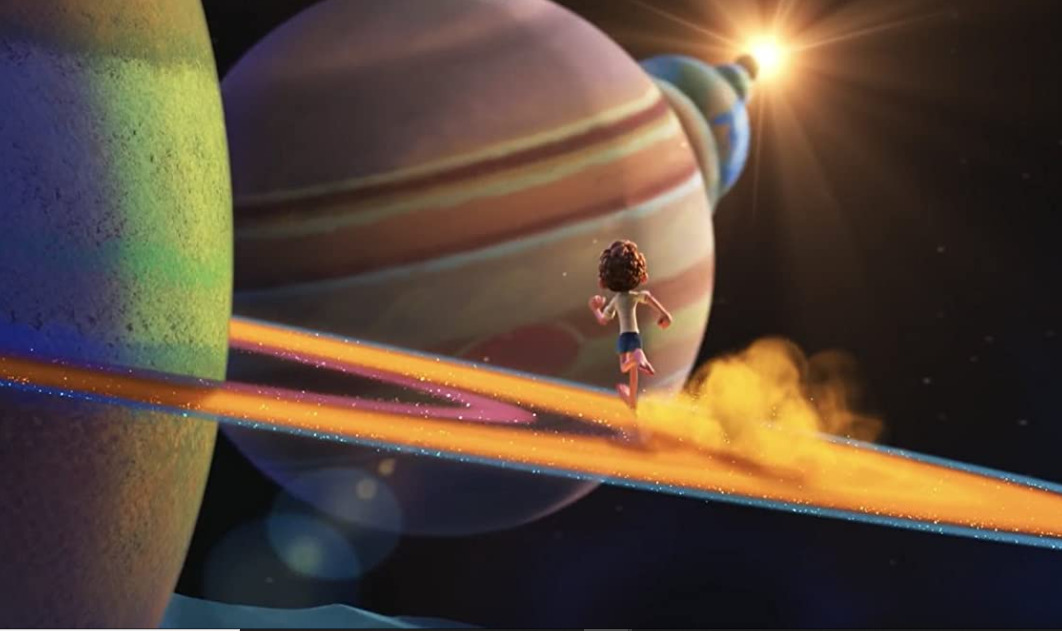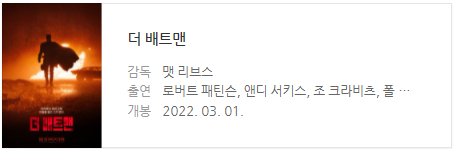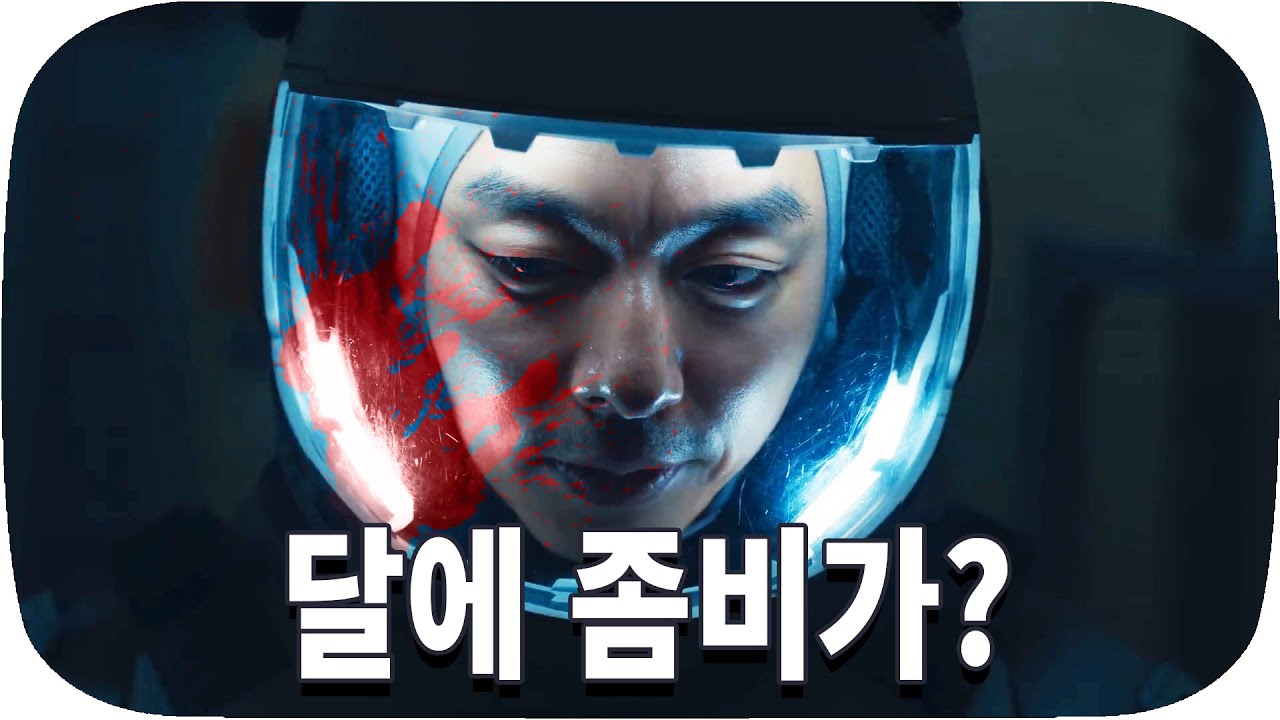선이정2022-05-25 22:25:37
불화와 불화하며
영화 <스펜서> 리뷰 (2021, 파블로 라라인 감독)
살아서도 죽어서도 파파라치와 가십의 대상이었던 프린세스 다이애나를
다룬 영화에서, 마찬가지로 수많은 파파라치와 가십에 둘러싸여 여기까지 온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연기한다. 자연히 이 영화를 기대하는 눈길은 많았지만, 과연 지금은 그 눈길에
파파라치의 시선이 없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도, '사건'을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다고는 못하겠다.

그만큼 사건이 많은 삶이었다.
사진 속 프린세스 다이애나의 미소는 지금 보아도 산뜻하다. 지금 보아도 한 컷 한 컷이 화보처럼 보일 만큼 당대 최고의 패션 아이콘이었고, 왕세자의 불륜과 영국 왕실의 '지엄한 법도'에 눌리면서도 누구보다 선명한 존재감을 보인 사람이었으며, 봉사활동을
다니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면에서는 단단한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전 세계의 열광을 받은 사람. 삶의 어느 조각을 잘라내어도 극적인 사건을 찾을 수 있을 듯한 사람.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크리스틴 스튜어트도 다르지 않다. 판타지를 결합한 하이틴 로맨스 <트와일라잇>으로 로버트 패틴슨과 나란히 인기를 끌었고, 두 사람은 반짝
스타처럼 보였다. 연기력이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고, 둘의 연애사는 지구 반대편까지 알려지는 걸로도 모자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에 친히 (그것도 몇 번이나) 언급되었다.
그러나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세간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반짝 스타처럼 보였던 이들은 (공교롭게도 둘 다) <트와일라잇> 시리즈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도, 동시에 결이 전혀 다른 작품을 파고들며 자기 자리를 직접 만들어 간다.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최근작만 살펴보아도 <트와일라잇> 때와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나 <퍼스널 쇼퍼>, 가장 최근에는 <세버그> 등 다양한 작품을 해온 (사이에 트럼프의 트위터를 방송에서 읽기도 하면서)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마침내 <스펜서>에 다다른다.
가십과 파파라치에 둘러싸인 두 존재의 만남이었다. 불화와 불화하며 걸어온 존재의 만남.

그 자리, 영화 <스펜서>는 프린세스 다이애나 삶의 어느 특정한 사건보다는, 그를 둘러싼 분위기와 감정을 공 들여 재현했다. 영화는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별장에서 왕실 식구들이 머무르는 3일을 배경으로 한다. 그 3일 동안 다이애나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보여야 하고, 가려야 한다. 시놉시스는
그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실존 인물의 삶에 대해 알려진 바에 비하면 기승전결의 낙폭이 큰
영화는 아니다. 대신 촘촘하게 나아가 감정에 사람을 가둔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보이고 무엇을 가릴지 엄격하게
정해진 세상에서 다이애나를, 뒤이어 관객을.

다이애나는 그 3일의
휴가를 시작하러 들어가는 길부터 규정을 깬다. 누구의 엄호도 받지 않고 직접 차를 운전해, 길가의 식당에서 여기가 어딘지 묻는다.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는 그 감정의 내부. 습도 90%의 무더운 날씨처럼 답답한. 여기에는 다이애나가 처한 상황 못지않게, 3일이라고 시간 배경을 딱 잘랐음에도 시간이 선형적이라 느껴지지 않는 전개 탓도 크다. 영화의 많은 장면은 현실과 다이애나의 상상을 오락가락하여,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상상인지 즉각 파악이 어렵다. 그 여부가 관객에게는 조금 지나고야 도달하게 된다. 진주 목걸이를 힘껏 뜯어버리는 상상, 고풍스러운 복도를 헐떡거리며
걸어가는 모습,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변기 앞에 고개를 숙인 마른 등뼈, 스펜서 저택에서 계단을 밟는 모습.

그런 사람들이 있다. 과거를
덧입고 현재를 사뿐 뛰어넘어 미래로 날아가 버리려는 사람. 그의 고향은 미래가 아니었을까 묻게 만드는
사람. 현재에 들어맞지 않아 불화하지만, 물리적으로 현재를
벗어날 수 없으니 미래에 속할 수도 없다. 현재에 같이 있는 이들의 눈에는 더없이 불안해 보인다. 점멸될 듯 깜빡깜빡 현재를 산다.
대신 그가 죽은 후, 그에게
미래라 불렸을 시간이 도래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먼 훗날, 그의
미래를 현재라 부르는 이들이 돌이켜보면, 그는 과거의 사람임에도 자신이 존재했던 시절에 매이지 않고
현재에까지 유령처럼 남아 부유하고 있다. 그가 날아든 미래가 바로 여기였던 것이다.
다이애나는 그런 사람이다. 잊히지
않고 미래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사람이다. 영화 <아멜리에>의 등장인물들이 계속 다이애나 이야기를 하듯이. 사후에도 그의
일부가 살아 있지만, 살아생전에도 그의 어떤 면은 유령처럼 부유할 수밖에 없었다. 영화 <스펜서>는
프린세스 다이애나를 둘러싼 사건과 가십들을 걷어내고, 그의 유령을 옷과 목걸이 아래 재생해 놓은 영화다.

그러니 다이애나가 끊임없이 유령을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는 앤 불린에게서 자꾸 자신을 본다. 오래된 방의 먼지에서는 과거의
여왕에게서 탈각된 신체 일부를 느낀다. 훗날 유령이 되는 이들만이 유령을 볼 수 있다. 과거의 유령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도 이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물리적으로
매인 몸이 시간을 유영하는 마법은 오직 마음으로만, 연민으로만 이루어진다.
다이애나가 영화 속에서 계속 거부하는 행위들은 철저하게 몸에만
속한 행위들이다. 먹기와 입기. 엄밀히 말해, 정해진 대로만 먹고 정해진 대로 입기. 대신 그는 계속해서 어디론가
움직인다. 걷고 뛰고 운전한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옆에 놓인 패스트푸드 봉지는, 그가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그가 자유롭게 움직여 구입한 물건이기도 하다. 그가 운전한 자동차처럼, 그가 뛸 때 흩날리는 모자처럼, 몸 이전에 마음에 속한 행위의 결과물인 셈이다.

유령을 보다가 유령이 되다가 하는 느낌으로, 상상과 현재를 뒤섞어서, 다이애나라는 인물은 어딘가에 갇힌다. 음습한 공기마저 담아내는 클레르 마통의 카메라, 그 습도에서도 팽팽하게
목을 옥죄는 조니 그린우드의 음악이, 갇힌 자리에 자물쇠를 건다.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다이애나에 가려졌다가, 보였다가, 반복하면서 그
자물쇠를 걸어 잠근다.
갇힌 그 자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유령을 기다린다. 다이애나의 영혼을, 미래에서 기다린 이들과 조우하게 만든다. 사실 다이애나 생전에도
정직한 애정만으로 그를 바라본 이들은 있었을 것이다. 황색 언론 너머에서 호의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이다. 샐리 호킨스가 연기한 캐릭터 매기처럼,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환상 같고 미래 같은 그런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허수아비가 입고 있던 아버지의 옷을 수선해
준 매기의 손길처럼, 어떤 애정이 다이애나의 어깨에 걸쳐진다.

다이애나가 책을 통해 앤 불린의 영혼을 소환했듯이, 관객이 갇힌 자리에 다이애나의 유령이 현재로-즉 다이애나의 미래로- 소환된다. 이것은 일종의 위령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앤 불린이 다이애나에게 한 것 같은 위로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것이다. 당대와
불화하며, 선대의 유령과 먼지에 자신을 비춰보는 존재들에게. 당신을
환대하는 마음이 미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당신은 사라져도 아주 사라지지 않는다고.
불화와 불화하며 현재를 사는, 미래에서
다시 만날 누군가를 생각하며 쓴다.
- 1
- 200
- 13.1K
- 123
- 10M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