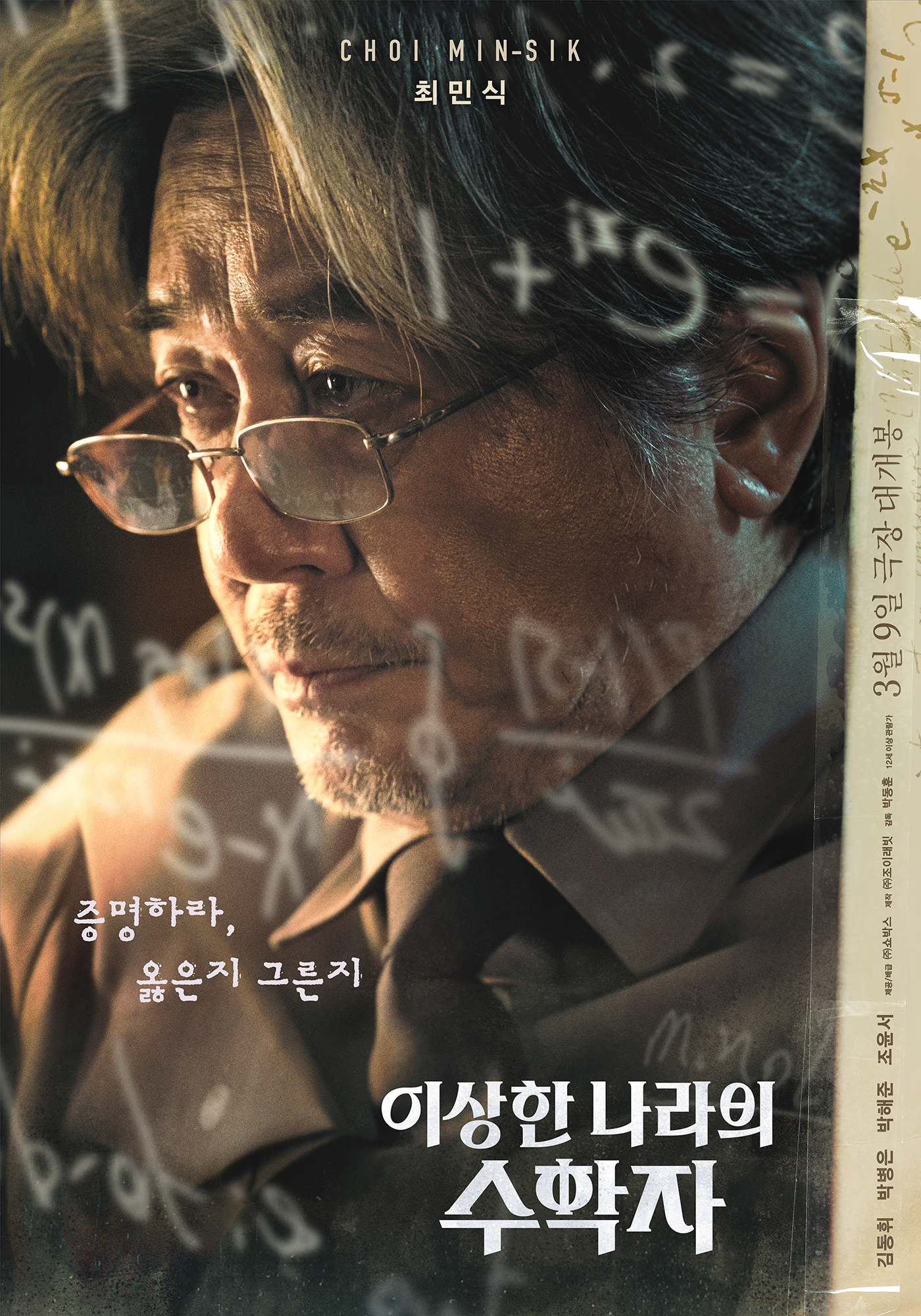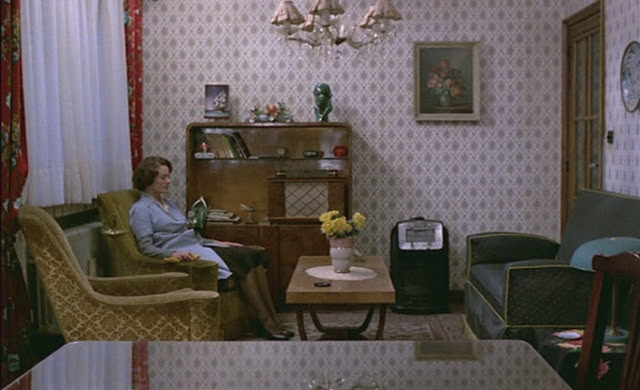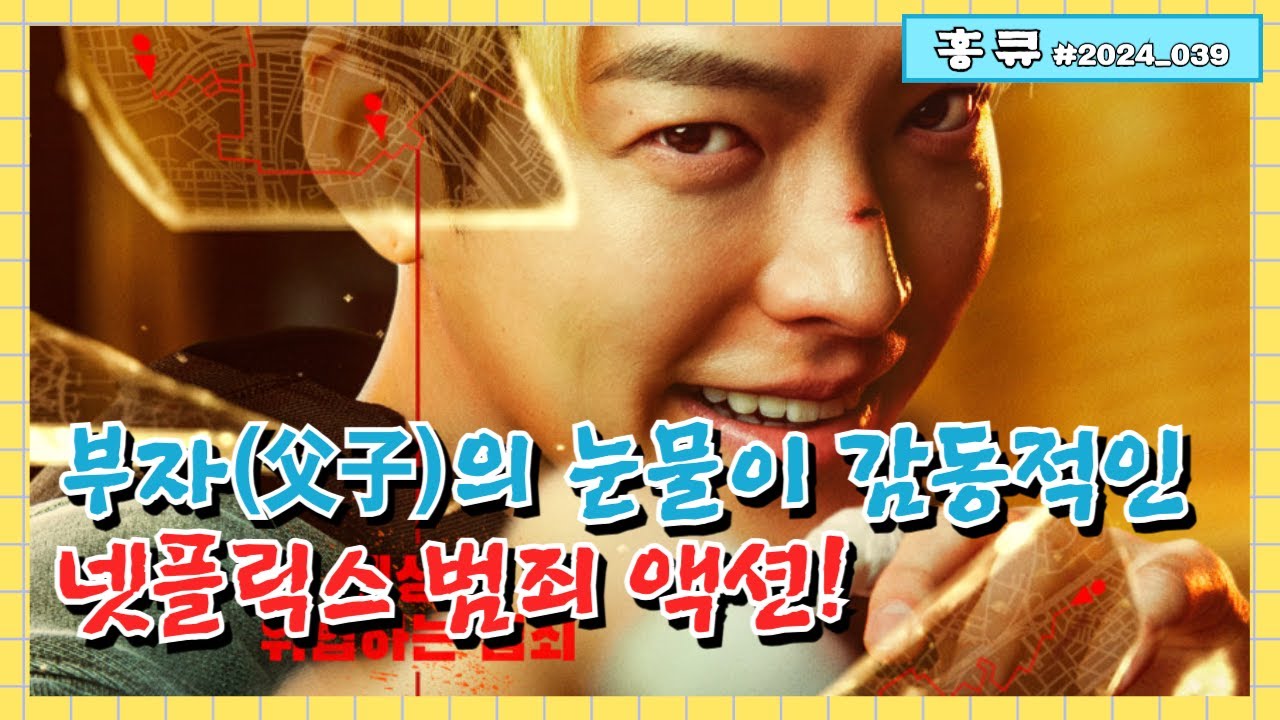선이정2023-04-02 17:57:37
슬픔 속에서도 계속된다
영화 <장기자랑> 리뷰 (이소현 감독, 2023)
올해 <타이타닉>이 25주년인가를 기념해 재개봉했다. 친구가 같이 보러 가자 했을 때 “잘됐다. 나 <타이타닉> 아직 못 봤어!”라고 대답했더니 친구는 무척 놀랐다. <타이타닉>을 안 봤다고? 물론 누구에게나 ‘아니 그걸 안 봤다고?’의 리스트가 있다. 영화인들조차 (너도나도 모두 다 본 영화로만 구성된) 매우 의외의 리스트를 갖고 있을 것이며, “왜?”라고 묻는다면 거의 별 이유 없을 것이다. 그냥 어쩌다 보니. 내게 <타이타닉>도 그렇다. 스토리가 워낙 알려져 있다 보니 어영부영 스토리를 파악하는 바람에, 다른 거 먼저 보다가… 어쩌다 보니.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스크린에 몰려드는 물을 바라보면서, 등줄기에 불안한 땀이 흘렀다. 잊고 있던 이유를 깨달았다. 처음에는 스토리를 대충 알아서 볼 마음이 크게 안 났던 것 맞는데, 어느 순간 이유가 바뀌었지. 배가 가라앉는 영화를 볼 자신이 없었어. 배가 기울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는 현실에서 보고 말았잖아. 그것도 실시간으로. 며칠씩. 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고, 밥을 먹고 돌아와서 보고. 너무 잔인하고 슬픈 형태로 목격했잖아.
그때 생각했다. 아마 이제 <타이타닉>은 영영 보지 못할 거라고. 어느덧 시간이 오래 지났고,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잊고, <타이타닉>도 조금 땀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도 보기는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내 주변에 세월호의 사고와 직접 관계된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나는 세월호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월호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생채기를 남겼다. 평이한 일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 작은 균열이 생길 때 깨닫게 된다. 살다가 문득 생명에 위협감을 느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똬리를 틀고 있던 단어가 부스스 일어났다. 슬프지만 그건 세월호 이후로 많이 회자된, 각자도생이라는 단어였다. 이 위기에서 나를 구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는 감각이, 생존 본능 바로 위에 덧입혀져 있었구나.
어떤 일들은 우리를 영원히 바꾼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그 차이는 마스크처럼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닌, 더 깊고 근본적인 데 도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부스스 들어온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월호 이전의 세상으로도 돌아갈 수 없다.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죽음, 이유 모를 사고에 우리의 일부분이 매이고 말았다. 이제니의 시구처럼 “이제 우리는 영영 아프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영영 슬프게 되었다.”
4월이 되면 이런 시구를 이불처럼 끌어와 덮었다. 언제부터인가 4월이 슬펐다. 꽃이 피고 햇살이 화사해서 더 슬펐다. 툭 건드리면 눈물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을 시로 끌어 덮으며 4월을 보내는 습관이 생겼다.
그건 슬픔도 아니었구나. <장기자랑>을 보면서, 솔직히 한번씩 숨이 턱 막혔다. 영화는 즐겁고 유쾌한 순간들을 많이 담았고 슬픔을 주목하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짙은 슬픔이 읽힌다.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볼 길 없는 나로서는, 영영 낫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건 저런 거구나 하고 그 슬픔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가 나오지 않는, 슬픔의 장면들을 제외한 영화여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느껴진다. 슬픔은 배경처럼 존재하고 그 위에서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이.
슬픔에 아둔한 나로서는 이제야 숨이 막혀오는 그 마음을, 어떤 이들은 일찍이 헤아리고 진작에 움직였다. 엄마들을 방 밖으로 끌어냈다. 어느 날 갑자기 유가족의 자리에 놓여 슬픔 외의 감정과 사건을 너무 많이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폭우처럼 맞은 후에 앓기 시작할 때. 이들은 방 밖으로 나왔다. 커피를 배우고, 서로를 만나고. 그러던 중 연극을 해보겠냐는 말에, 어영부영 고개를 끄덕였다가 연극이 시작된다.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듯, 진짜 “너무 하고 싶어! 꼭 하겠어!”보다는, 애써주는 사람에게 미안해서… 혹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같은 이유로 연극은 아슬아슬 계속된다.
연극은 아이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여정으로 시작됐다. 여전히 “누구 엄마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서 무대를 포기할 수가 없다. 무대에서는 밝고 사랑스러운 연기를 잘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잘) 해내는 엄마들이지만, 무대 뒤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은 감정들이 몰려온다. 그래도 엄마들은 아이들을 기억하며 힘을 낸다.
영영 아픈 단어로 남아버린 ‘수학여행’이라는 단어를 무대에서 다시 꺼낸다. 아이들이 도달하지 못한 그 섬에 이르러, 어쩌면 가장 아팠을 말들을 입 밖에 낸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입던 옷을 입고, 아이들이 좋아했던 피규어와 봉제 인형을 어루만지며 그 옷도 입어 본다. 아이들의 자리에서, 아이들이 사랑하던 것들의 자리에도 서 본다. 그렇게 타인의 자리에 서 보면서, 같이 극을 만들어간다.
평범한 극 영화처럼, “예술이 주는 치유력”을 만끽하며 “손 맞잡고 해내는 경험으로 성장”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엄마들은 연극을 하면서 변해 간다. 아이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만 어루만지던 엄마들은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함께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사람마다 그 농도는 달라서, “그냥 나는 멋지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라는 말도 함께 품고 무대에 오르는 엄마도 있다. 이미 배우의 마음으로 배역 욕심을 내고, 경쟁하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서운해하기도 한다. 그 모습이 상큼하고 사랑스럽고 유쾌하다. 제각기 다른 농도와 감정들을 다양하게 품고 무대에 오르지만, 이들을 근본적으로 묶었던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두 줄기 강처럼 두 마음이 흐른다. 하나는 빈 자리를 영영 되짚으며 살아가는 마음,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마음. 통상적인 극 영화였다면 아마 전자로 시작해 후자로 나아가며 끝났을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씩씩한 걸음을 내일로 옮겨 가도, 어제의 슬픔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유가족’에게 기대하는 표정은 얼마나 일관적으로 납작한가. 사실 그 어떤 사고 이후라도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밝은 얼굴로 무대에 오르는 모습과 무대 뒤에서 긴장과 눈물을 삼키는 모습, 덤덤하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돌아서서는 자기 불안을 발견하는 모습이 첩첩 공존하면서.
앞으로도 오래 아프고 계속 슬프겠지만, 이 연극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다음 작품은 어떤 결을 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끌어안고 손 맞잡고 인사하면서 무대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봄이 돌아오고, 아이의 생일도 돌아온다. 여전히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고, 아이들이 좋아하던 과일을 기억해 본다. 슬픔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 이 영화처럼 사랑스러운 모양새로. 다음에는 이 배우 분들의 밝은 얼굴을 실제 무대에서 보러 가야겠다. 그땐 나도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한 표정으로 객석을 채우고 싶다.
*씨네랩의 초청으로 시사회에서 감상 후 솔직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1
- 200
- 13.1K
- 123
- 10M








.jpg)
.jp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