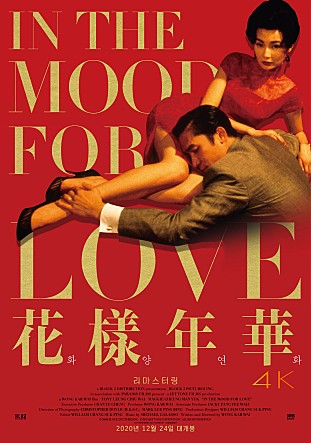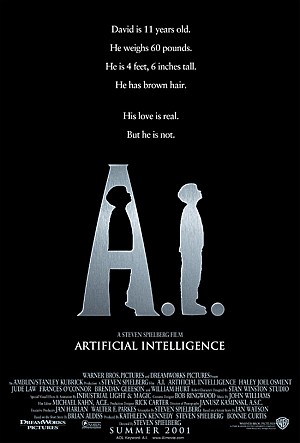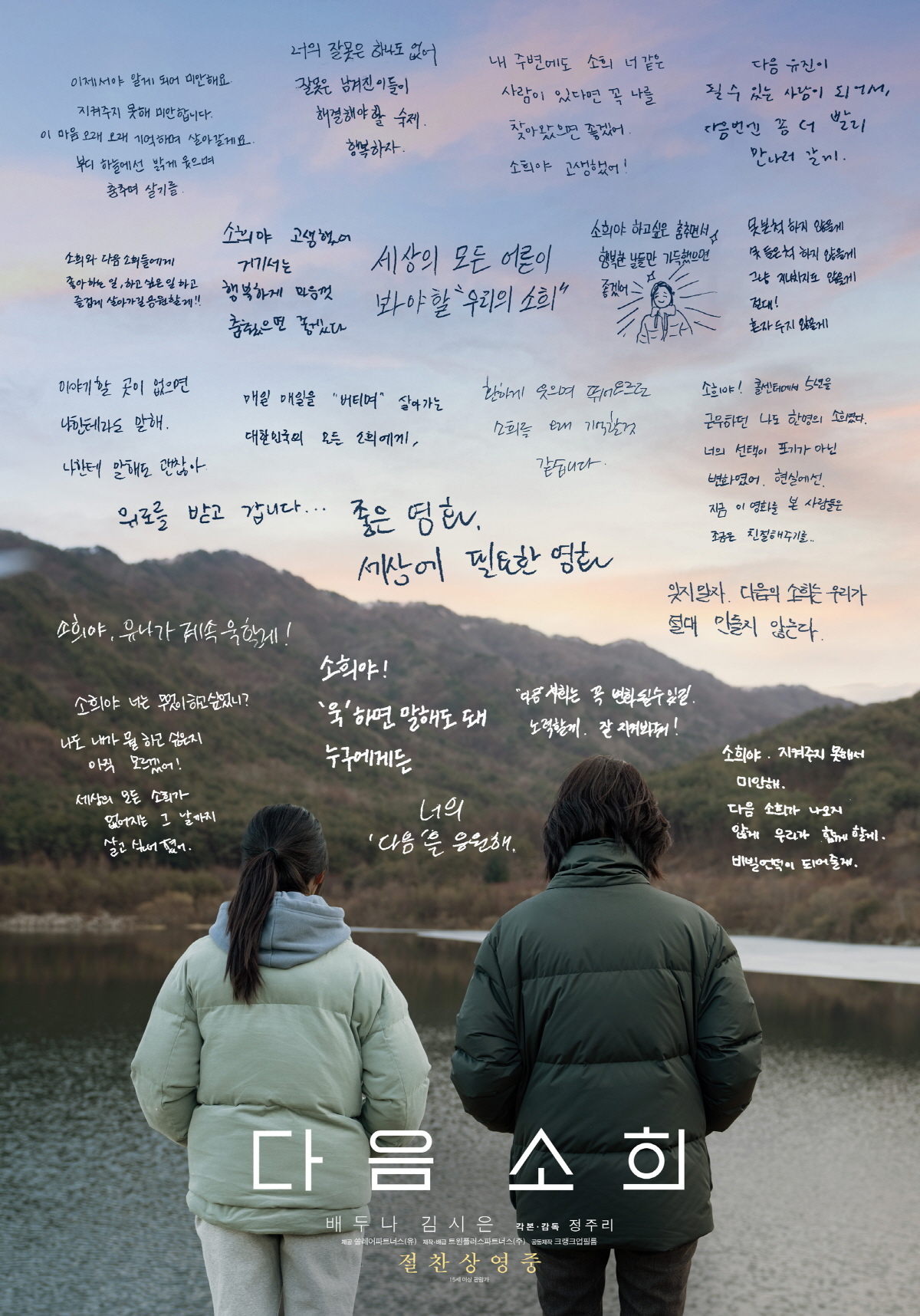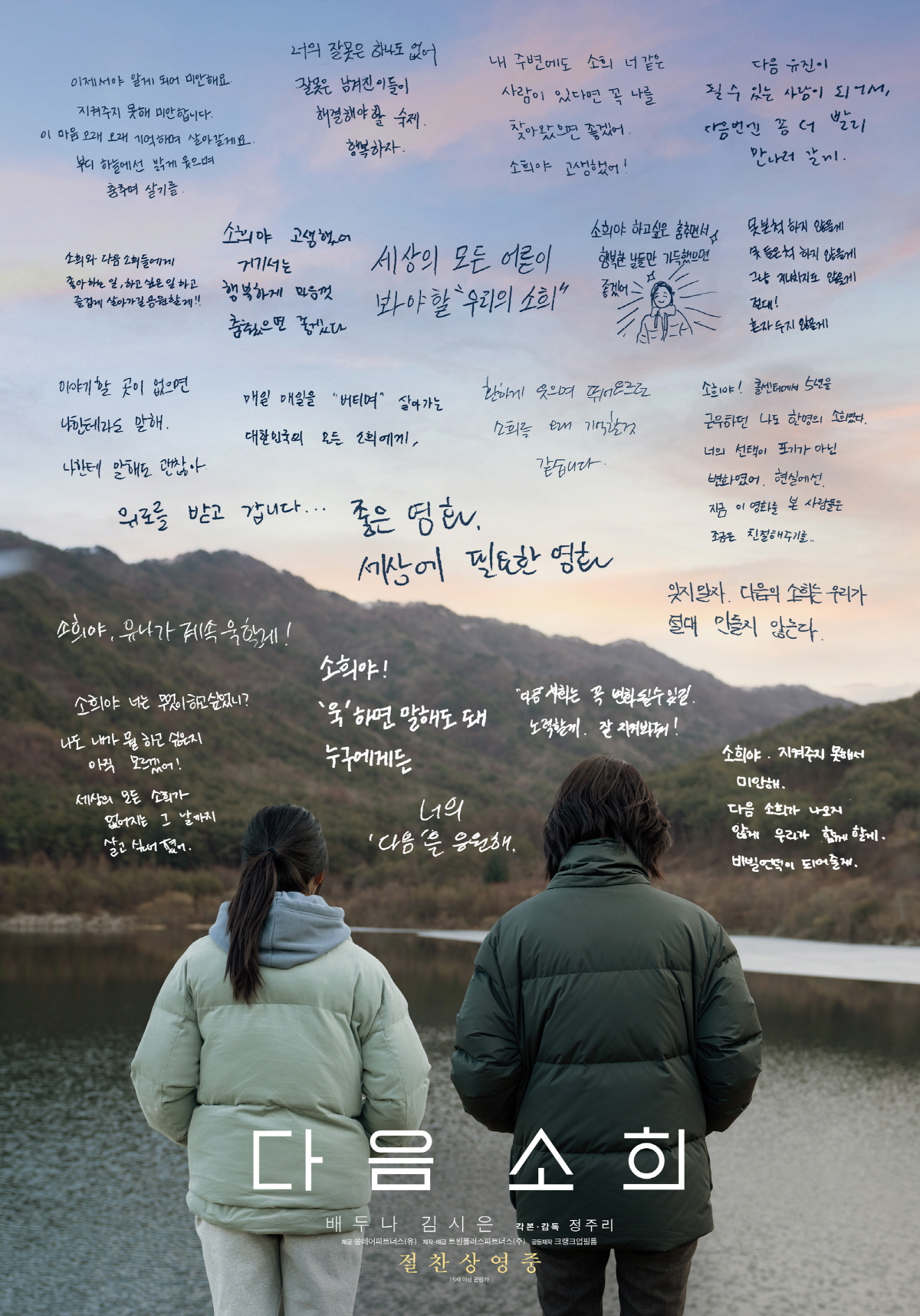선이정2021-03-25 00:00:00
우리는 계속 걸어가겠지만
영화: 라스트 레터(2020, 이와이 슌지 감독)
내게 <러브레터>는 겨울날 아득히 보이는 오두막, 불 밝힌 창문 같은 영화다. 보는 것만으로도 추운 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다. 인물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고 느껴서 그렇다. 이츠키에게는 언젠가 반짝이는 사랑을 받았던 기억, 히로코에게는 있는 힘껏 후회 없이 사랑한 기억. 그 힘을 이따금 떠올리며 잘 살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 마음도 그런 힘을 찾고 싶어 자꾸 들여다보는 건지도 모르겠다. 찬 바람 불면 한번 보고, 겨울 깊어가면 또 보고, 겨울 다 가기 전에 아쉽다고 본다. 더운 여름 날도 눈발 내리는 풍경이 그립다고 보고, 문득 떠올리면 아무 때나 본다. 그 버릇이 10년도 넘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봐서, 아는 사람들의 옛 사진 앨범을 보는 기분이 든다. 가본 적 없는 공간임에도 가본 듯이 그려보게 되고, 만져본 적 없는 옷의 촉감까지 생생하다. 동시에 딱 그만큼 멀기도 하다. 성에 낀 유리창 너머 들여다보이는 오두막 내부 풍경은 결코 닿지 않듯이. 내쉬는 내 숨결에 성에만 더 짙어지듯이.
그러던 차에 또 한 번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이번에는 <라스트 레터>다. 다시 한번, 편지의 마법에 걸리고 만다.

제목에서 예상되듯이 이 영화는 편지를 타고 흘러간다. 언니 미사키의 장례식을 마치고, 유리는 조카 아유미에게 편지봉투 하나를 건네받는다. 동창회 초대장이다. 언니의 부고를 알리려고 참석한 동창회 자리에서 동문들은 유리를 미사키로 착각한다. 그 시절 모두가 사랑했던 미사키, 오랫동안 보지 못한 미사키를 모두가 반가워한다. 유리는 차마 언니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곧 철거될 학교 건물 사진을 보고, 정리하다 발견했다는 테이프 속에서 졸업생 대표 인사를 읊는 미사키 목소리를 들으며 유리는 먼저 자리를 뜬다.
그런데 동창회 장소에서 누군가 유리를 따라 나온다. 유리가 좋아했던, 미사키를 좋아했던 쿄시로. 자신을 미사키로 알고 있을 쿄시로에게 유리는 편지를 한 장 남기고, 두 사람은 편지로 재회를 이어간다. 그러던 중 편지 하나가 미사키의 딸 아유미에게 닿으면서, 이들 모두는 편지를 통해 지금은 죽고 없는 미사키를, 그리고 그 시절의 마음들을, 각자의 오늘을 훑기 시작한다.


잘못 전달된 편지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시놉시스만 보아도 <러브레터> 냄새가 난다. 감독은 아예 이 영화가 <러브레터>의 쌍둥이 영화라고 직접 밝혔는데, 곳곳에서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한겨울 눈밭의 추도식으로 시작하는 <러브레터>와 빛 고운 여름날 장례식으로 시작하는 <라스트 레터>, 학교의 사진을 찍는 장면, <러브레터>의 이츠키처럼 <라스트 레터>의 유리도 도서관에서 일한다는 점 등등. 편지가 잘못 닿는 오래된 집의 분위기도 비슷하고, 교복 입은 회상 장면과 현재가 교차한다는 점도 겹친다.
<러브레터>뿐이 아니다. 소위 '화이트 이와이'로 대변되는 영화를 모조리 담은 종합 선물세트 느낌이다. <4월 이야기>에서 선배가 좋아 '사랑의 기적'을 만들었던, 배우 마츠 다카코가 유리 역을 맡았다. 도서관에서 일하며 선배를 좋아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얼굴에서, 서점을 서성이다 빨간 우산 아래 말갛게 웃던 얼굴이 절로 떠오른다. 유리의 딸 사야카와 미사키의 딸 아유미가 함께 있는 모습에서는 어쩐지 <하나와 앨리스> 느낌도 난다. 연락처를 주고받는 SNS는 <립반윙클의 신부>에서 사용된 가상 SNS 플래닛이다.

다만 <러브레터>에서 한 발짝 달라진 점은, 오타루까지 가서 이츠키를 만나지 못하고 뒤돌아섰던 히로코와 달리 쿄시로가 로드무비 느낌이 들 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 모로 히로코와 다르다. 끝의 끝까지 사랑에 최선을 다했던 히로코와 달리, 미사키와의 관계에서 일찌감치 물러나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츠키의 기억을 편지로 받았다가 되돌려준 히로코와 달리, 그는 미사키의 기억을 아예 <미사키>라는 제목의 소설로 펴내기도 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첫사랑에 매여있다는 점에서 남자 이츠키를 떠올리게도 한다. 어떻게 보면 남자 이츠키의 순정은 그의 죽음으로 박제되고 완성된 것이기도 하기에, 처음에는 쿄시로가 미사키의 기억을 되짚어가는 과정을 의구심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미사키> 이후 어떤 소설도 더 쓰지 못한 소설가라서 더욱 그랬다. 자신의 이야기를 위해 미사키를 찾는다면 그 또한 사랑일까? 더 이상 손 닿을 수 없는 사랑을 찾아다니는 그의 마음은 사랑일까 아니면 소재에 대한 집착일까?


영화를 보는 내내 그의 마음만큼이나 내 비뚜름한 시선도 흔들렸으나, 끝내 미사키의 영전에 선 그와 함께 눈물을 떨굴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25년이나 지난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면 믿겠느냐는 질문은 미사키가 아니라 관객에게 던진 것인지도 모른다. 순정이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순정을 더 믿지 않게 될 뿐이다. 십대 때 이와이 슌지가 '영원한 십대들의 내부자'라는 말을 어디선가 읽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십대들의 내부자가 아니게 되어버린 나는 이제 오랜 사랑 앞에 의구심부터 던진다. 하지만 그는 변치 않았다.
단순하지만 잔잔하게 마음을 파고드는 피아노 선율에, 어쩐지 눈물 날 듯 아름다운 빛. 이전과 똑같은 도구들로 이와이 슌지는 순정을 말한다. 늘 그랬듯 마음을 선물처럼 곱게 담아 전한다. 마음을 담은 상자가 편지일 때도, SNS일 때도 있지만 도구가 어떻든 늘 순정을 간직한 채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상자의 모양이 바뀌어도, 그 안의 것들은 세파에 좀먹지 않고 아스라이 빛난다. 그래서 그의 편지에는 여전히 힘이 있다.

그의 순정에는 한 세월이 묻어 있다. 그의 영화 속 십대들이 애틋한 이유다. 지금 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갛게 웃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는 우리로서는 애틋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순간의 설렘, 사소한 일상 뒤에서도 삶과 죽음은 아른거리고 있다는 진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잊고 사는 사실을 일깨우기에. 이런 점에서 <라스트 레터>는 분명 그의 전작들에서 직선으로 이어진 연장선이다.



그 연장선에서 뜻밖의 한 걸음을 내딛는다. 이후의 이와이 월드가 어떤 색깔로 펼쳐질지 기대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러브레터>에서 이츠키/히로코와 아키바를 각각 맡았던 나카야마 미호와 토요카와 에츠시가 출연하는데, 한때 이야기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의 얼굴을 빌어서 하는 말이 의미심장하다.
잠시 눈을 의심해야 할 만큼 폭삭 늙은 토요카와 에츠시의 얼굴로, 조금은 지치고 피로한 나카야마 미호의 표정으로, 두 사람은 말한다. 이야기는 이야기고 현실은 현실임을. 인간은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피아노 선율과 고운 빛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먼 이야기를, 온갖 세파에 지치고 닳아버린 얼굴로 건넨다.
그래서 내게는 이 작품이 소위 '화이트 이와이'로 분류되던 영화들에게 안녕을 고하는 작품처럼 느껴진다. 오래 전의 그들에게 인사를 건넬 기회를 준 느낌. 과거가 아닌 앞을 보고 나아가기 위해 가장 아름답게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하나 기억을 포개 놓은 느낌이다.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다정하게 말하는 느낌이다. 미사키의 기억을 되찾은 쿄시로에게, 비로소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를 한 아유미에게, 그의 영화를 내내 돌아보며 살아온 관객인 내게도.

영화가 시키는 대로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넨다. 지금은 잃어버린, 만날 수 없게 되어버린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기억을 고이 갈무리한다. 이제 그 자리를 과거에 내어주고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오랜 세월 꾹꾹 담아둔 향기로운 마음이라고 해도, 불가능에 가까운 순정을 누군가의 죽음으로 얼려 잡아두었다 해도, 그 마음은 오래된 편지처럼 접어두어야 할 것이다. 나는 오늘을 뚜벅뚜벅 살아가야 할 것이다. 잘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의 순정은 다정한 유리창처럼, 자꾸 돌아보고 싶게 만든다. 기억의 시공간은 돌아봐도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걸어가겠지만, 또 계속 돌아볼 것이다. 아직은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슬프고 두렵지만은 않다. 사랑의 잔상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따뜻하게 불 밝힌 유리창으로 존재할 테니.

- 1
- 200
- 13.1K
- 123
- 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