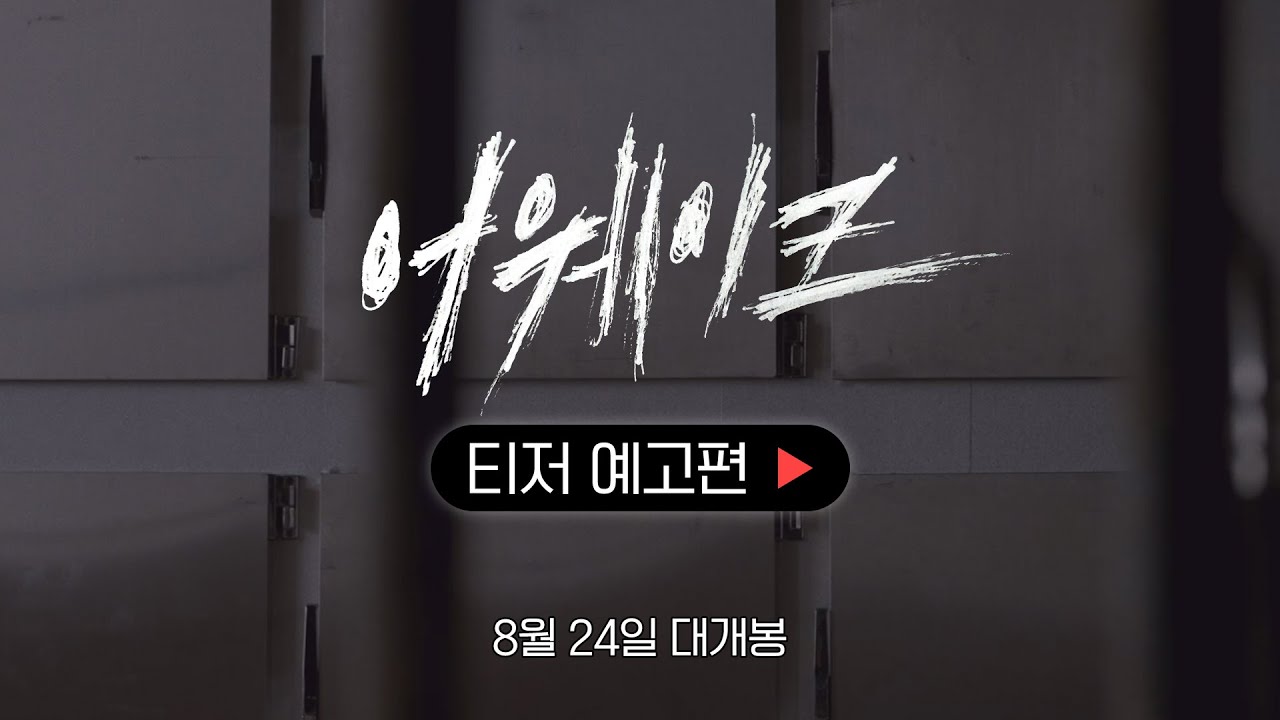양남규2024-06-21 20:17:59
[1초앞 1초뒤] 너와 나의 시간이 다르더라도
영화 [1초앞 1초뒤] 시사회를 다녀오다

작년 여름? 한창
소설에 흠뻑 빠져 있었을 때, 30분 단위로 시간이 빠른 남자와 반대로 시간이 느린 여자가 어떤 거대한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구상해보려 한 적이 있다. 시간이 다른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과제여서 그냥 아이디어로만 남겨두었는데,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오래된 편지처럼
이 영화가 찾아왔다. 일본 공상과학 영화 특유의 개구쟁이 같음과 독특한 상상력이 가미된 ‘참 일본스럽네에~’ 영화였다. 내가
리뷰를 남기지 않는다면, 아마 많은 분이 이 영화가 상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갈 법한 그런 영화였다. ‘썸머는 필름을 타고’, ‘리틀 포레스트(일본판)’같은 느낌도 아주 살짝 묻어 있는 것이 꽤나 귀여웠다. 특히나 니콘 카메라부터 계속해서 울리는 셔터의 찰칵! 소리까지, 평소 필름 카메라나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꽤나 즐겁게 관람할 영화다. 아쉬움이라면, 내가 교토를 여행해 보지 못해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소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영화적으로 아쉬움은 없었다.
오히려 너무 로맨스를 희망하면 실망하실 영화다. 이건 영화사나 배급사에 좀 미안하지만, 이 영화는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맥주 한잔하면서 보면 안성맞춤일 영화다. 맥주가
아니라면, 머나먼 교토를 느낄 수 있는 교토 특산 사케나 하이볼도 괜찮을 것 같다. 배경 자체는 불꽃놀이, 푸르른 나무, 따사로운 바닷가, 수박과 아이스크림 등 여름으로 가득 차 있다. 굳이 여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영화 곳곳에 작지만 강렬한 암시를 배치해, 나도
모르게 여름이란 계절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일본 여름 영화 하면 떠오르는 클리셰와 비운의
여주인공에게 불어닥치는 뻔한 운명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 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지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쓴맛이 아닐까? 상영 내내 달콤한 솜사탕을 먹는 기분이지만, 체하지 않게 미지근한 할머니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같았다.
이건 나만의 편견일지 모른다. 유독 최근 일본 영화는 시점에 대한 자유분방함을 잘 표현하는 것 같다. ‘괴물’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일부의 시선을 갖고 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슬픔을 내비치며 말해준다. 전국제에서 관람한 ‘새벽의
모든’은 방향이나 전혀 다른 두 혜성이 마주치는 시선을 따숩게 담았었다.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남자 주인공의 시선으로
우리는 알 수 없는 특이한 경험을 한다. 그런데 이 경험은 누구나 겪어 본 적 있는 익숙한 감각이자
추억이다. 왜 그런 적 있지 않나?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
저녁이었다든가, 하루가 사라진 듯 다시 아침인 경험을 말이다. 나는
분명히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겨우 3-4시간밖에 흐르지
않은 체험 말이다. 마치 온 세상이 멈춰버리고, 나의 시간만이
하염없이 흘러간 몽롱한 느낌 말이다. 영화는 발칙한 상상력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추억이나 기억을
부드럽게 긁어준다.

평소 너무 빠르게 살아가는 남자 주인공, 너무 느긋하게 살아가는 여자 주인공은 사실 마주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설령 만난다하더라도 속도가 붙은 남자는 더 빨리 미래로 갈 것이고, 상대성 이론에 따라 여자의 시간은 더 느려질 것이다. 마치 당신을 찍기 위해 셔터 버튼을 누른 순간, 필름을 통과해 버린 빛처럼 말이다. 숫자로 셀 수 없이 무한한 빛은 이미 우리 존재가 태어나기 이전에 만들어진 과거의 유산이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태양도 사실상 옛날의 태양인 것처럼 말이다. 종종 영화 ‘인터스텔라’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와 동일하다. 너무 빨라서, 너무 늦어서 어긋나버린 두 주인공을 이어주는 것은 몇 장의 사진이다. 사진 안에 담긴 우주의 메시지가 광활하게 펼쳐진 시공간의 제약을 뚫고 둘을 동시에 통과한다. 과학 이야기를 더 하자면, 최근에 유튜브에서 ‘관계론’으로 세상을 정의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과 내가 일말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는 서로 존재한다. 반대로 내가 만나지 못한, 예를 들어,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그와 나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도 관계론에 적용할 수 있다. 옷깃을 스치는 순간, 그 전에 내가 당신을 그리고 당신이 나를 마주 보는 상황에서 우린 또 다른 차원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영화는 전혀 만날 것 같지 않은 시공간에 살고 있던 두 사람이 처음부터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일본의 전설처럼 두 사람은 이미 붉은 실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지만 아직 셔터 속도나 조리개
조정값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정말 조금, 머리카락 사이즈를
움직여도 결과물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이 사진이다. 그래서 사진을 좋아한다. 이미 지나가 버려서 다시 탈 수 없는 버스나 머릿속 지우개가 지워버린 사랑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진들 모두 우연의 일치로, 여러 번의 우연이
만든 아름다운 운명이자 인연의 작품이다. 시간이 반대로 흐르는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확인한 것과
달리, 전혀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던 남녀가 몸이 바뀌는 것과 달리,
영화는 사진에 담긴 사랑을 통해 운명을 이어 붙인다. 그 과정에서 배우들의 행동이나 표정, 개그 방식이 꽤나 귀여웠다. 역시 여름에는 오펜하이머처럼 묵직한
삼계탕이나 벌컥벌컥 들이켤 수 있는 달큰한 하이볼 같은 영화가 제격이다.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