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2025-03-25 12:13:55
숨 막히는 ‘우리의 시간’
<소년의 시간>(2025, 필립 배런티니)

동급생 여학우 케이티(아멜리아 홀리데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13세 제이미 밀러(오언 쿠퍼).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 왜 제이미는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되었을까? 불쾌한 데이트 신청의 거절로 루저 프레임을 씌운 여자아이의 잘못일까, 죄책감 없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에 대한 화를 비정상적인 장식으로 분출하는 남자아이의 잘못일까. 그저 방관하고 놀림에 동조한 아이들의 잘못, 혹은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알아채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일까. 사건을 파헤치며 전개되는 시리즈 <소년의 시간>(2025, 필립 배런티니)는 “왜?”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며 현 사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조명한다.
숨 막히는 현실 체험, 롱테이크
약 60분의 러닝타임인 한 회를 각각 원테이크 기법으로 촬영하였다. 왜 굳이 원테이크로 촬영했을까? 인물의 1시간을 그대로 따라간다. 관객으로 하여금 숨이 턱 막히게 만든다. 캐릭터가 60분간 겪는 상황을 그대로 따라가며 관객은 타인의 삶을 ‘체험’하게 한다. 극중 인물과 같은 시간의 흐름을 겪는 것, 실시간으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현실감’을 표현하기에 원테이크는 그 어떤 연출 기법보다 효과적이다. 이것이 한 회당 3주씩 런쓰루를 하는 불편함에도, 흐름상 피해자에 대한 추모를 생략하는 아쉬움을 느낌에도, 롱테이크를 고집한 이유일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소년의 ‘시간’을 통해 문제의식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베일을 벗은 사건
담당 형사(애슐리 월터스)의 아들이 던져준 ‘인셀’이라는 단서로 사건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인셀이란, 비자발적 순결주의자로, 연애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성소외자들을 칭하는 신조어이다. 이성 관계를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성과 사회 탓으로 돌리는 이성애 남성을 칭한다. 아이들은 이모지만으로 많은 의미를 표현한다. ‘강낭콩 이모지’는 대개 여성 혐오 사상을 가진 자신을 인셀로 규정하는 사람들을 칭하고, ‘100’이라는 이모지는 80:20 법칙이다. 80프로의 여성이 20프로의 남성에게 끌리다는 법칙으로 나머지 남성들은 여성들을 속여야 만날 수 있다는 것. ‘빨간 알약 이모지’는 <매트릭스>에서 따온 것으로 ‘젠더 장치의 진실에 눈을 뜨다’라는 의미, ‘다이너마이트 이모지’는 빨간약이 터진다는 의미로 인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칭한다. 4화, 철물점에서 젊은 남성이 에디 밀러(스티븐 그레이엄)에게 은밀하게 당신을 지지한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크라우드 펀딩을 올려 보라고 넌지시 말한다. 그만큼 인셀은 널리 퍼져있다. 학교를 찾아간 두 수사관은 “배우는 것이 있나?”라고 말한다. 모두가 영상강의로 대체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서로를 갈라서며 혐오한다. 시대가 변하며 기술의 발전으로 익명성 기반의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의 현실이다. “냄새난다.”라는 말에는 사춘기 학생들의 냄새뿐만 아니라, 혐오와 몰이해가 난무하는 끔찍한 냄새라는 중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제이미 밀러의 인셀적 사고는 3화에서 베일을 벗는다. 스탠들링 청소년 보호 훈련 센터에 수감된 제이미는 객관적인 심리적 소견을 위해 방문한 여성 심리학자 브리오니 아리스톤(에린 도허티)과 앉은 사각 테이블에서 본색을 드러낸다. 자신이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 모든 질문에 ‘왜’ 그런 걸 묻느냐고,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태클을 건다.
제이미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남자다움’과 ‘성’이다.
축구장에서 활약하지 못하고 골키퍼, 즉 깍두기 역할을 하는 제이미에게 실망한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등 돌린 아버지 이야기, 상반신 사진이 노출된 케이티가 연약해진 틈을 타 연애 기회를 노렸지만 모욕적으로 거절당한 것을 언급한다. ‘80:20의 법칙’,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바닥친 자존감, 모든 문제를 여성과 사회에 돌리는 사고를 가진 제이미는 자신이 80프로에 속한다고 생각하였고 거절당한 분노를 참지 못해 결국 케이티를 살해했다. 앞선 수사에 남성 경찰관에게는 꼼짝 못 하던 제이미가 여성 심리학자 앞에선 폭력적으로 돌변한다. 심리학자가 얼어붙자, 고작 13살에게 겁을 먹어서 자존심이 상하냐고 비아냥대기까지 한다. 극심한 열등감에 지배된, 강약약강의 비틀린 사고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소년의 시간에서 나아가 우리의 시간으로
사건 발생 이후 남겨진 가족들은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낙인과 제이미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잠식되지 않으려 무던히 애를 쓴다. 부모는 의젓한 딸 리사를 보며 말한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애를 만들었지?” “제이미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좋은 부모였어,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만들었잖아.”
그 누구도 주된 원인이 아니고, 그 누구도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모르는 사이 개개인의 악이 모여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깊게 병들어버린 사회. 지나친 극단주의는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특히 익명성에 기대어 끝도 없이 확장하는 현재의 소셜 미디어는 뿌리 깊은 갈라치기와 대 혐오의 시대를 만든다. 이것은 소년의 시간이지만, 우리의 시간이기도 하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소년의 시간에서는 ‘인셀’을 다루었지만, 사실 훨씬 더 많은 카테고리의 사회적 문제가 세상을 지배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소년의 시간>에선 답하지 않는다. 관객으로 하여금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스스로 생각하도록 한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 1
- 200
- 13.1K
- 123
-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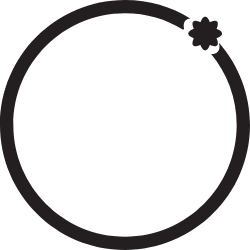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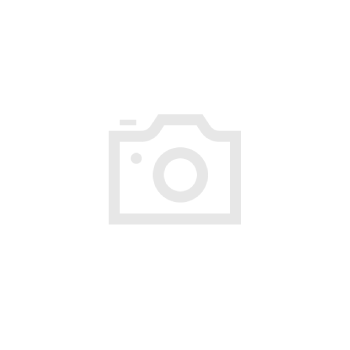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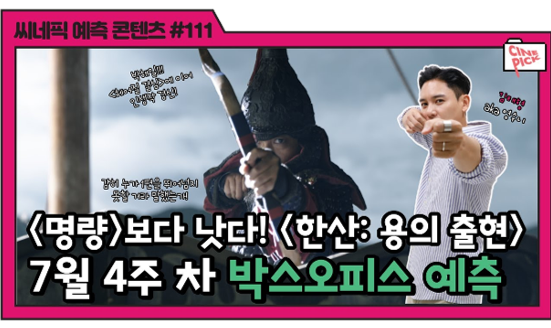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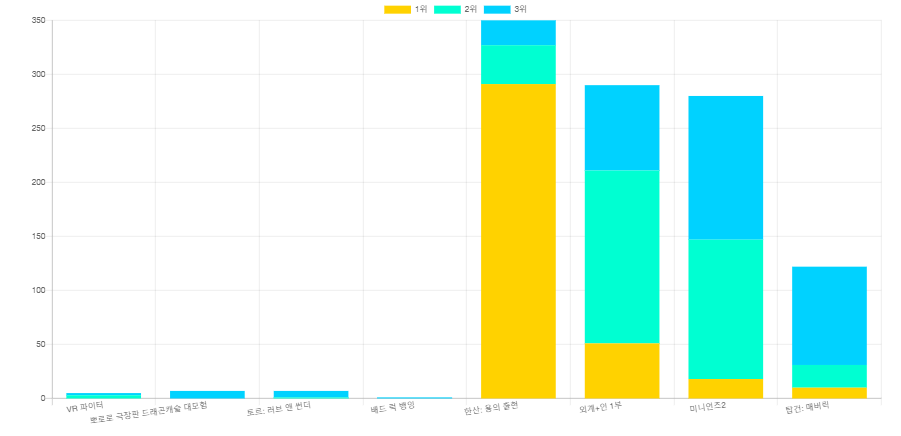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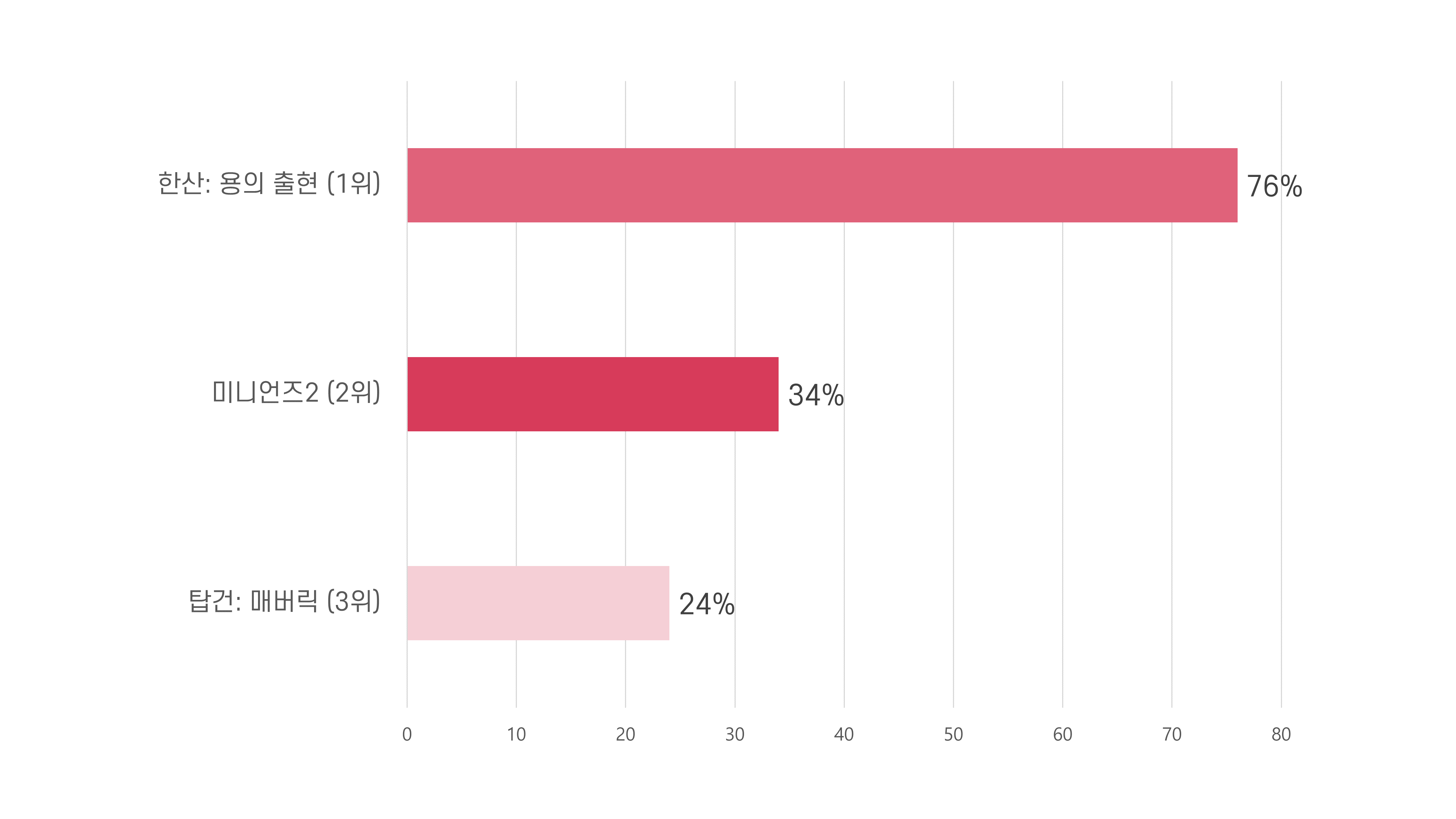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