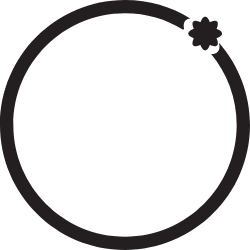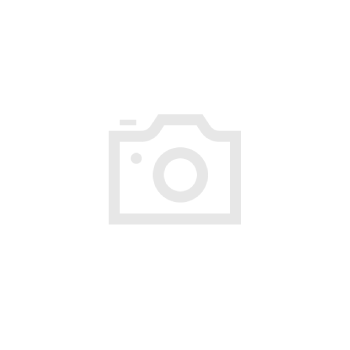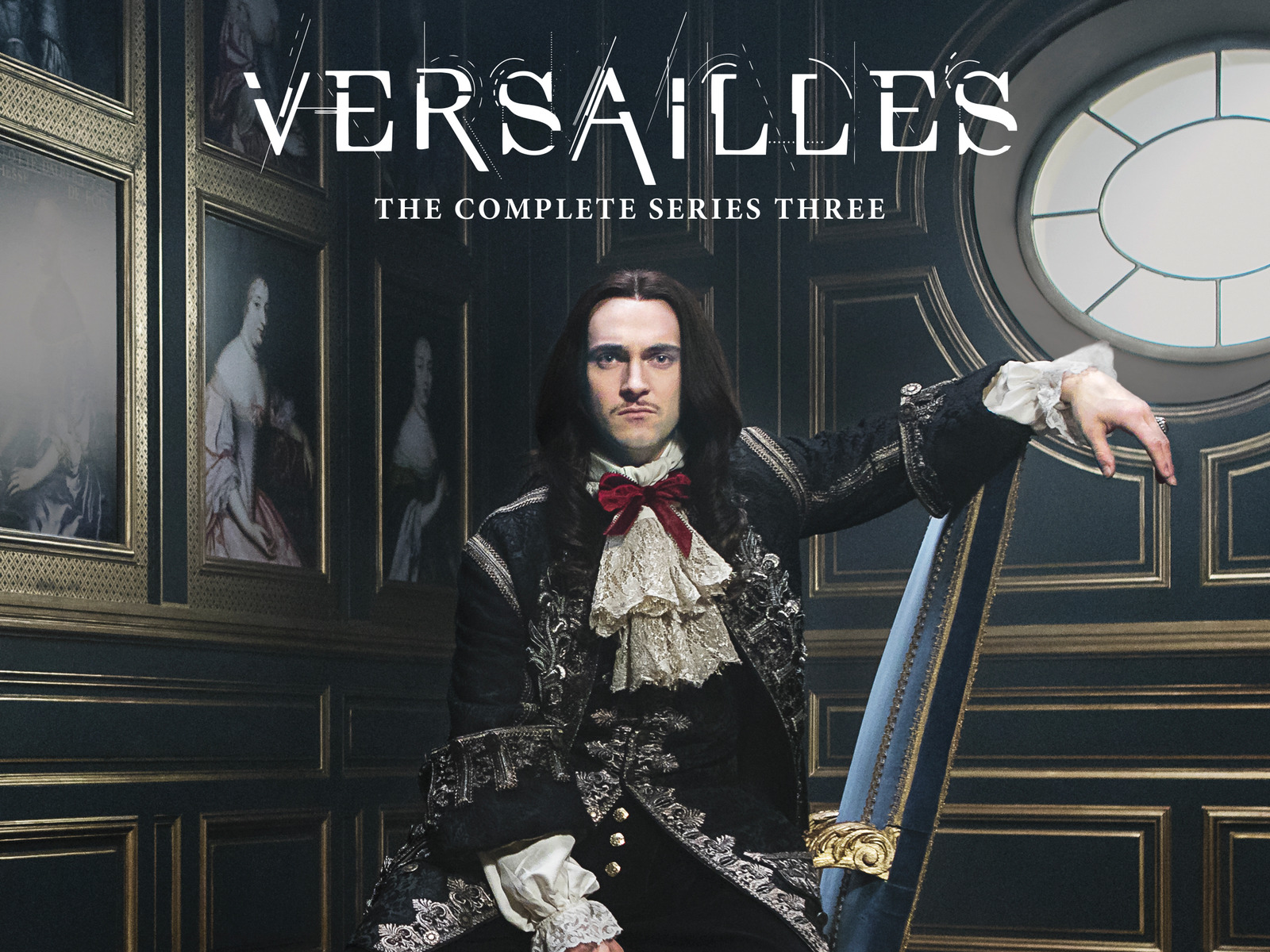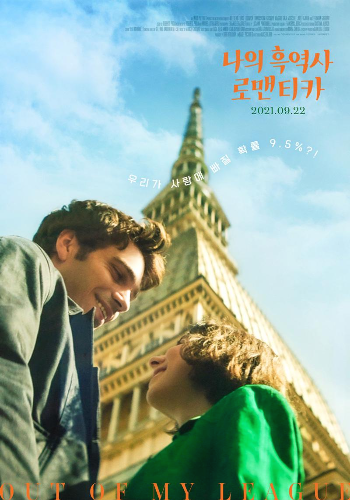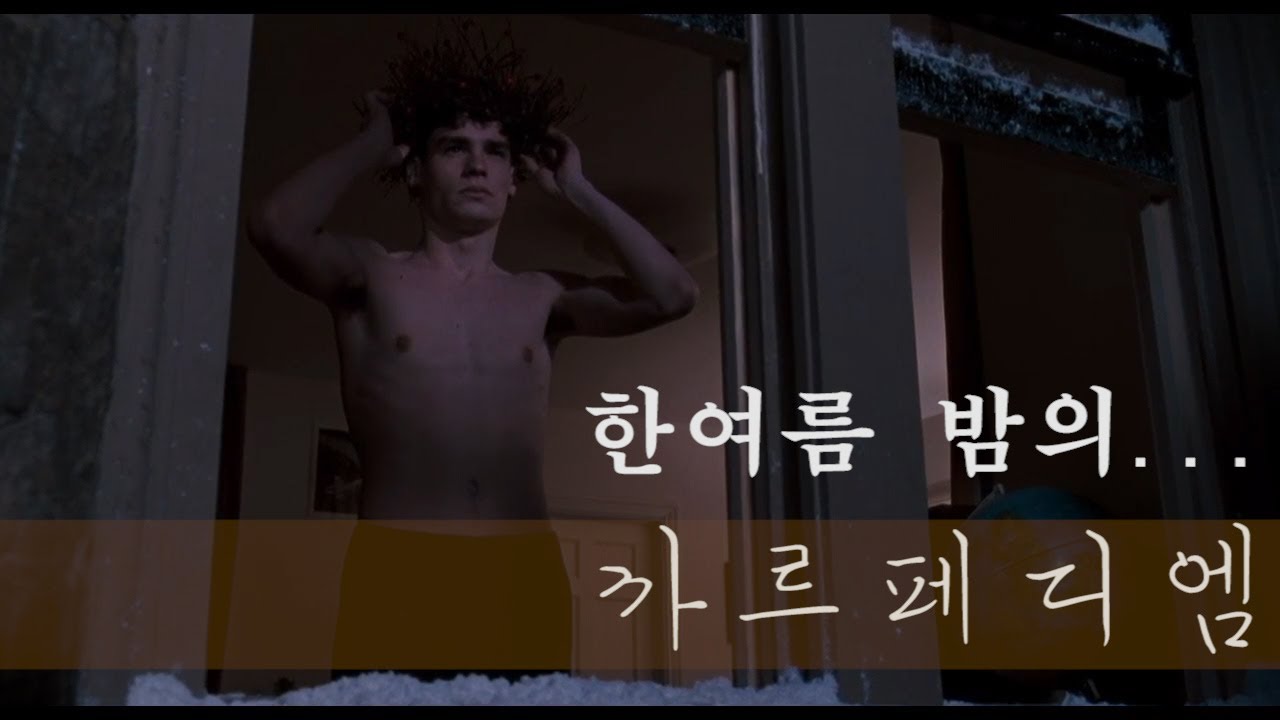서덕2025-05-06 12:15:31
[JEONJU IFF 데일리]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공포에 대해서.
영화 <통곡>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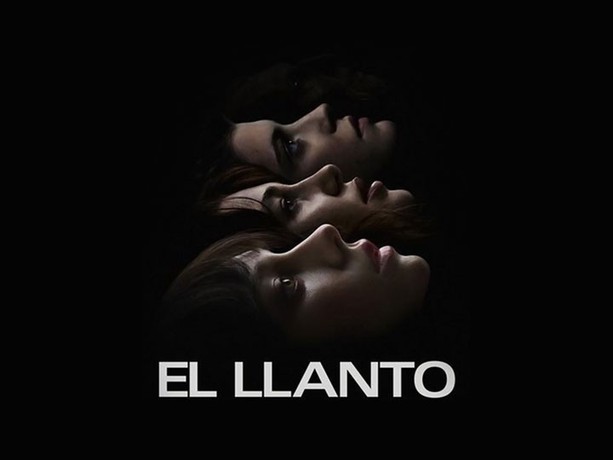
Director
Pedro MARTÍN-CALERO
Cast
Ester EXPÓSITO, Mathilde OLLIVIER, Malena VILLA
Sound
Gabriel GUTIÉRREZ
시놉시스
무언가가 안드레아를 괴롭힌다. 그러나 아무도, 심지어 안드레아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20년 전, 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같은 존재가 마리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녀의 친구 카밀라는 마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 숨 막히는 위협에 직면할 때, 세 사람은 모두 같은 소리를 듣는다: 통곡 소리.
*본 리뷰는 영화의 결말에 대한 강한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
올 해 <불면의 밤> 섹션에서 만난 작품들은 여성주인공이 겪는 공포에 대한 서사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통곡>은 한 명이 주인공에게 벌어진 불운이 아니라 수십년 동안 한 핏줄에서 태어난 세 명의 모녀에게 전해내려온 통곡의 저주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와 공포를 참신하게 풀어낸 점이 재밌었다. ‘세대’에 전승되는 공포는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대를 이은 저주라는 측면에서 옆동네 컬트영화인 <유전>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그 누구의 의지나 욕심의 부작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층위에서 가능한 해석의 여지를 재어볼 수 있었다.

공포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진짜 공포의 모습
도심 한복판에서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환청을 경험하는 여자들이 있다. 마리, 그리고 그녀의 딸 안드레아다. 마리는 자신의 딸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딸을 아주 먼 곳으로 입양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들을 사랑하는 친구들까지도 그녀들이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동안 그녀들은 잠시 덜 외롭다. 그러나 울음소리를 몰고다니며 그녀들을 따라다니는 한 남자는 그녀들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 통곡의 저주를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다. 오직 울음소리를 듣는 이들의 카메라에만 찍히는 남자는 현실에서, 타인의 시선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마치 무병을 앓는 사람처럼 희생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저주를 어떻게 상대해야할지 모르는 채 당할뿐이다.
그 자체로도 공포스럽지만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특별한 점은 공포의 양상이다. 대상으로 그려지는 남자에게서 오는 공포보다 그를 증명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공포가 훨씬 무섭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그녀들이 일상에서 겪어야하는 오해와 불신, 편견과 배척은 그녀들을 더욱 고립되게 만든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사회의 시선은 그들 스스로를 놓게 만든다. 마주보고 벗어나려는 순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힌다. 그래서 그녀들은 도망을 선택한다. 하지만 막다른 길에서 그녀들이 이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뿐이다.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공포영화는 주인공 빼고 다 죽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관객이라면 이 작품의 엔딩이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통곡>은 주인공을 죽임으로써 소위 국룰로 여겨지는 공포영화의 법칙을 깨트린다.
8년, 마리, 라플라스 (어머니)
22년, 안드레아, 마드리드 (큰 딸)
23년, 리즈베트. 브뤼셀 (작은 딸)
엄마와 딸 각각의 내러티브를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바톤터치하듯이 나눠 배치하는 이 영화는 2022년의 안드레아를 중심으로 과거(마리,엄마)와 미래(리즈베트,여동생)의 시간까지 대략 30년 정도의 시간을 담고 있다. 독특한 것은 영화가 결말에 이르러 주제를 입증하는 방식이다. 안드레아와 마리의 서사 분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안 공포적 존재에 시달리던 그녀들이 죽음으로써 ‘끝’난줄 알았던 그 때, 거의 에필로그에 가깝에 리즈베트가 등장한다. 영화를 보는 동안 리얼타임으로 저주가 대물림 되는 ‘유전’현상 을 목격하게 된 셈이다. 그 순간 영화의 스산함은 스크린을 넘어 객석으로 전달된다. 30년 넘게 존재해온 공포의 존재가 희생양을 찾아 우리의 현실 시간에 가까이 다가왔고, 관객 모두 통곡의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피해자와 목격자를 등장 시킨 채 끝나는 엔딩은 관객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작품의 스타일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공포인가요?
사실 무엇에 대한 공포인지, 영화상에서 명확히 증거를 제시해주진 않기 때문에 피해는 왜 오직 모계를 통해 이어지는지, 공포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남성노인은 그들의 개인의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여자들을 죽이려드는 노인 외에도 여성주인공들을 둘러싼 남성캐릭터들의 소통불가한, 혐오적이고 폭력적인 정황들 때문에 이것이 남성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여성의 트라우마에 대한 영화가 아닌가 유추해볼 뿐이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보고싶다. 공포의 대상과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분명한 것은 어떤 장르의 공포를 만나든, 공포의 근원은 언제나 원인을 알 수 없음이라는 미지의 세계와 닿아있다는 것이다. 과학으로 증명이 불가하고, 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으며, 공권력으로 수사도 불가한 그 영역. 그 곳에 진정한 공포가 있다. 살인자나 저주의 원인을 아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 인류 역사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공포는 사실 살아있던 인간에게 필연이며, 그렇기에 영화는 주인공들을 죽이는 미지의 공포의 초자연적인 힘 앞에 제도나 타인의 구원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대항할 수 없는 공포의 지배 안에서 알리고, 도와달라는 외침은 무력해진다. 하지만 마리의 친구 카밀라와 안드레아의 남자친구인 파우는 어떻게든 그녀들을 그 고통에서 꺼내주려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노력은 좌절되고, 이 공포의 생존자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한 뒤에야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된다. 더 정확히는 믿을 수 밖에 없게된다. 자신이 겪어보고 난 뒤에야 믿을 수 있다는 뒤늦은 후회는 이 공포를 더욱 잔인하게 만든다.
혹자는 서사적 완결성을 근거로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맞다. 다가오는 공포에 속수무책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오해와 편견으로 고립되다가 끝내 제물이 되고 마는 그녀들의 삶은 저주를 위한 희생제의 이상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유추컨대 <통곡>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나 벗어날 수 없는 아픔에 메타포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울증을 가진 이들이 말로가 정상사회 프레임 안에 있는 사람들 시선에선 늘 안타깝고, 미진하겠지만 그들이 살기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오직 겪어본 자만이 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 공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Schedule in JIFF
2025.05.02(금) 23:59 메가박스 전주객사 1관
2025.05.02(금) 23:59 메가박스 전주객사 2관
2025.05.03(토) 23:59 메가박스 전주객사 3관
2025.05.03(토) 14:00 메가박스 전주객사 2관
2025.05.05(월) 14:00 메가박스 전주객사 2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기간 4월30일~ 5월 9일
- 1
- 200
- 13.1K
- 123
- 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