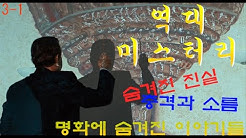윤동남2025-06-27 17:08:41
그 수유천이 도망친 레베카에게 뭐라고 하니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
<그 자연>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스크린 뒤쪽의 힘이다. 이 영화에서 동화의 아버지와 오령의 어머니는 대화 속에서 언급되기만 할 뿐 등장하지 않는다. 동화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 살고 있으며 그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기 싫어한다. 동화가 화를 내는 부분도 능희가 ‘뒤에 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할 때이다. 오령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 하지만 오령은 동화와 달리 공간을 통해 어머니를 계속해서 기억하고자 한다. 그는 집 뒤편에 어머니의 무덤도 만들어두었고 직접 가꾼 흙길을 걸으며 매일 어머니 생각을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특히 오령의 어머니는 영화 전반에 걸쳐 흥미로운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그 방식은 히치콕의 <레베카>나 PTA의 <팬텀 스레드>와 같은 영화들을 연상시킨다. 말하자면 오령의 집은 죽은 어머니의 기운이 서려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레베카>적 설정을 떠올렸을 때 이 영화에서 어머니의 힘이 주인공에게 작용되는 방식은 조금 특이하다. <레베카>적 설정이 적용된 영화들에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주인공은 집에 서린 죽은 어머니의 기운에 불안함을 느낄 것이지만, 이 영화에서 동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동화는 어머니에 대한 오령의 효심에 감복하며 무덤에 절을 올리기까지 한다. 대신 그 불안은 집안의 다른 인물들로부터 발현된다. 우선 능희. 영화 초반 준희가 쭈뼛거리며 제공하는 그녀에 대한 설명, 멀리서 들리는 가야금 소리와 같은 정보들은 어딘가 께름칙한 분위기를 풍긴다. 능희가 등장한 뒤에도 그녀가 등장하는 장면에서의 대화들은 언젠가 터질 듯 위태롭고, 결국 실제로 능희는 후반부 저녁 식사 장면에서 갈등을 촉발하기도 하다. 다음으로, 영화의 첫 숏에 등장하는 선희는 이후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저녁 식사 장면이 되어서야 비로소 다시 얼굴을 비추는 인물이다. 그동안 오령은 전화를 통해 꾸준히 그녀의 복귀를 예고하는데, 말하자면 어머니의 복귀 불가능함을 선희가 대신 채우게끔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사실 선희로부터 야기되는 불안은 더 은밀하다. 동화를 자극하는 말을 뱉으면서도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순수한 호기심에서 기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능희와 달리, 저녁 술자리에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지만 이후 오령과의 대화를 통해 동화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직접적으로 뱉는 인물은 바로 선희이다. <레베카>의 집에 없는 어머니로부터 오는 불안은 이 영화에서 집에 상주하나 늦게 도착하곤 하는 다른 여자들로부터의 불안으로 분산, 변주되는 양상이다. 홍상수의 자연에 대한 매혹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홍상수가 자연의 아득함에 매혹되는 순간들은 이전에 비해 소박해지고 감성적으로 변한 2020년대 영화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빈번하게 등장하고(특히 영화의 마지막에서), 사실 2008년작인 <잘 알지도 못하면서>에서도 마지막 장면을 주인공이 아득히 바라보는 바다를 비추며 마무리했다(<도망친 여자>의 마지막에서 감희가 보는 영화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번 영화에서는 제목에서부터 자연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언급했다. 제목부터 범상치 않은 인상을 풍기는 이 영화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주인공이 자연에 매혹되는 순간들이 자주 등장하곤 한다. 그런데 이 영화가 자연을 담아내는 데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자연에 매혹되는 주체가 영화 자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공 동화라는 점이다. 영화는 종종 아웃포커싱된 저화질의 화면을 가득 채우는 밝은 녹음, 보여주지 않을 줄 알았던 붉게 저무는 노을까지 카메라에 정말 아름답게 담아내지만 그 자연을 철저하게 매혹의 피사체가 아니라 배경으로서만 다룬다(이를테면 <인트로덕션>과 <물안에서>의 마지막 장면과 같은 순간이 이 영화에는 없다. 또 이 영화에서는 나무나 풀, 혹은 풍경에 줌인을 가하는 순간이 없다). 그런데 이 자연은 단지 배경으로서만 치부하기엔 비중이 꽤 커서, 혹은 그 자연에 대한 동화의 반응이 너무나도 커서 종종 장면 전체를 장악하곤 한다. 배경의 위치에 있으나 그 힘이 튀어나와 스크린을 지배하는 이 영화의 자연은 자연스럽게 지금 이곳에 없으나 공간과 상황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들, 즉 오령의 어머니와 동화의 아버지의 존재를 환기한다. 그렇다면 <그 자연>의 뒤쪽에서 감지되는 불안의 근원은 무엇인가? 위에서 이 영화는 스크린 뒤쪽에서 작용하는 힘의 영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힘의 근원을 프레임 안의 후경이나 서사의 뒤편을 넘어서 말 그대로 스크린 너머에서 찾아보자면, 홍상수의 다른 영화들, 그중 특히 <도망친 여자>를 떠올려 볼 수 있다. <그 자연>은 산을 배경으로 찍었다. 평화롭고 목가적인 이 산에서 오령은 산길을 가꾸고 닭도 키운다.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보면 이 영화는 마치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도망친 여자>의 저편에서 일어난 영화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 영화는 극중에서도, 엔딩크레딧에서도 경기도 여주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도망친 여자>의 각 챕터가 시작할 때 느린 줌아웃으로 비춰지는 창밖의 산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만 같다. 그리고 서울 북촌과 여주 산속에서 벌어지는 두 이야기는 닭으로 매개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서울 북촌에서 창문 너머 여주 산속으로까지 힘을 뻗치고 있는 존재는 무엇인가? <도망친 여자>에는 있고 <그 자연>에는 없는 것, 바로 김민희다. 김민희는 서울 북촌의 어딘가를 떠돌고 있으므로 여주 산속에 있을 수 없다.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부터 이번 영화까지 세면 홍상수는 총 17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그중 12편의 영화에 김민희가 주연으로든 조연으로든 등장한다. 김민희가 영화에 어떤 방식으로든 등장하지 않은 영화는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 <당신얼굴 앞에서>, <탑>, <여행자의 필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까지 총 5편으로 생각보다 꽤 있는 편이고, 그러므로 김민희 없는 홍상수 영화를 보는 것이 사실 그리 낯선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그 자연>에서는 유독 김민희의 부재가 크게 느껴진다. 이 영화에서 김민희의 부재가 드러나는 지점들은 특수하고도 흥미로운데, 우선 첫 번째로는 다른 영화들과 달리 이 영화에서는 김민희가 있었더라면 맡았을 배역이 꽤 명확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이 영화에서 박미소가 연기한 능희는 평소 홍상수 영화에서 김민희가 맡던 역할의 이미지를 상기시킨다. 시종일관 은은한 불안감을 풍기는 이 능희라는 인물은 술자리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히스테리와 약간의 표독스러움으로 영화 전체에 지속되던 평화를 깨는 인물이다. <풀잎들>이나 <밤의 해변에서 혼자>같은 영화들에서 김민희가 연기한 인물을 떠올려보면 <그 자연>에서 이 점은 꽤 분명하게 보인다. 다음으로 김민희의 부재가 드러나는 지점은 결말인데, 결말은 이 영화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기도 하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그 자연’은 동화에게 상처만 남길 뿐 뭐라고도 하지 않는다. 고장나버린 낡은 차 안에서 쓸쓸히 담배연기를 뿜는 동화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난다. 자의식에 가득찬 채 낡은 차를 마냥 찬미하는 동화의 태도는 말하자면 자연에 대한 태도와 동일시되므로 거창해보이는 이 영화의 제목은 사실 자조 섞인 맥거핀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인트로덕션>, <물안에서> 같은 영화들의 결말과는 확실히 이질적이다. 이 점에서 <그 자연>은 최근작인 <수유천>과 궤를 같이 한다. <수유천>의 마지막에서 전임은 수유천의 발원을 찾겠다며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 프레임에서 사라지지만 곧이어 환한 미소를 띤 채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며 프레임 안으로 복귀한다. 그리고 전임의, 혹은 김민희의 그 해맑은 미소에서 일시정지하며 영화는 끝난다. <그 자연>의 결말을 <수유천>의 결말과 비교해보면 이 영화에 감도는 불안감의 근원이 사실은 후경으로서의 자연, 혹은 극중에서 부재한 인물을 넘어 영화 자체의 바깥에 있다는 것과 그것의 정체가 김민희의 부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유천>의 개봉 이후 홍상수 영화 속 김민희의 존재에 대해서 흥미로운 담론들이 오갔다. 그의 영화에서 김민희는 점점 정물화되어가고 있고 <수유천>은 그 흐름에서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그 자연>은 홍상수 필모그래피 안에서 <도망친 여자>, <수유천>과 이을 수 있는데, 자연에 대한 태도와 김민희의 존재 여부라는 두 축을 세 영화를 동시에 관통하며 또 각 영화들이 갈라지는 지점으로 삼아볼 수 있다. <도망친 여자>는 자연을 긍정하면서 영화 표면에 항상 존재하는 김민희에 의해 작동되었고, <수유천>은 자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면서도 정물로서의 김민희는 무한 긍정했다. 이번 <그 자연>은 자연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김민희마저도 없는 상태를 찍은 것이다. 그리고 그 상태는 텅 빈 자연, 분산된 불안, 한숨 쉬는 남자라는 증상으로 발현된다. 그래서 <도망친 여자>와 <수유천> 이후 <그 자연>은 정물화에서 블랙코미디로의 회귀, 몇몇 부분은 탈속에서 세속으로의 회귀이고, 역설적으로 김민희 없는 김민희에 대한 영화다.
- 1
- 200
- 13.1K
- 123
-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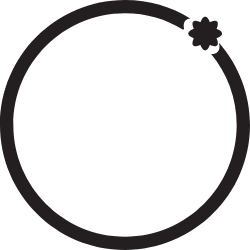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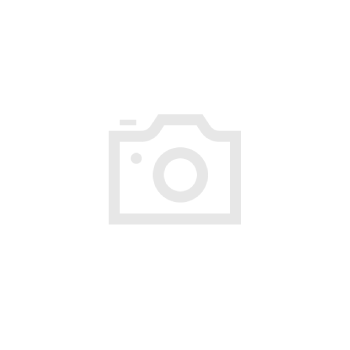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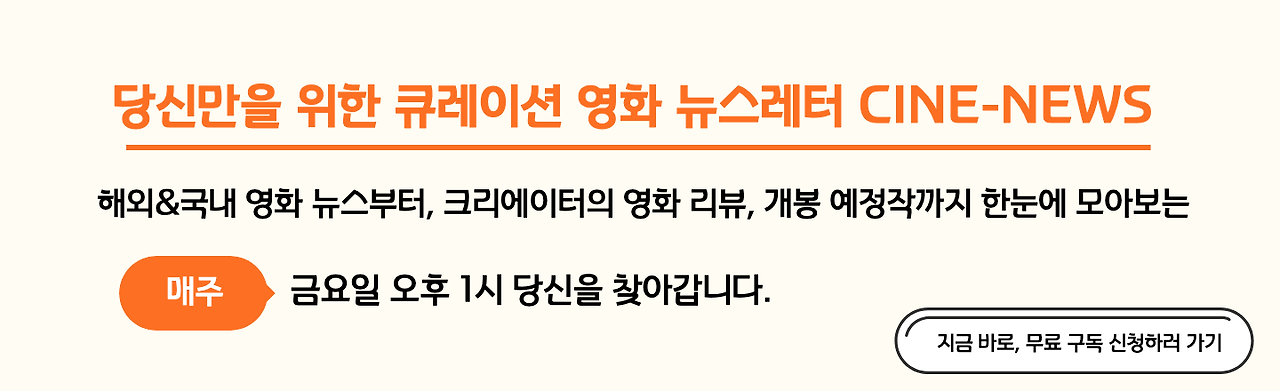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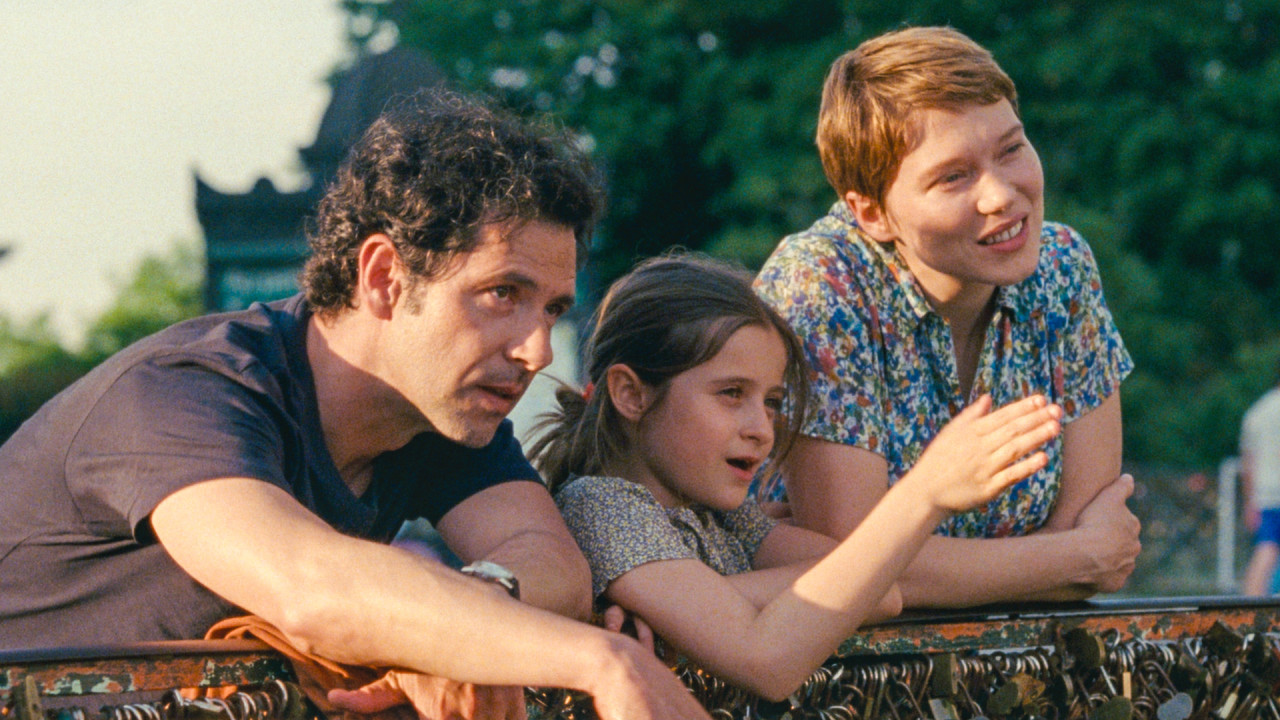
.jpg)


.jp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