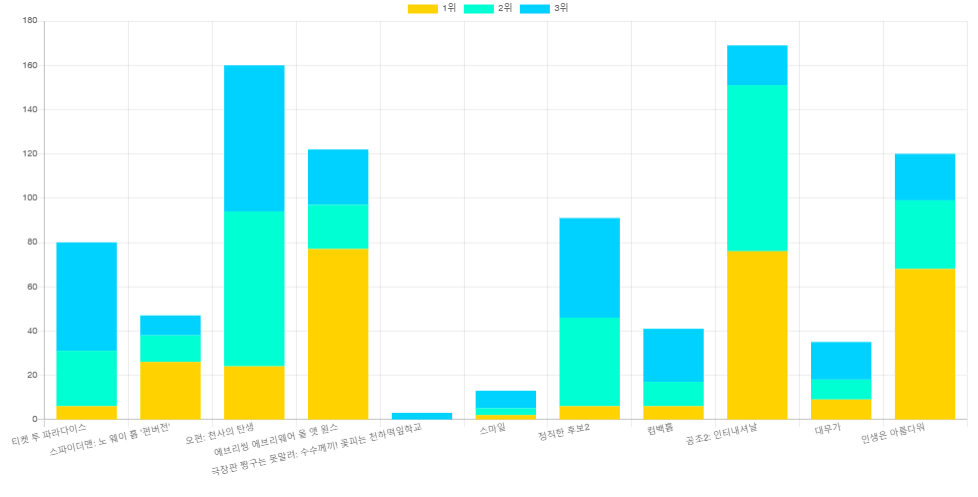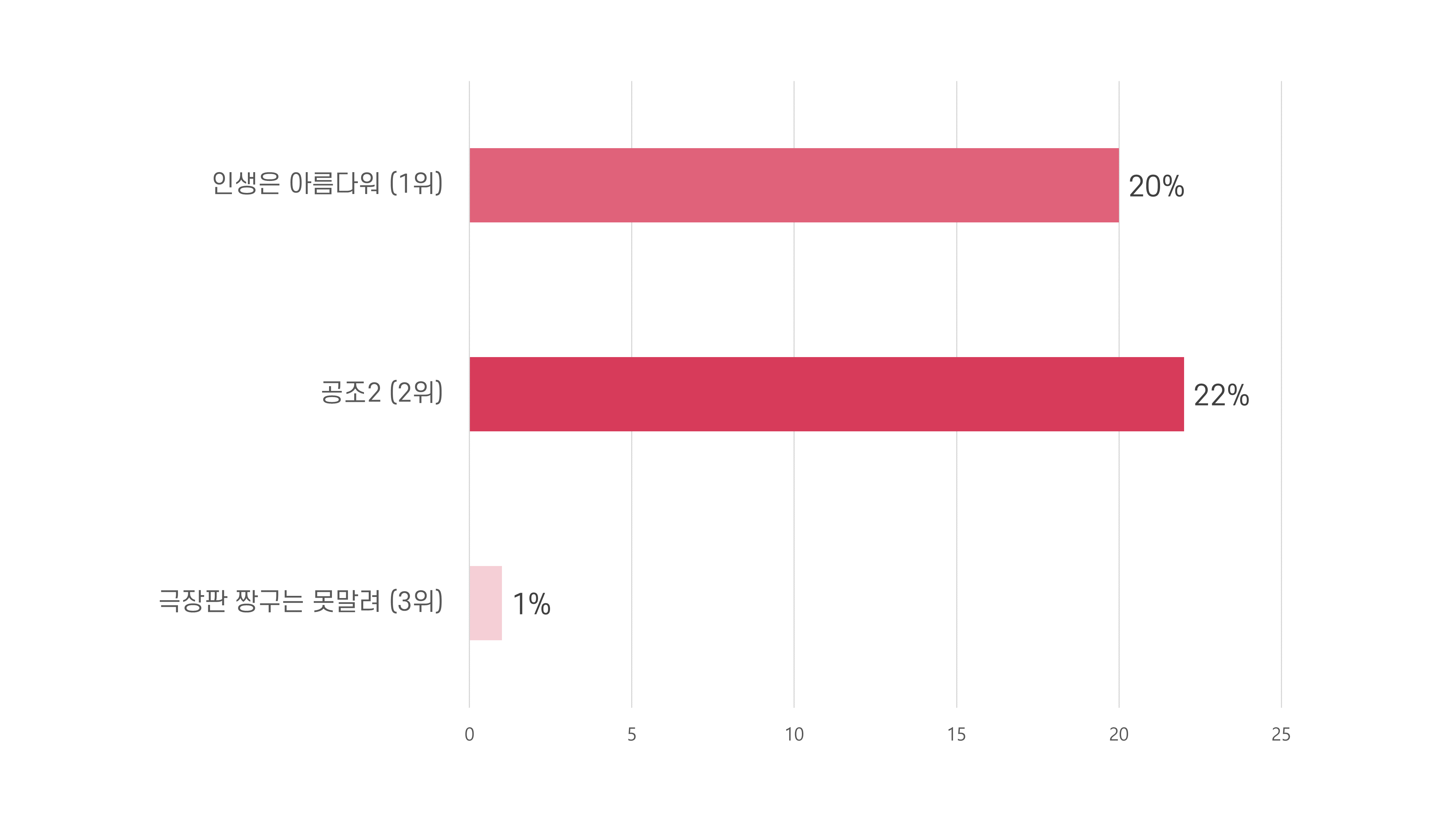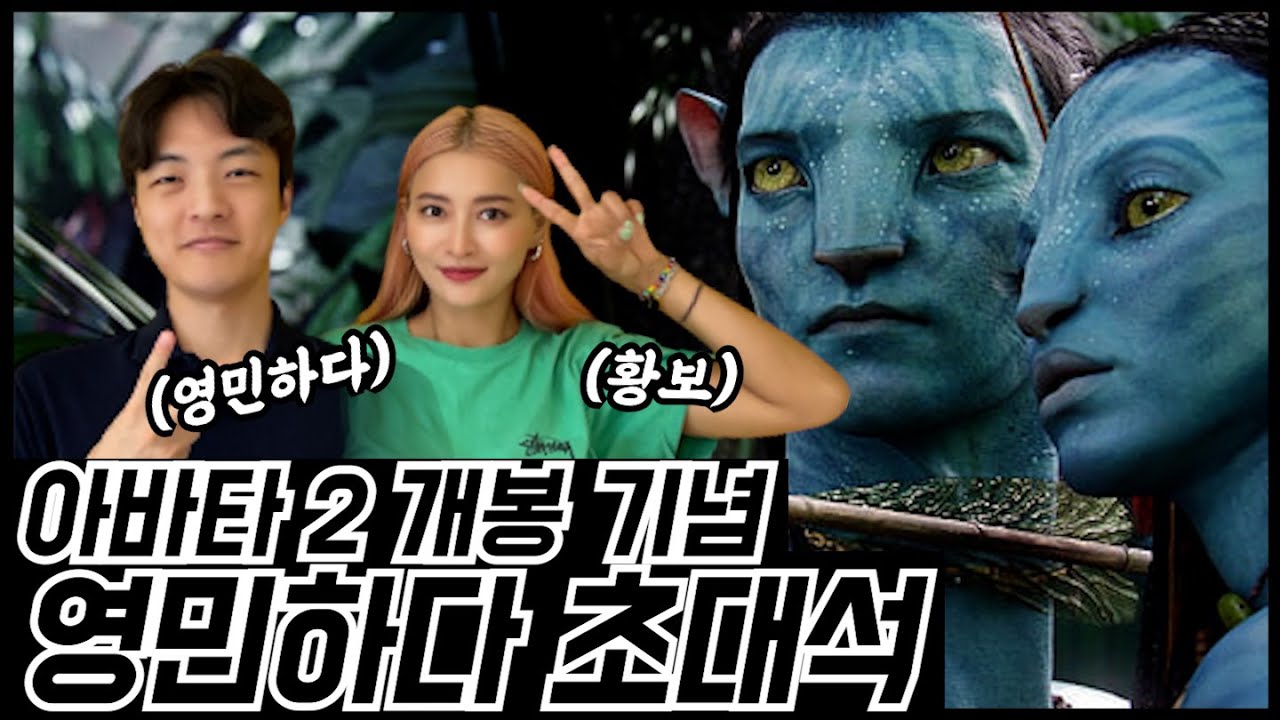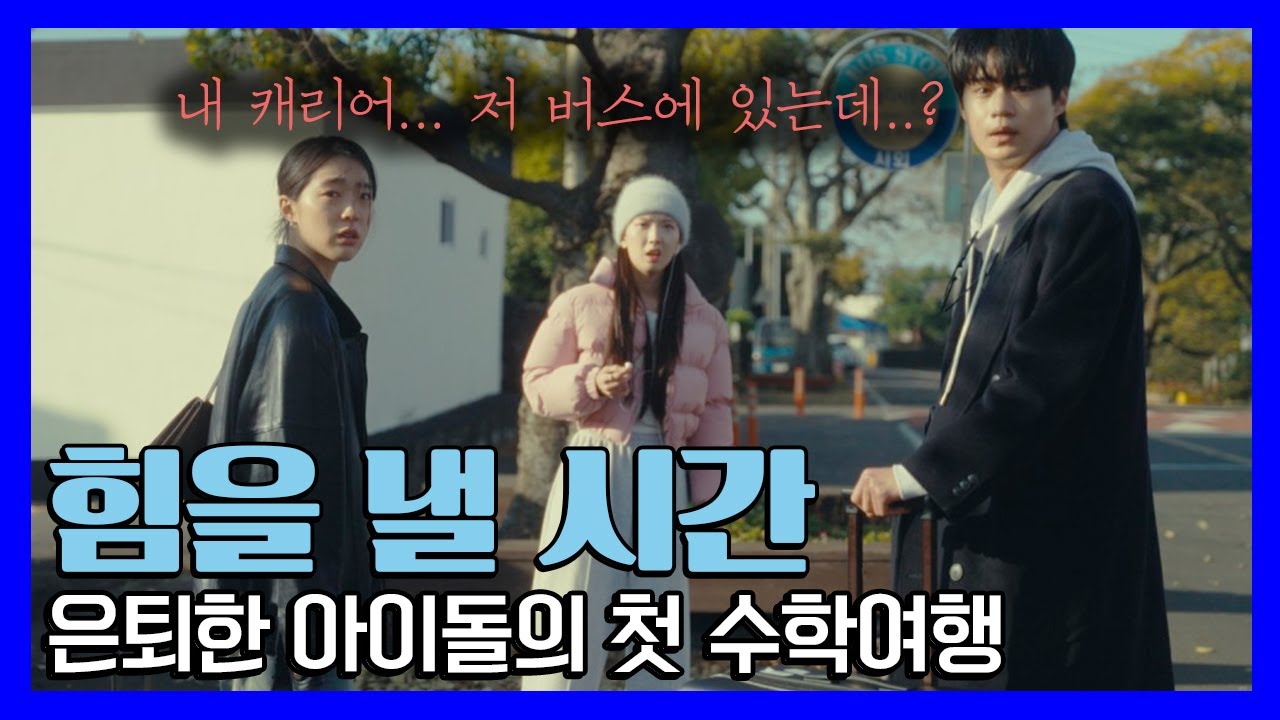않인2025-08-06 22:42:12
어쩌면 붙잡을 지푸라기는
<머터리얼리스트>(2025)

<머터리얼리스트(Materialists)>(2025, 셀린 송)
* 작품의 장면과 결말 포함
<패스트 라이브즈>에는 24년 만에 재회한 노라와 해성이 결혼에 관해 대화하는 장면이 있다. 해성은 현재 연인과 조건이 맞지 않아 결혼하기 어렵고, 때문에 잠깐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 노라와 아서의 결혼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젊은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노라의 그린카드를 위해 예정보다 이르게 결혼했다. 아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지루하다’고 평했지만, 현실에서 노라와 아서의 서사는 가장 낭만적인 축에 속하지 않을까. 노라에게 있어 해성이 한국, 과거의 추억을 대표하는 존재였다면 해성에게 있어 노라는 환경과 조건을 따질 필요 없이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만이 중요했던 시절의 상징이었는지 모른다. 물리적 거리라는 환경이 그들을 멀어지게 했음에도 말이다.
<머터리얼리스트>, 커플매니저 루시의 고객들 중 노라나 아서처럼 가난한 작가는 아마 없을 것 같다. 결혼을 위해 누군갈 고용할 만한 형편이 되는, ‘내세울 만한’ 직업과 연봉, ‘봐 줄 만한’ 외모를 지녔고, 적당히 화목한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이 매치컴퍼니의 주 고객층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에서 루시는 각자 내건 조건들을 바탕으로 ‘박스 체킹’을 하고 ‘리스크’를 고려해 두 사람을 엮는다. <패스트 라이브즈>의 삼각형이 노라와 과거-서울, 현재-뉴욕의 관계가 이루는 것이었다면, <머터리얼리스트>의 삼각형은 루시와 물질 기반 연애, 그리고 사랑을 잇는다. 영화가 블랙코미디의 톤으로 훑어내리는 ‘결혼 전제 연애’들을 살피다 보면, 단 하나의 공감대로 데이트가 가능한 <더 랍스터>(2015) 속 암울한 호텔이 오히려 낭만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농담이다). 셀린 송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언급하기도 했듯[Indiewire], 이같은 ‘결혼 시장’은 현대에 더 상업화/조직화 되긴 했으나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때문에 영화는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했던 것일 테다. 오로지 ‘너’와 ‘나’, 꽃다발만이 함께하는 결혼을 묘사하는-아마 루시의 상상일- 오프닝 시퀀스는 다소 순진해 보이긴 해도,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선명하게 짚는다.
여기에 이질적인 뉴욕의 풍경과 출근 전 공들여 스타일링하는 루시의 모습이 뒤따른다. 잠재적 연애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단 무의식적 환상을 심어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로 보인다. (실제로 루시가 자신을 대놓고 훑어보는, 정장을 빼입은 키 큰 남자에게 매치컴퍼니 명함을 건네는 장면이 있다. 그는 후에 ‘20대 초반 여성과는 세대 차이가 나고 30대는 부담스러우니 27세의 여성과 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고객으로 재등장한다.) 연인들을 이어주는 게 일이면서 정작 자신은 연애에 회의적이다. 누군가의 결혼이 성사될 때마다 환호하며 파티하는 매치컴퍼니 직원들, 화면 한켠에는 정서적으로 동떨어진 루시가 있다.
이런 루시에게 영화같은(영화가 맞다) 우연이 찾아온다. 그는 짝지어준 커플의 결혼식에서 두 남자와 조우한다. 신랑의 형제 해리와 전 연인 존. 해리는 그야말로 완벽하다. 큰 키에 준수한 외모,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업, 상속받은 경제적/심리적 여유. 웨이터로 일하던 중인 존의 조건은 루시가 익히 아는 그대로다. 좁은 아파트에 룸메이트와 살며 연기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생계를 유지하기 바쁘다. 다른 영화였다면 루시는 마법처럼 해리에게 이끌리고 존은 이들을 방해하는 찌질한 전남친 포지션으로 강등됐을수도 있다. 허나 주인공 여성과 사랑에 빠진 남자가 편리하게도 부유한 ‘유니콘’인 로맨틱코미디의 법칙을 <머터리얼리스트>는 거부한다. 영화가 그리려는 건 짜릿한 삼각관계의 긴장이나 만족스러운 판타지가 아니다. 루시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결혼을 ‘비즈니스’로 여기는 관점에서는 해리가 ‘객관적으로 좋은 옵션’이다. 사람을 보면 자동으로 조건을 따져 평가하곤 하는 루시가 해리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는 게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사실 루시의 잣대는 본인에게 더 엄격하다. 해리와 데이트하며 끊임없이 ‘당신은 나보다 더 어리고 잘난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존과 대화하는 와중엔 속물적이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루시가 망설이는 이유는 아니다. 여기 통제되지 않는 변수가 있다. 루시와 존이 아직 서로를 사랑한다는 점이다.
해리는 돈 많은 나쁜 남자가 아니다. 존이 마냥 상냥하고 착한 남자인 것도 아니고. 해리는 자상하다. 도덕적 결함도 없다. 자기 소유 고급 맨션에서 혼자 사는 그는 대개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그 여유는 곁에 있는 루시에게로 흘러넘친다. 낡은 아파트를 룸메이트와 공유하는 존의 아침은 매번 다급하고 신경질적이다. 루시와 존은 과거에 25달러 때문에 꽉 막힌 도로에서 언성을 높인 적이 있다. 해리가 ‘길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루시가 ‘나는 길에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답하는 대화는 상징적이다. 루시의 말대로 우리는 자주, ‘부모가 싸우는 방식을 물려받는다’. 경제적/문화적 자본이 넉넉하다 해서 꼭 해리처럼 우아한 남자로 성장하리란 법도 없다. 나이, 신장, 연봉, 직업 따위 물질적 조건은 마크가 범죄자라는 걸 말해주지 않았다. 소피가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루시는 수첩에 적어둔 고객 정보 리스트를 읽으며,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었음을 깨닫는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언급하며 보기보다 순진하지 않은 태도로, <머터리얼리스트>는 결국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는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루시가 청혼을 받아들이는 까닭은 결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존이라서다. 그가 ‘낡은 차가 고장날 때까지 너와 함께 드라이브해도 좋겠다’고 느끼는 순간- 거기에 영화는 희망을 심는다. 생각해 보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한다’는 건 얼마나 운좋은 일인가. 왜 선뜻 사랑을 택하면 안되나, 왜 스스로를 경멸하면서까지 물질적인 조건을 따져야 하나. 이를 뒤집어, 사랑하지 않는데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으로 바꿔 볼 수도 있다. 영화는 (다분히 이성애 규범적인) ‘성공적인’ 결혼이 오랫동안 행복 서사의 필수 요소였던 세상에서, 인간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본질적 물음을 던지려 한다.
- 1
- 200
- 13.1K
- 123
-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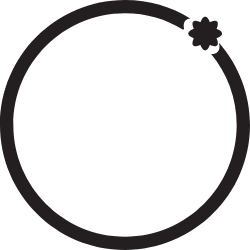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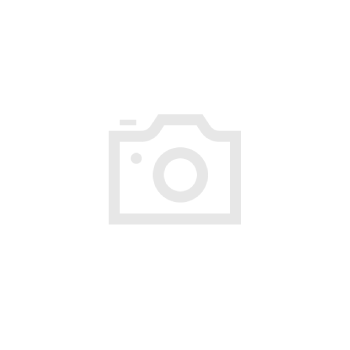
.jpe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