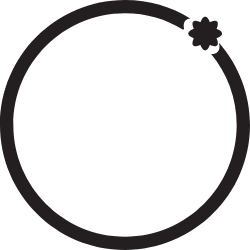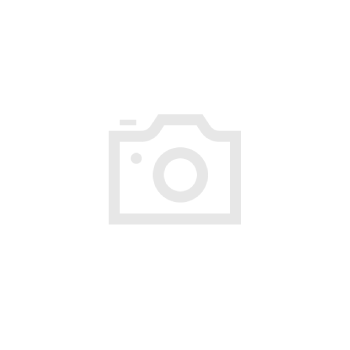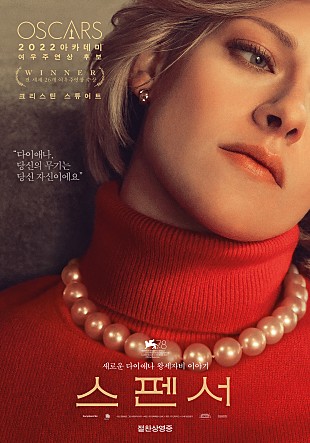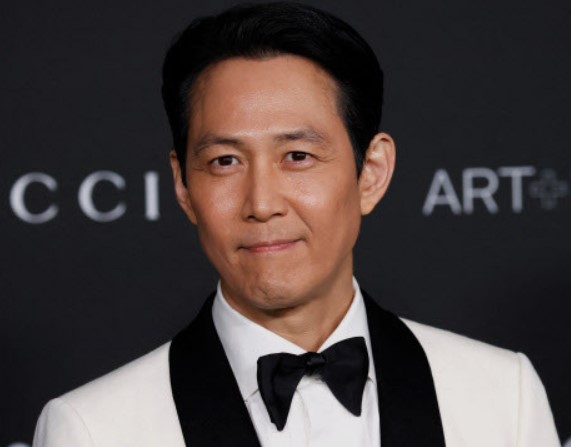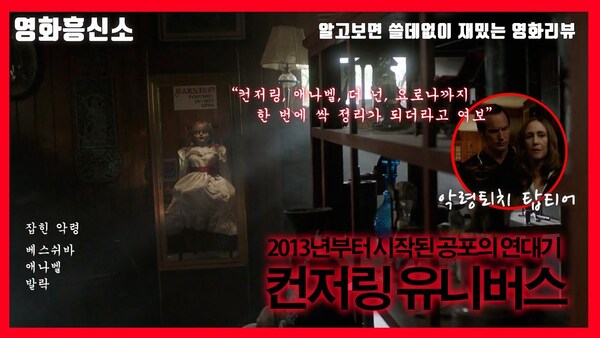우란2025-09-03 20:46:31
모두의 합작으로, <스탑 메이킹 센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탑 메이킹 센스>는 내게 의미가 있었다.
스탑 메이킹 센스 Stop Making Sense, 1984
미국 다큐멘터리 88분
감독: 조나단 드미
모두의 합작으로, <스탑 메이킹 센스>

출처: 영화 <스탑 메이킹 센스> 스틸컷
다큐멘터리 장르 영화를 보고 나면, 꼭 되뇌는 질문이 있다. ‘이 영화는 기록뿐인가, 아닌가’ 좋은 영화와 나쁜 영화를 구분하는 과정이 아니다. 나만의 ‘의미 있는 작품 목록’을 채우는 지극히 사적인 감상법 중 하나로, 사회적‧역사적 소재 혹은 특정 이슈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신중한 물음표다. 특히 다큐멘터리 장르는 극의 무게 중심이 시작이 아닌 끝에 있기에, 결말은 주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절대 잊지 말자는 호소나, 일반적이지 않은 메시지의 질주, 숨겨놓은 사건의 탈주, 인물들의 날 선 고백 등, 본 작품만이 가진 특징을 빼고 오직 정보만 나열하는 기록은 재미도 없을뿐더러 열심히 달려온 목적까지 앗아가기 일쑤다. 속 빈 강정뿐인 결말을 오래 곱씹는 일은 드물고, 설령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무의미한 과정이란 얘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탑 메이킹 센스>는 내게 의미가 있었다.

출처: 영화 <스탑 메이킹 센스> 스틸컷
“안녕하세요, 테이프 하나 틀게요.”
아직 다 준비되지 않은 무대 위에 프론트맨 데이비드 번이 어쿠스틱 기타를 메고 등장한다. 짧은 인사 후 테이프를 틀고는 기타를 튕기며 노래 ‘사이코 킬러’를 열창하는데, 새하얀 신발이 존재감을 내뿜으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제자리에서 오른 다리로 연신 바닥을 힘주어 차며 리듬을 타더니, 곧이어 온몸을 흔들며 무대를 휘젓는다.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대를 세팅하는 데도,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사이코 킬러’ 가사 속 ‘대체 이건 뭐야? 차-차-차- 차라리, 도-도-도- 도망쳐-’가 튀어나올 때마다 더 격정적인 막춤을 선보인다.
첫 곡이 끝나자, 멤버 티나 웨이마우스가 기타를 메고 등장한다. 곧바로 두 번째 곡이 시작되고. 그녀를 기점으로 코러스를 포함한 모든 멤버가 새 곡이 시작될 때마다 차례로 등장한다. 완전히 노출됐던 무대 뒤에 벽(대형 스크린)이 내려오고 핀 조명이 주인공들을 향하는 등, 미완성이었던 무대도 곡과 함께 호흡하듯 차근차근 완성된다.
누구도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다음 곡이 어떤 노래인지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저 리듬에 몸을 맡긴 채 공연을 이어가는 토킹 헤즈. 관객은 그들에게서 뭘 느꼈을까. 무엇이 가슴을 뛰게 했을까. 자유? 해방? 공동체 의식? 그들만의 독특한 공연 방식? 거기서 느낀 주체할 수 없는 날 것의 감정들? 그때, 그 순간, 공연장에 있던 이들에겐 뭐든 자연스럽고 당연했을 거다.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함께 한다고 믿으며 공연을 즐기고 있는, 스크린 앞 좌석에 앉은 우리에겐 무엇이 전달되었을까.

출처: 영화 <스탑 메이킹 센스> 스틸컷
<스탑 메이킹 센스>가 토킹 헤즈의 콘서트를 기록한 게 아니라 관객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담아낸 ‘영화’라는 걸 전제로, ‘Stop Making Sense!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란 메시지는 이미 첫 곡에 울려 퍼졌다. 중요한 건 이다음에 오는 무엇, 조나단 드미 감독은 카메라의 꾸밈없는 시각 안에 토킹 헤즈의 이야기를 선보이는 방식으로 답한다. 그들만의 독특한 공연 방식을 그대로 담아내면서, 열정적인 밴드의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곡에서 곡을 연결되는 찰나의 틈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카메라의 움직임을 최대한으로 절제하면서도, 휘발되고 마는 잠깐의 희열과 즐거움을 오래도록 음미하고 나아가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길 원하는 듯, 공연하는 이들을 수시로 클로즈업한다. 악기를 연주하는 현란한 손과 발, 이와 함께 반응하는 몸, 관객보다 더 곡에 빠진 표정까지, 전체와 일부를 넘나들며 밴드에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그 결과 공연장이란 무대는 ‘이야기 배경’으로, 이어지는 곡 연주는 ‘사건 전개’, 화면 전환은 ‘사건을 겪는 인물의 감정선’, 노래 가사는 ‘인물의 대사’로 표현된다. 특히 제 몸보다 두 배 이상 큰 의상을 입은 데이비드 번의 계산되지 않은 몸짓이 격렬해질수록 극은 더 극적으로 흘러가는데, 이는 토킹 헤즈의 정체성으로 연결된다. 물론 그들의 언어는 대부분 음울하고 착잡하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알 수 있다. 광기에 휩싸인 노래가 뒤로 갈수록 그들이 오랜 투쟁 끝에 찾은 한없이 따뜻한 가사로 흘러나오고 있음을 말이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삼켜내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니, 어느 누가 토킹 헤즈의 서사에 더 깊이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

출처: 영화 <스탑 메이킹 센스> 스틸컷
<스탑 메이킹 센스>는 ‘모두’의 합작으로 만들어졌다. 밴드와 관객, 무대, 그리고 스크린 밖 우리까지 하나가 되어, 견고하고 강렬한 이야기를 만들고, 단숨에 끝냈다. 여기서 끝은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옷자락을 펄럭이는 데이비드 번의 상징적인 춤이 계속 떠오르고, 파격적인 밴드의 무대 연출이 잊히지 않는 건, 단순히 기억되어서가 아니다. 영화는 모두의 몸과 마음을 날뛰게 하는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현실엔 없는 특별한 도피처로 우릴 안내했다. 그리곤 보고 직접 느끼게 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이곳, 안전지대에선 누구나 자유롭고, 언제든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며, 또 얼마든지 서로에게서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말이다. 덕분에 1983년 할리우드 판타지스 극장에서 펼쳐졌던 토킹 헤즈의 콘서트가 왜 전설이 되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토킹 헤즈와 <스탑 메이킹 센스>가 만든 파동이 얼마나 많은 이의 파동과 연결되어, 새롭게 탄생했는지도 궁금하게 했고.

출처: 영화 <스탑 메이킹 센스> 스틸컷
데이비드 번이 밴드 멤버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소개하더니, 스태프 전원을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한다. 그리곤 첫 등장 때처럼, 공연장에 있는 사람들과 우릴 향해 모두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짧은 인사를 건네곤 홀연히 사라진다. 분명 토킹 헤즈는 무대에서 퇴장했다. 그러나 <스탑 메이킹 센스>는 퇴장하지 않았고, 우리 또한 공연장을 나가지 않았다. 나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권한은 오롯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눈치 보지 말고 냅다 즐기자. 거리낌 없이 함께, 그때 그 순간 모두의 합작으로 만들어낸 엄청난 공연을 떠올리면서-.
- 1
- 200
- 13.1K
- 123
- 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