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정2022-11-03 22:47:40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복숭아
영화 <알카라스의 여름> 리뷰 (2022, 카를라 시몬 감독)
영화 <알카라스의 여름>은 민트색 자동차에서 시작한다. 아이들이 놀면서 자동차에서 우주선까지 확장될 수 있는, 어디까지고 커질 수 있는 작고 안온한 세상. 그러나 아이들은 영원히 민트색 꿈과 복숭아 내음 안에서 자랄 수 없다. 잘 익은 복숭아 안을 벌레가 파고들 듯, 불안한 현실이 옥시글옥시글 과수원을 둘러싼다. 그러고 보니 복숭아나무에는 진딧물이 유난히 잘 끼던 생각이 난다.
같은 과수원의 서로 다른 식물들처럼
할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빠 로제르, 언니 마리오나, 막내 이리스, 쌍둥이 사촌들이 있는 고모 가족, 어린 아기 여동생이 있는 다른 고모 가족까지. 3대에 걸친 가족들은 크고 작은 삶의 팁을 나누면서, 과수원 식물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스페인 내전에서 이웃들과 서로를 구했던 인정을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무화과 나무, 과수원 가득 왕성한 아버지의 복숭아나무, 십대 로제르와 마리오나처럼 바람에 사각사각 잎새 흔들리면서도 쑥쑥 자라는 옥수수, 그 틈에 욕심과 야심처럼 삐죽 튀어나온 대마… 모두 다르지만 한 수영장에서 장난치고 뒤섞여 노는 사이다.
해마다 여름이면 일꾼까지 동원해 다 함께 대대적인 복숭아 수확을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어른들은 서류로 뒤덮인 테이블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눈다. 인근 ‘지주’가 곧 복숭아 과수원을 밀어 버리고 태양 전지판을 설치한다는 소식에 모두 착잡하고 막막하다. 이 마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감정과 반응으로 자라난다. 마지막임을 인지할 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듯, 가족들 간에 다르게 부유하던 마음들이 갑자기 극명한 색깔을 띠기 시작한다. 영화는 이 모든 마음에 치밀하게 따라붙어, 감정을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달해 준다.
그 사이에도 아이들은 자란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잃어버린 폐차 대신, 영화 내내 아지트를 찾아 헤맨다. 농사용 박스로도 들어가 보고 굴에도 들어가 보지만, 아이들만의 아지트는 어른들의 논리로 너무 쉽게 깨져 버린다. 그래도 아이들은 자란다. 복숭아를 으깨고 상추를 발로 차고 수박을 깨 먹으면서. 그렇게 성장은 주변 세계에 균열을 내는 행위이다. 아이들뿐 아니라 이 가족의 모두가 그렇게, 과수원의 작물들처럼 각자 속도의 성장으로 세계에 균열을 낸다.
스페인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복숭아
그런데 이 균열의 모양, 어쩐지 익숙하다. 한국 근현대 소설을 보는 것만 같다. 염상섭의 <삼대> 생각도 나고, 동네를 두루 다니며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지주들의 존재에서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생각도 난다.
옹고집 우격다짐의 아버지 모습조차 어쩜 그렇게 한국 근현대 소설 속 인물들 같은지. 단지 가족끼리 잘 지내고, 가족들에게 더 힘이 되고 싶었을 뿐인 마리오나와 로제르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이자 최소한의 반항을 한다. 그중에는 정성껏 연습한 무대에 오르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면서까지 가족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도 있다.
사실 가족을 비롯한 수직적인 관계 내에서의 갈등은 대부분 그렇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간접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은 서로의 일부이기에 서로를 너무 잘 알고, 너무 눈에 다 보이고, 그래서 더 용서가 쉽게 되지 않고 감정이 뒤엉킨다. 그렇게 이따금 갈등의 뿌리와 열매의 모양이 같아진다. 갈등의 원인이 갈등 자체가 된다.
이런 갈등에서는 쉬이 놓일 수 없다. 음주·가무나 다른 그 무엇으로 도피해도 피할 수 없는 심연을 마음에 남긴다. 그러나 수직으로 깊은 심연에서도 언젠가는 전복이 일어난다.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리겠다 소리치듯, 아들이 아버지의 복숭아밭에 수로를 열 듯. 어머니가 영화 내내 꾹꾹 참던 감정을 결국 표현하듯. 어머니의 표현 법은 정말 대단했는데, 자기 안의 갈등을 어쩌지 못하고 폭주하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다가가, 가볍게 뺨을 철썩 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을 가뿐히 정리했다.
말 한마디도 없이 단순하게 이들이 문제를 직시하게끔 했으며, 고모 부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어 앙금마저 그 해결을 막을 수 없게 만들었다. 춤추면서 과일을 따다가 핀잔을 듣고 “여자는 동시에 할 수 있어!” 했던, 마리오나가 가볍게 던진 말이 맞았음을 깨닫는다. 김 첨지를 비롯해 우리의 속을 답답하게 했던 수많은 한국 근현대 소설 중 여성 주인공의 서사가 있었다면 아마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거라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본다.
과수원에서는 토끼 사체 냄새가 난다
이 모든 가족 안의 균열 후에 드러나는 트랙터의 행진은 단순한 숫자 오르내림의 결과값일 수 없다. 숫자 오르내림 뒤에서 한참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겪고, 답답함에 괴로워하고, 반항하고, 놀 자리를 잃고, 눈치를 보고, 노력한 가족들의 모든 시간의 결과값이다. 투쟁조차 흙의 산물을 이용해서 벌이는 이들의 “과일도 가격이 있다!”는 말은 마치 “우리 삶에도 가치가 있다!”처럼 느껴진다.
농사를 망치는 토끼들을 죽인 탓에 토끼 사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과수원에서,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토끼 사체를 대한다. 그 끝에, 싱그러운 생명이 자라야 할 자리를 비집고 든 ‘토끼’는 결국 가족들이 놀던 수영장 위에 뻣뻣한 시체가 되어 둥둥 떠다닌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큰 힘 없이도 섬뜩한 저항이다.
그리고 이 저항은 기억될 것이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가족들의 마음에 한 겹 흔적을 분명 남길 것이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엄마의 손맛’을 이야기하며 나누는 할머니들의 조리법이 반드시 전달될 것처럼, 지하실에 숨어 전쟁을 견딘 어른들의 실화가 아이들의 놀이가 되는 것처럼,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기억될 것처럼. 목소리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 목숨을 바친 친구를 위해 노래하고, 하늘이 아닌 땅을 위해 노래한다는 가사처럼.
거실에 모여 가족들이 아이의 노래를 듣는 장면은, 기꺼이 아이들에게 내어준 무대는 그래서 인상 깊었다. 노래를 들으며 각자의 착잡함이 얼굴에 스치는 그 뒤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가 내리면 흙냄새는 더욱 짙어지고 땅은 굳어질 것이다.
*온라인 무비 매거진 씨네랩을 통해 시사회에 참석하여 감상한 후 작성하였습니다.
- 1
- 200
- 13.1K
- 123
-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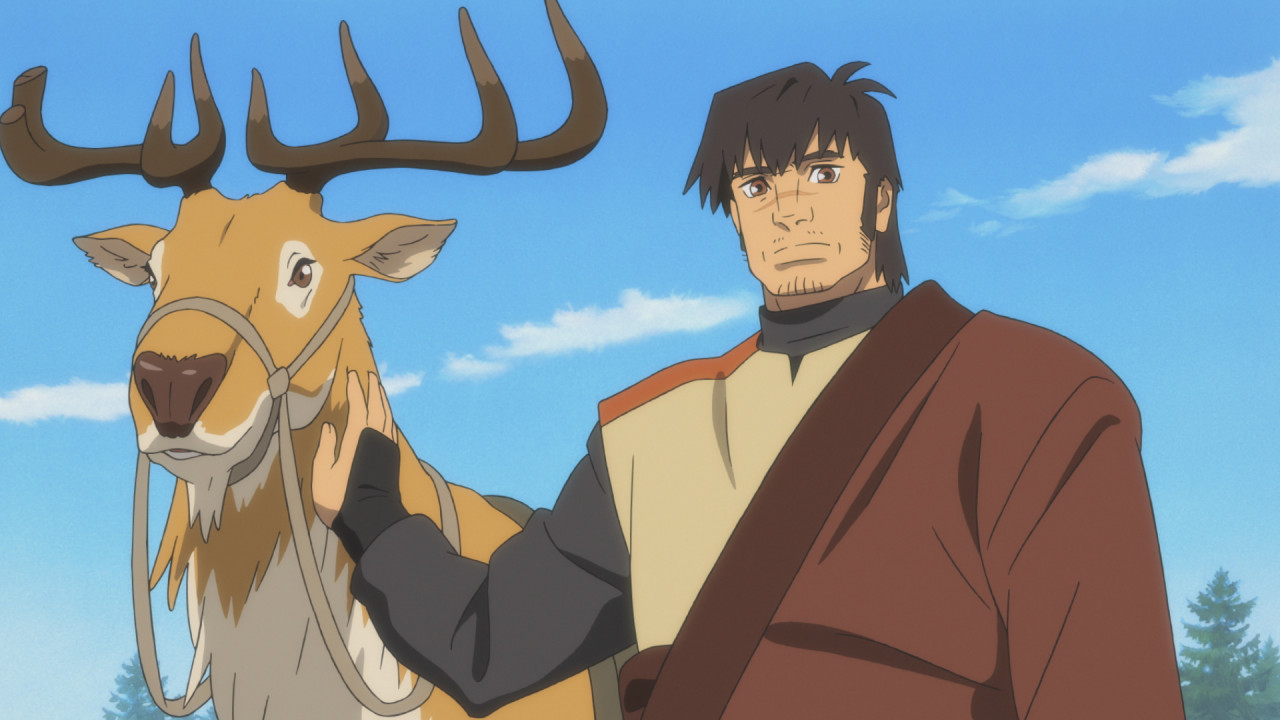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