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서2025-09-04 00:02:41
3670, 나를 찾는 시간
영화 <3670>
해당 리뷰는 씨네랩 초청 시사회 관람 후 작성되었습니다.
영화 <3670>은 탈북민이고 동시에 게이인 철준의 이야기다. 탈북민 커뮤니티 안에서는 성적 지향을 감추어야 하고,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탈북민 정체성이 호기심 섞인 소비로만 다뤄진다. 결국 그는 어디에서도 온전히 안착하지 못한 채, 자기소개서 한 줄 조차 제대로 써 내려가지 못하는 청년으로 남는다. 하지만 영준이라는 동갑내기 친구를 만나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영화는 이들의 관계를 단순한 멜로의 선율로 그리지 않고, 소수자의 자기 서사가 어떻게 빼앗기고 또 회복되는지를 집요하게 따라간다. 종로 3가 6번 출구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철준의 세계를 어떻게 다시 쓰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정직하고도 따뜻하게 포착한다.

영화는 시작과 동시에 어두운 방 안, 두 사람의 은밀한 신체적 접촉으로 문을 연다.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고독과 연결되고자 하는 내적 욕망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곧 마주할 탈북자이자 게이인 철준(조유현)의 내면을 조용히 따라가며, 그의 감각과 선택을 관찰하게 된다.
영화의 중심에는 자기소개서가 있다. 철준이 탈북민 전형으로 대학 입학을 위해 쓰는 자소서. 흔히 미래를 위한 형식적 글쓰기로만 여겨지는 문서가, 여기서는 철준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수단으로 변모한다. 점수나 평가를 얻기 위한 글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검증받는 키인 셈이다. 이를 통해 남한 사회의 제도와 개인의 욕망이 어떻게 얽히는지, 감독은 명료하게 보여준다.


<3670>은 단순한 탈북자 이야기나 퀴어 로맨스가 아니다. 철준이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공동체 역시 쉽게 타자화와 배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자기소개서가 증명하는 것은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존재를 허락받고 소속되는 경험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영화는 로맨스적 리듬을 포기하지 않는다. 철준과 영준의 관계는 진지한 사회비평 위에 유머와 떨림을 얹어, 담론의 무게를 날카롭게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영화가 끝날 무렵, 좋아하는 노래가 없어 게이 친구들끼리의 만남에서 늘 앉아 있기만 하던 철준은 사람들 앞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선곡하기까지에 이른다. 철준의 선택은 힙합. 노래방에서 단순히 음악을 고른 순간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감각과 선택으로 자기 서사를 완성한 장면이다. 이 결말은 결국 우리 모두가 나를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타자와 연결되기를 바라는 영화의 메시지와 닿아 특히나 감동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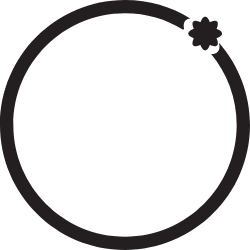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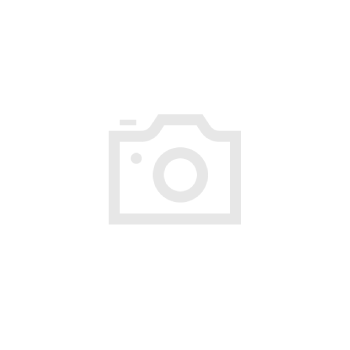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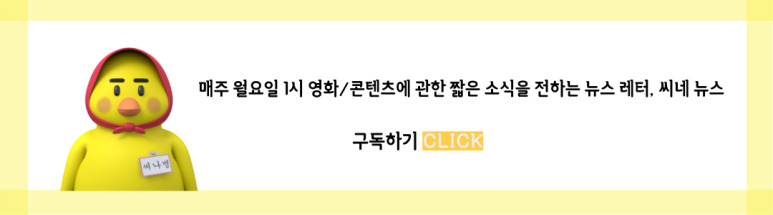
.pn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