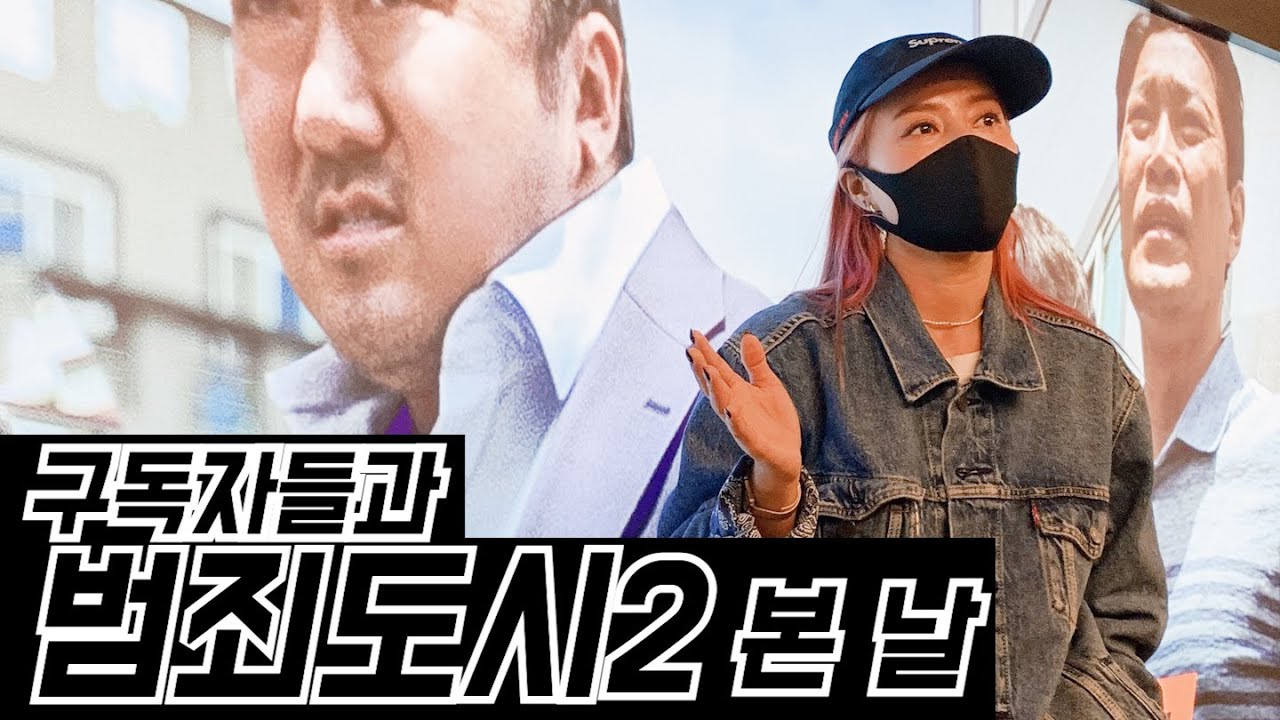udong2022-04-11 00:20:34
임재범도 화들짝 놀라는 전쟁 같은 사랑
<클로저>, 스포일러 없이 추천합니다!
"나는 상상했었지 나의 곁에 있는 널~" 나는 아이패드로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고 있다. 그 전설적인 듀엣 송 <사랑보다 깊은 상처>이다.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 엄청 어렸을 때다. 2010년대쯤 자료화면으로 풋풋했던 박정현과 임재범이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때는 가사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내가 변했다고 백날 웅변해도 그 사람이 뇌가 있는 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노래를 비롯한 많은 대중가요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사랑은 참 여러모로 사람들을 얄궂게 만든다. 사랑이 없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아플 일도 없고 꿈꿀 일도 없을 것이다.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도 아닌데 사람을 행복하게도 우울하게도 만든다. 거의 자연재해와 걸맞은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속성을 깨달아 글로 쓴다고 쳐도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는가? 싶다. 사랑과 연애라는 키워드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결국 '과연 나는 대체 뭘 하고 살았는가'라는 질문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말 그대로, 과연 나는 뭘 하고 살았을까? 자기 계발이랍시고 동분서주했던 건 기억에 남는데 누구를 사랑해보거나 받았던 적은 없다. 170 좀 안 되는 작은 키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남들 바지통 줄이거나 화장 처음 시도해볼 때 나는 방구석에 누워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으니 그때 치러야 했던 대가를 26살의 내가 치르고 있는 것이다. 영화와 책으로 채울 수 있는 인생의 유효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인 건 맞는데 정작 실전에는 약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위로를 하면 행복해지는 나. 사랑에 치인 지인들에겐 대체 뭐라고 말하지? 지인들에게 알맹이 없는 공수표로 보이지는 않을까?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날이 올 텐데. 내가 주변 지인들에게 하는 말처럼 익숙한 것에 섬세한 걸 놓치고 살면 안 될 텐데. 막상 내가 그런 입장이 되면 나 역시 그럴 것 같아서 가끔 두렵기도 하다. 근데 뭐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되는 게 사람 심리겠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영화가 있다. 등장인물을 실제로 만나면 단 1마디도 섞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안녕, 이방인? 주인공이 우리에게 인사를 건넨다.
이방인(Starnger)이 Closer가 되다
부고 전문 기자 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길을 걷고 있다. 사람 바글바글한 미국. 남자는 왠지 반대편에 머리가 붉은 여자와 눈을 마주치고 있다. 마치 짜기라도 한 듯이 서로의 눈을 마주치게 된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눈빛을 마주칠 때, 앨리스는 교통사고를 당한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는 이 계기로 서로 대화하게 된다. 무슨 일 해요? 남자는 부고 란 담당 기자라고 한다. 빨간 머리의 여자는 낯을 그렇게 가리는 타입이 아닌 것 같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사고 난 곳 근처를 산책하는 두 사람. 댄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한다. 어느새 직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 두 사람. 남자는 '내가 글재주가 없어 부고란의 기자가 되었다'란 말을 한다. 그렇게 하나, 둘 대화를 나누며 친구가 된 주인공. 잠깐 만난 사이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시간이 지나 댄은 앨리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다. 소설에 들어갈 이미지를 찍기 위해 아나의 스튜디오를 찾은 댄. 댄은 아나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아나를 꼬시려고 노력하는 댄. 어찌어찌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댄은 아나에게 앨리스가 온다고 말한다. 아. 이 댄이라는 놈은 애초부터 아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댄과 앨리스는 연인관계였다. 여자 친구가 있는데도 아나에게 꼬리를 친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시작부터 15분까지의 이야기다. 15분만 봐도 정신 나갈 것 같은 전개다. 글로 풀어써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주드 로가 맡은 댄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뻔뻔하다. 영화는 댄만큼이나 뻔뻔하다. K-아침 드라마에 나올법한 이야기를 시종일관 밑어붙힌다. 눈치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다. 아마 사랑의 극단적인 예를 모아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세상 찌질이 같은 (우리) 이야기
이름은 그 사람을 규정하는 정체성의 의미와도 닮아있다. 만약 누군가의 이름을 속여서 타인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면 그건 '자기 정체성을 숨긴다'라는 뜻과도 닮아있다. 자기 정체성을 숨겨서 얻고 싶은 게 뭘까? 사랑은 타인에게 내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애초부터 애정이나 관심이 없으면 남이 있건 말건 신경 쓸 일이 없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이유는 그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찌질한 내면을 해소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다. 영화는 사랑의 극단적인 상황을 맞물려놓고, 어떤 행동의 원인을 '이름을 속여서 사람을 꼬시는'정도의 덜떨어짐으로 귀결짓는다.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내 존재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다. 이 '남을 흔들어 내가 통제할 수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행위는 극 내내 제시된다. 극단적인 상황의 연속이라 '난 적어도 저러지 않지'라고 생각하기 쉽다.(나도 그럴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행동의 한 방향만 틀면 우리 모습이라 딱히 반박하기 어렵다. 극본은 인물 간의 갈등과 사랑의 속성을 비틀며 '네 사랑 이야기도 이의 일부다'라고 지적한다.
나는 상상했었지 너의 곁에 있는 날
이 지구 상에 있는 수많은 사랑 노래들은 헤어진 전 연인과의 재회를 바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옛사랑과의 재회는 기적 같은 일이 맞다. 그 사람과 함께 있던 행복한 시간이 다시 오길 바라는 것이다. 아프기도 아프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있으니 '조금만 더 성숙했다면' 더 나았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근데 가끔 우리는 솔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다시 만나고 싶은 걸까? 그 사람에게 오롯이 나라는 존재가 유일무이하다는 짜릿함때문은 아닐까?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채워진다는 착각은 참 사람을 비참하게도 만든다. 사실 애초부터 그런 건 없는데 말이다. 원래 우리 다 외로운 존재라서 사랑을 찾고 있는다. 이미 다 알면서 사랑에 빠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걸 모두 다 알면서도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끝을 향해 달려간다. 영화는 이 사랑의 단맛과 짠맛을 같이 느끼게 해 준다. 그 사람 잘 알거라 생각했다. 이름을 집요하게 묻고.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다 알 거라고 믿고. 행복 회로가 돌아가서 사람은 행복한 것이다. 내가 딱 아는 사람이 있다는 그 오해가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어떤 것의 진위여부도 확신할 수 없는 게 결국 우리가 아는 사랑의 속성이었다. 영화는 잔인할 정도로 이 착각에 대해 집요하게 판다. 이 사람이 나쁜 놈인걸 아는데 '차 좀 타 줘 자기야'라고 말하는 이중성이 모든 인물에게 다 나타난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래서 영화는 '결별-재회'의 모티브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로맨스 영화계의 불닭볶음면
난 기본적으로 매운 걸 못 먹는다. 설사가 심해서도 있고 땀이 많이 나서도 이유가 된다. 근데 그렇게 매운 걸 알면서도 가끔 당길 때가 있다. 이 영화는 불닭볶음면 같은 영화다. <이터널 선샤인>에서 '두 번 물어도 사랑에 빠질 수 없었던 나'의 이야기나 <라라 랜드>의 꿈과 사랑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는 로맨스 영화계의 정석 같은 느낌이다. 미워도 꼭 잘됐으면 하는 마음. 그래도 그 사람 덕에 행복했다는 고마움을 일깨워는 육개장 같은 영화인 셈이다. 이 영화는 어디에도 없는 매움으로 가끔 생각나게 만든다. 그리고 또 이런 영화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느낌을 들게 만든다. 그렇게 나에게 상처 준 이가 미워서 거리를 둔다 치자.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뭐 다른 즐거운 기억 그딴 거 필요 없다. 영화는 이 사랑에 의한 마음의 흉터를 색다르게 묘사한다. 그러려면 또 잘 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오해하고, 또 싸우고, 찌질해지고, 타인을 안다고 믿었지만 결국 아니었고. 그렇게 지루한 과정의 연속인 게 인생의 과정 아니겠어? 지나간 인연에게 바치는 감사함은 분명히 아니지만 영화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시야를 넓게 도와준다.
무려 18년 전 영화
이 영화를 다시 보며 느낀 게 있다. 나탈리 포트만이 정말 미인이라는 것이다. 머리색을 빨간색부터 분홍색까지 가지각색으로 헤도 소화하는 소화력이 대단하다. 주드 로도 새삼 미남이란 것을 또 느꼈다. 이 두 배우의 젊은 시절 비주얼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화의 가치는 충분할 듯. 또 18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캐릭터 설정을 창의적으로 잘했다. 어떤 이들에게 대입해도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다.
사랑에 실패할 예정인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 결혼에 골인한다 쳐도 그게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래도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바보 같은(나 포함) 것이 우리 모습 아닌가. 이런 우리에게 상처의 치유와 화풀이에 대해 세 번 네 번 생각하게 만든 로맨스 영화다. 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린다.
#왓챠영화추천
- 1
- 200
- 13.1K
- 123
- 10M




























.jpeg)